 달구벌미리내
달구벌미리내달구벌미리내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5.10.8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10.8
- 작성일
- 2025.9.22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9.22
- 작성일
- 2023.5.29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2023.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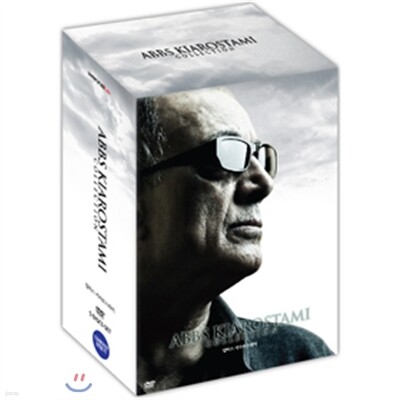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9
- 좋아요
- 25
- 댓글
- 127
- 작성일
- 2026.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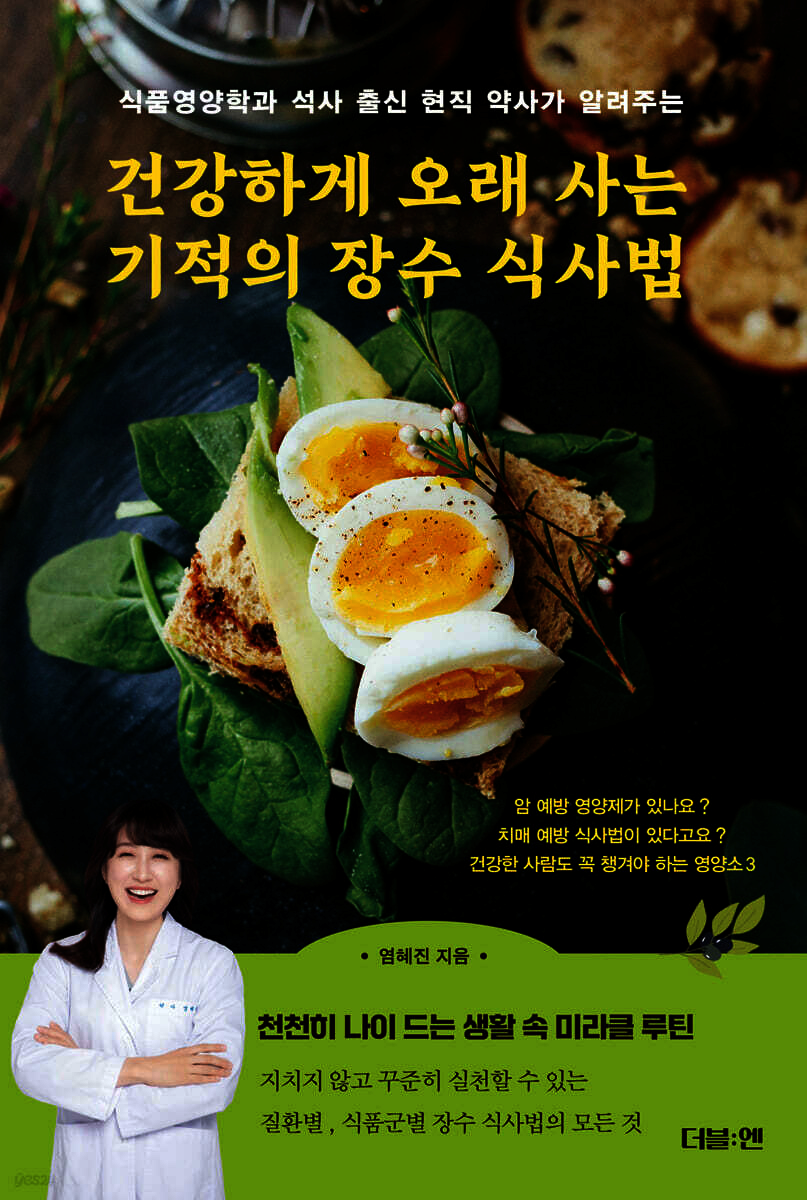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9
- 좋아요
- 14
- 댓글
- 103
- 작성일
- 2026.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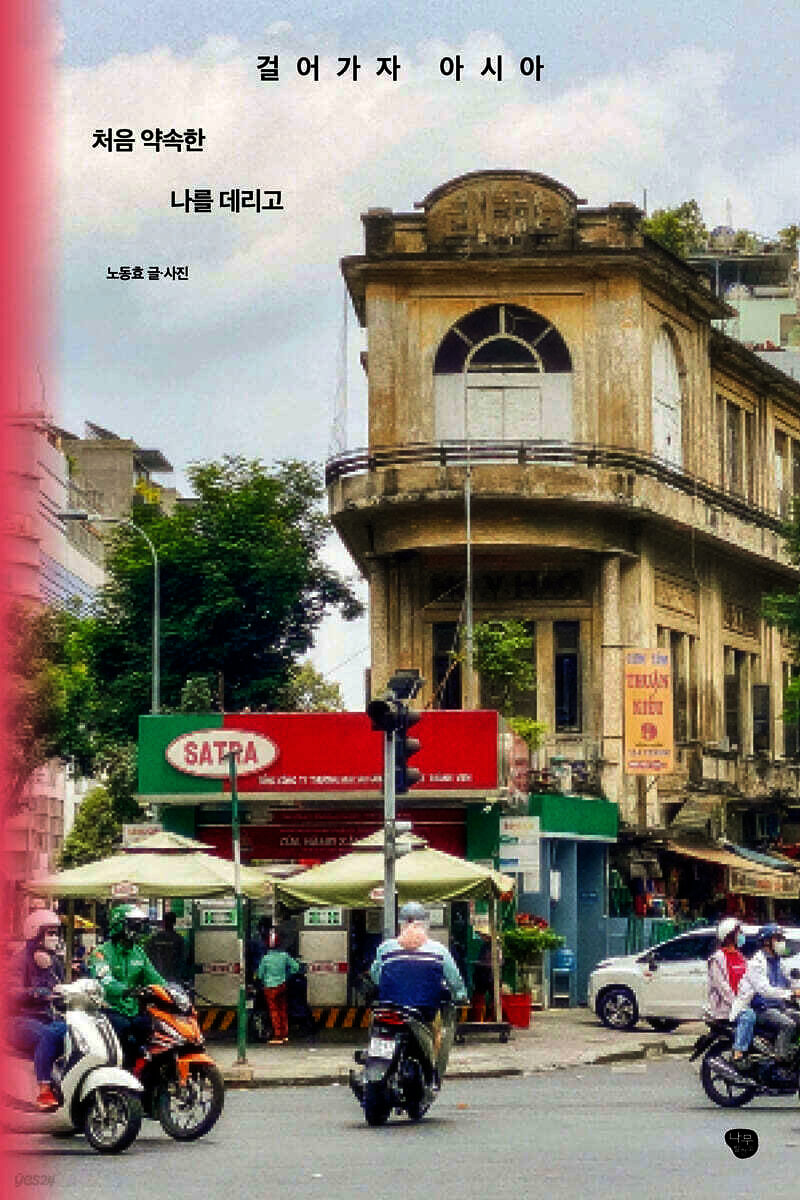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9
- 좋아요
- 11
- 댓글
- 73
- 작성일
- 2026.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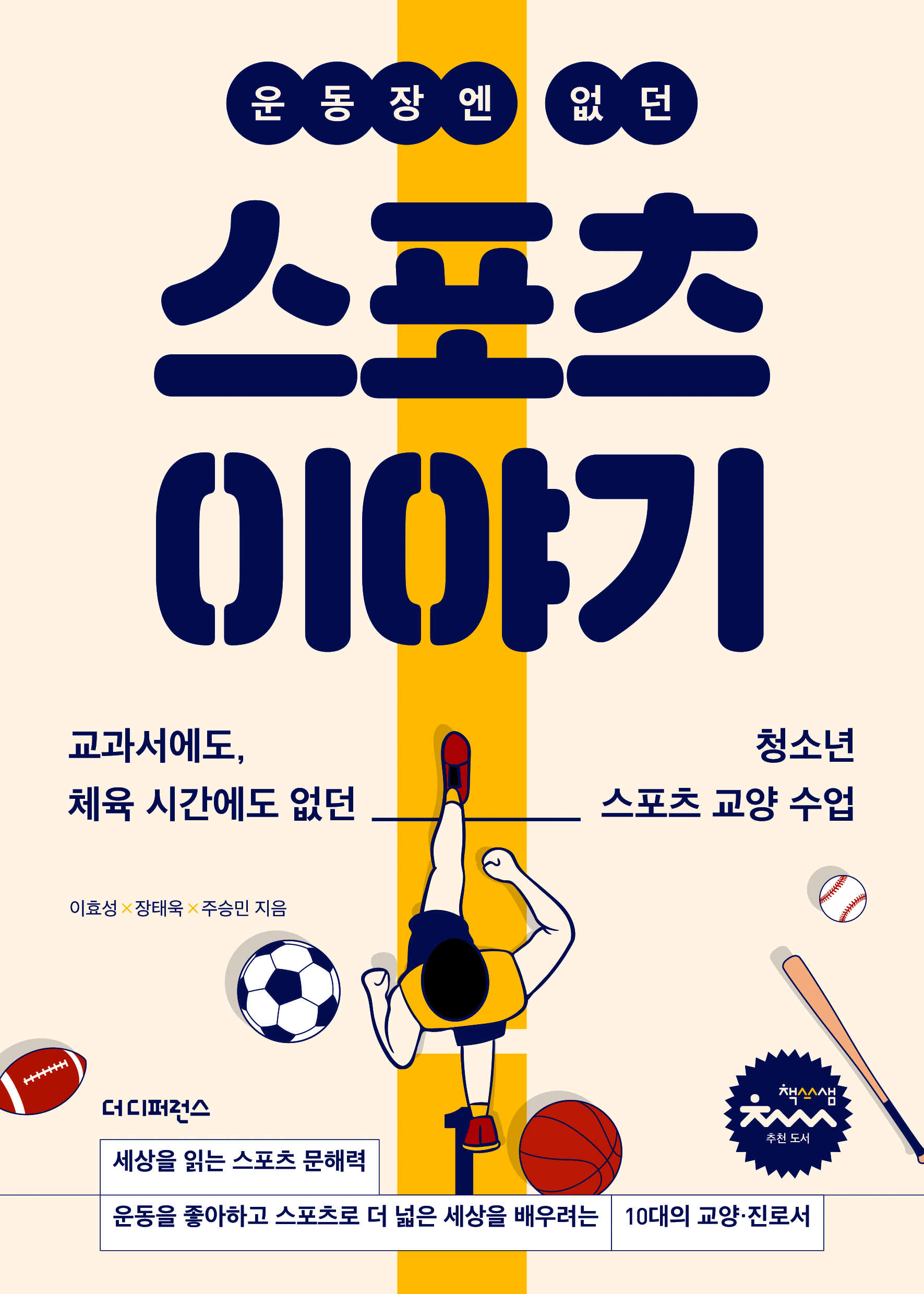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