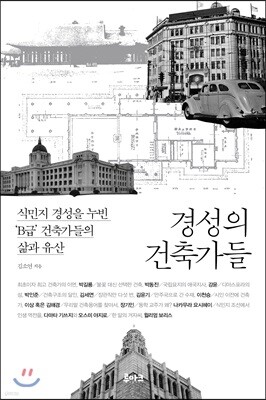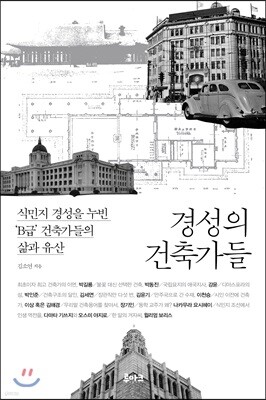꽃들에게희망을
꽃들에게희망을꽃들에게희망을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4.2.29
- 좋아요
- 1
- 댓글
- 1
- 작성일
- 2024.2.29
- 작성일
- 2024.2.1
- 좋아요
- 4
- 댓글
- 1
- 작성일
- 2024.2.1
- 작성일
- 2024.2.1
- 좋아요
- 4
- 댓글
- 1
- 작성일
- 2024.2.1
사락 인기글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0
- 좋아요
- 62
- 댓글
- 124
- 작성일
- 2025.12.10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1
- 좋아요
- 26
- 댓글
- 147
- 작성일
- 2025.12.11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1
- 좋아요
- 30
- 댓글
- 176
- 작성일
- 2025.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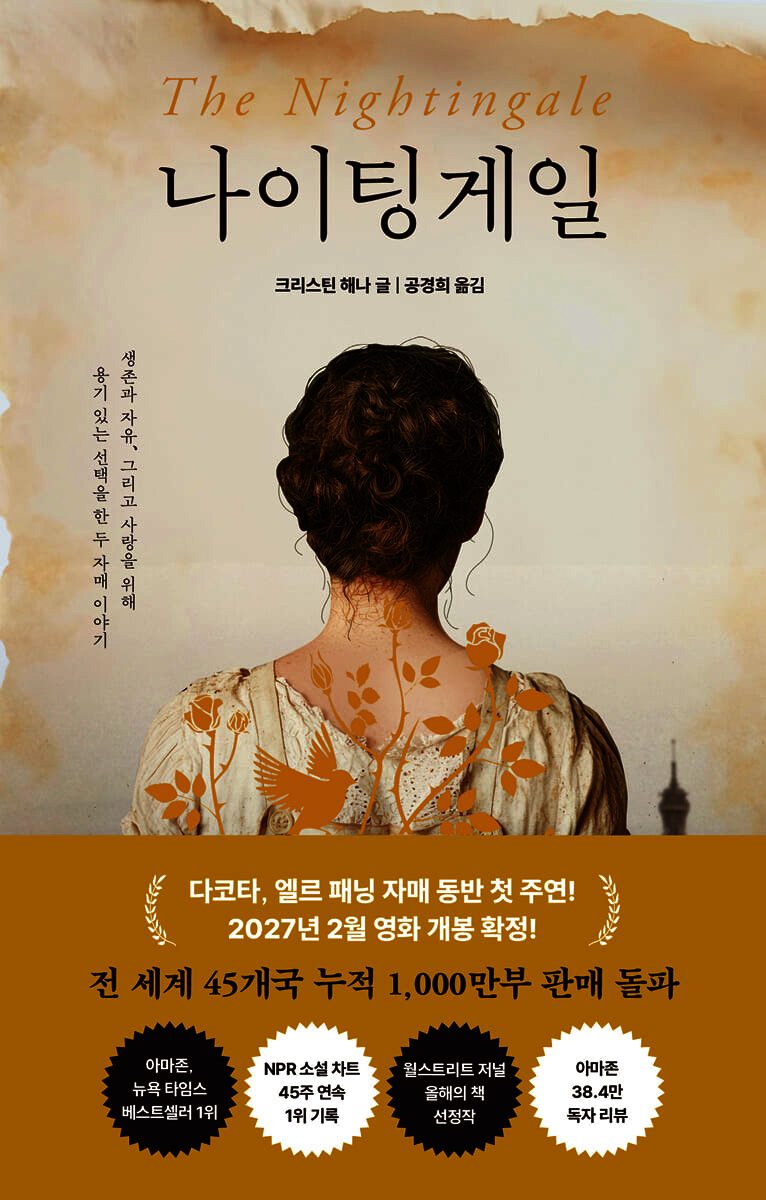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