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찾사
책찾사댓글 6

책찾사
- 작성일
- 2016. 7. 20.

아그네스
- 작성일
- 2016. 7. 20.

책찾사
- 작성일
- 2016. 7. 20.

아자아자
- 작성일
- 2016. 7. 21.

책찾사
- 작성일
- 2016. 7. 22.
책찾사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4.3.3
- 좋아요
- 11
- 댓글
- 2
- 작성일
- 2024.3.3

- 작성일
- 2024.1.28
- 좋아요
- 11
- 댓글
- 3
- 작성일
- 2024.1.28

- 작성일
- 2023.12.16
- 좋아요
- 13
- 댓글
- 6
- 작성일
- 2023.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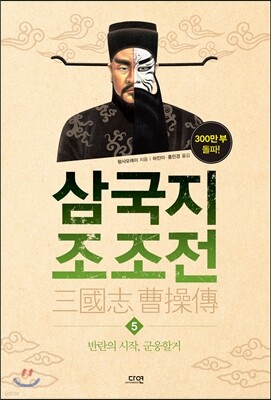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26
- 좋아요
- 22
- 댓글
- 137
- 작성일
- 2025.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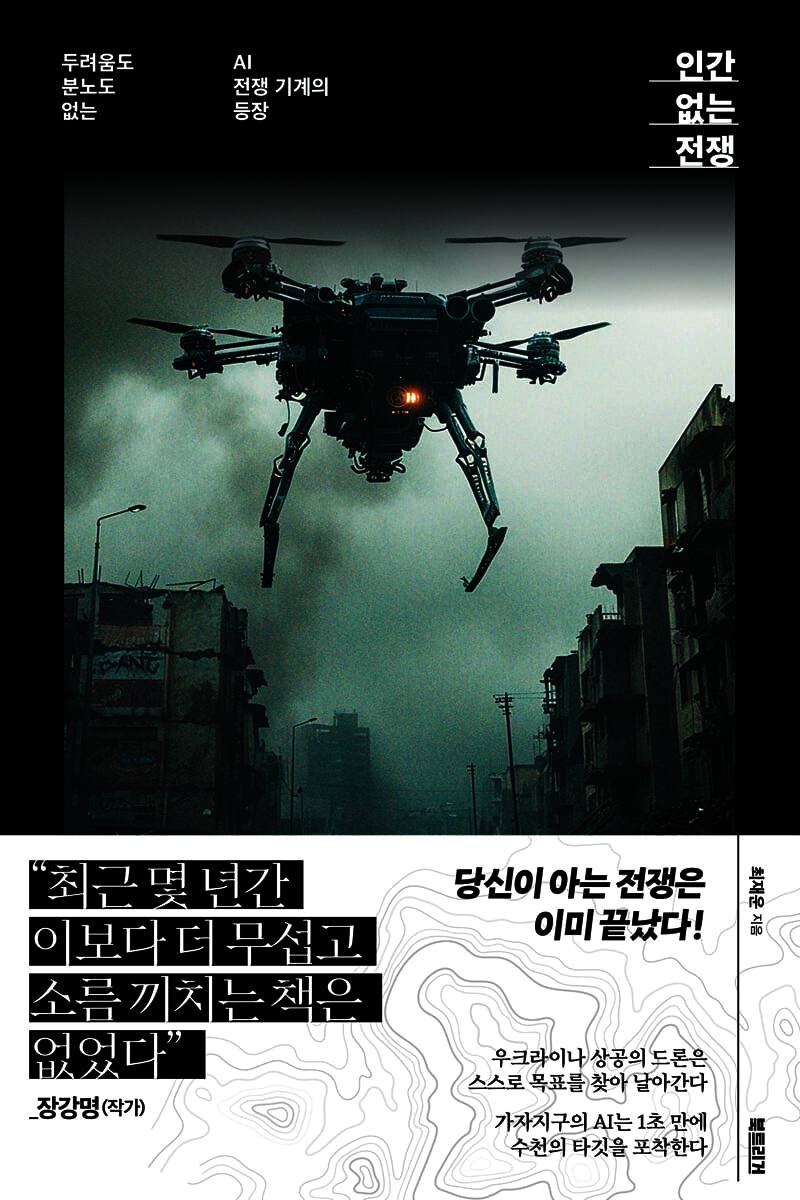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29
- 좋아요
- 21
- 댓글
- 152
- 작성일
- 2025.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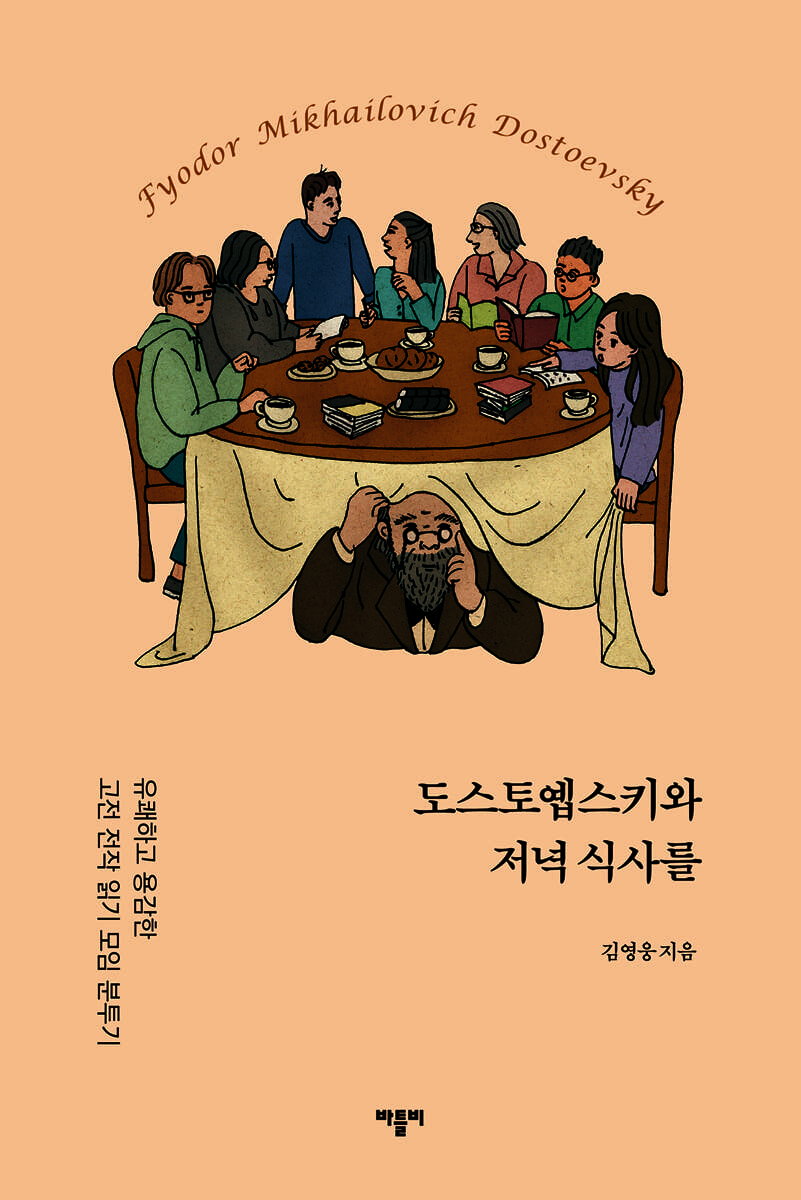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29
- 좋아요
- 34
- 댓글
- 194
- 작성일
- 2025.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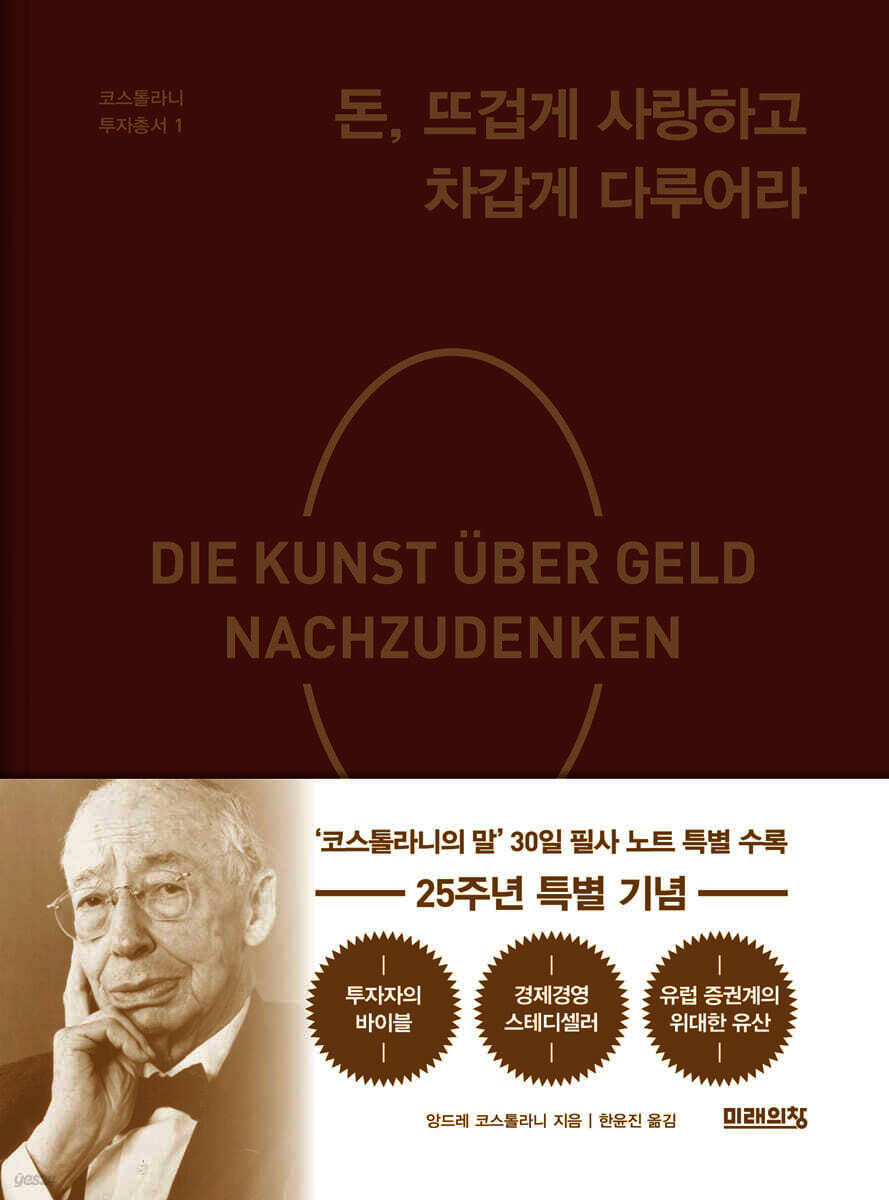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