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
소년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소년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5.9.16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9.16

- 작성일
- 2025.9.3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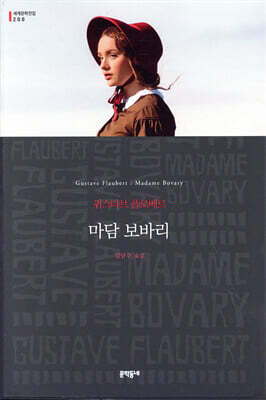
- 작성일
- 2025.8.23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8.23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14
- 좋아요
- 37
- 댓글
- 230
- 작성일
- 2026.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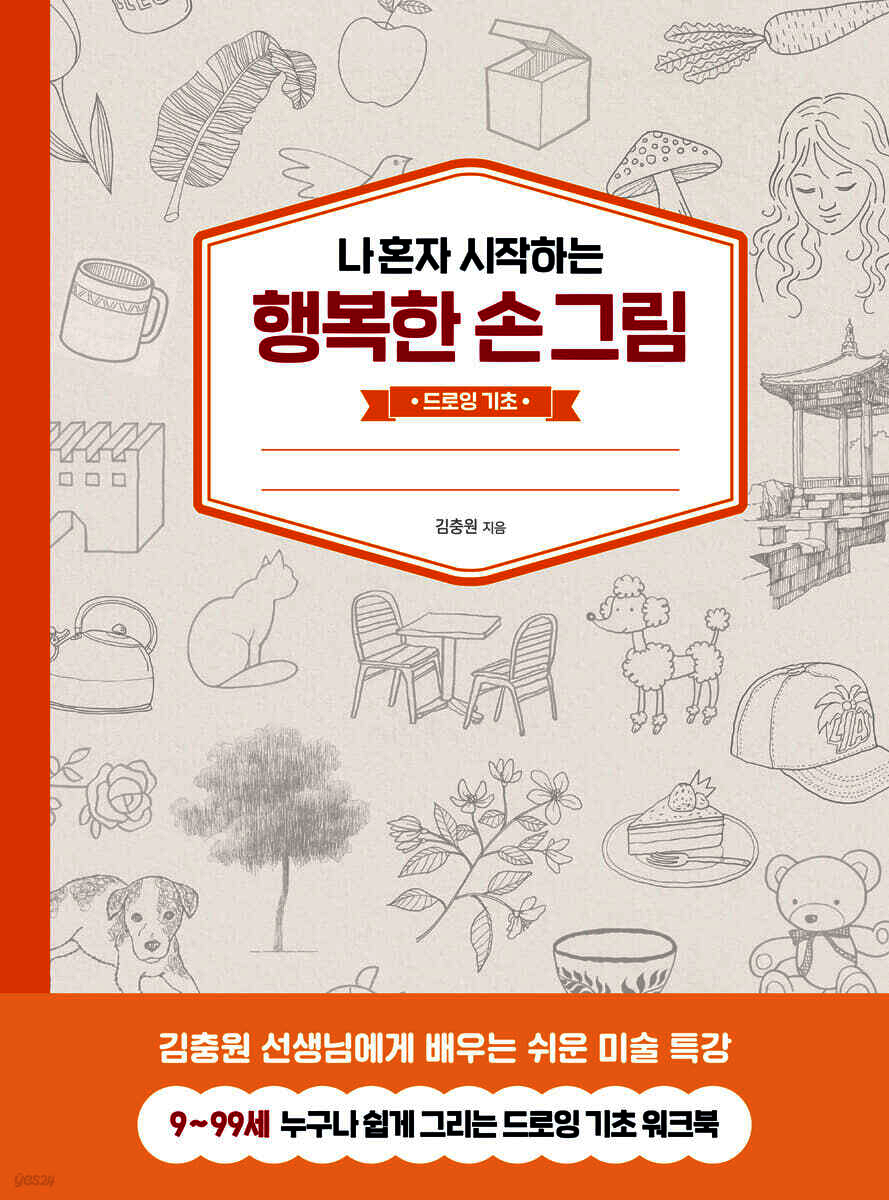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14
- 좋아요
- 54
- 댓글
- 92
- 작성일
- 2026.1.14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15
- 좋아요
- 28
- 댓글
- 195
- 작성일
- 2026.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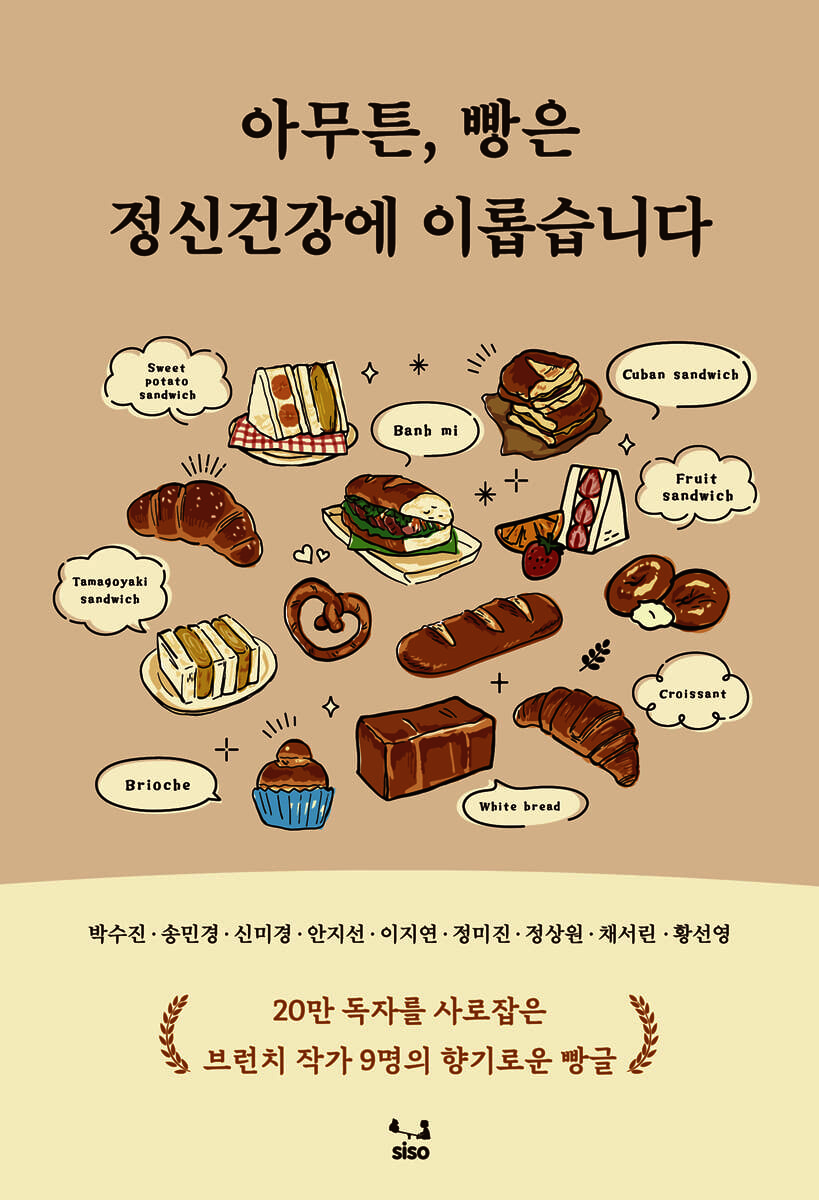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