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연
휘연댓글 42

성란
- 작성일
- 2020. 4. 2.

휘연
- 작성일
- 2020. 4. 4.

小麟
- 작성일
- 2020. 4. 3.

Annfall
- 작성일
- 2020. 4. 3.

옥이
- 작성일
- 2020. 4. 3.
휘연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5.11.4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2025.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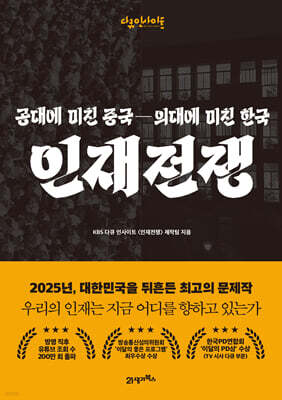
- 작성일
- 2025.9.11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5.9.11

- 작성일
- 2025.9.11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9.11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9
- 좋아요
- 22
- 댓글
- 143
- 작성일
- 202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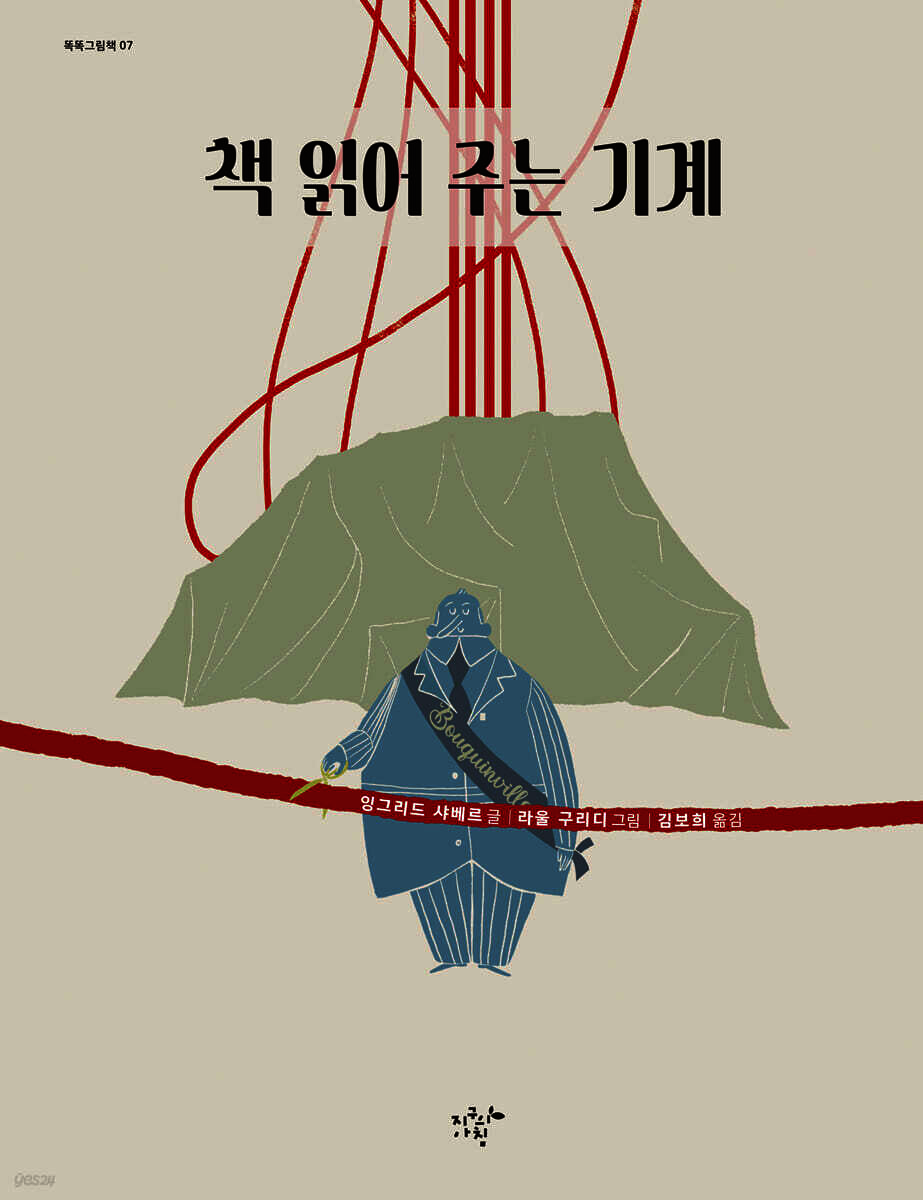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0
- 좋아요
- 16
- 댓글
- 82
- 작성일
- 2026.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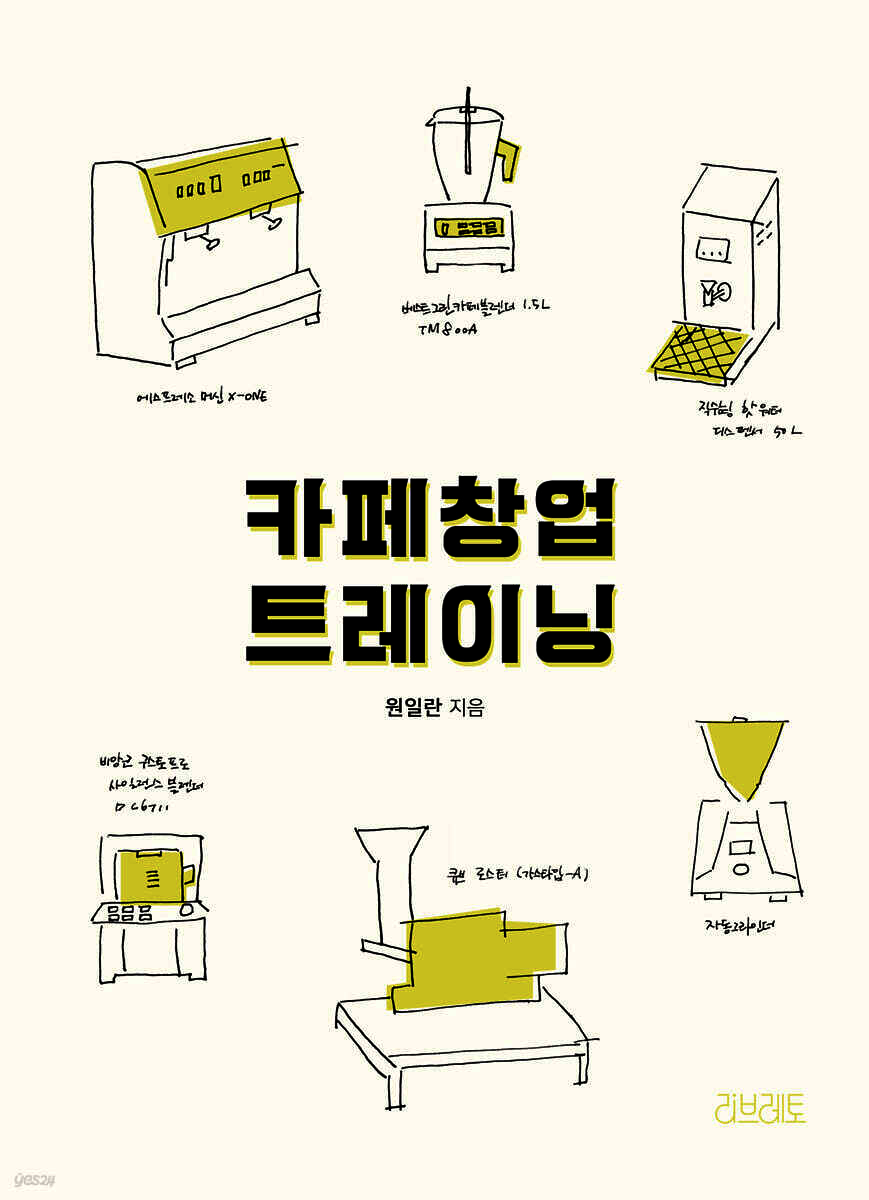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1
- 좋아요
- 12
- 댓글
- 77
- 작성일
- 2026.2.11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