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지기
사랑지기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사랑지기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4.2.26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4.2.26
- 작성일
- 2024.2.25
- 좋아요
- 3
- 댓글
- 0
- 작성일
- 2024.2.25
- 작성일
- 2024.2.24
- 좋아요
- 3
- 댓글
- 0
- 작성일
- 2024.2.24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9.5
- 좋아요
- 31
- 댓글
- 217
- 작성일
- 202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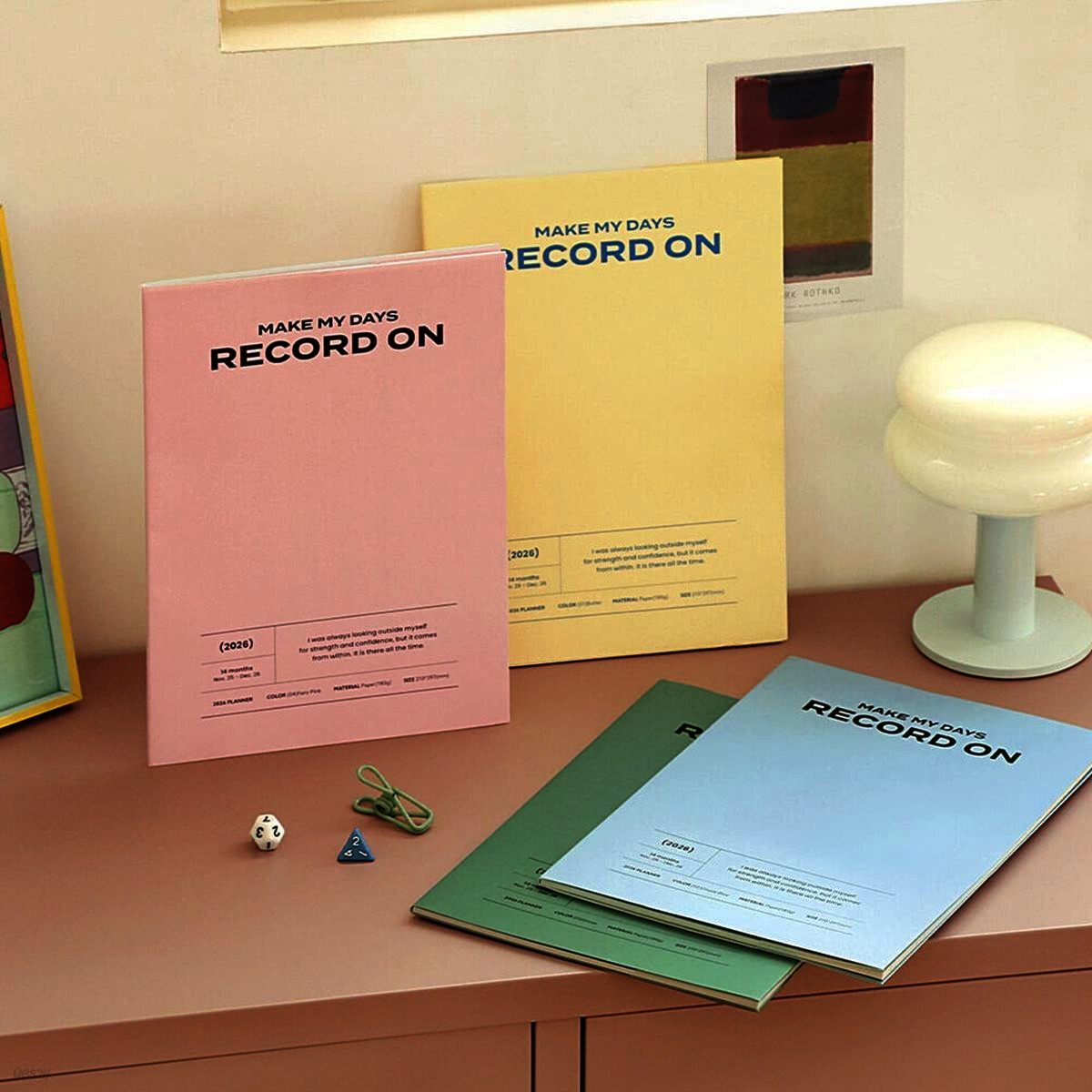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9.5
- 좋아요
- 24
- 댓글
- 121
- 작성일
- 202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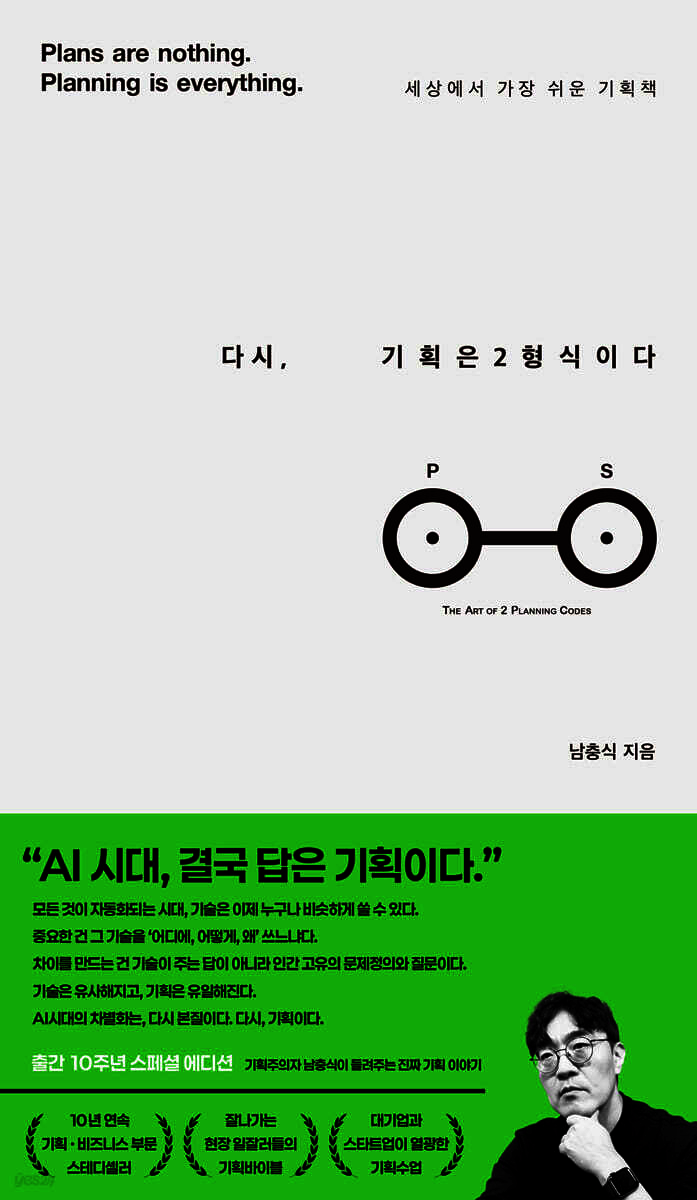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9.8
- 좋아요
- 25
- 댓글
- 153
- 작성일
- 202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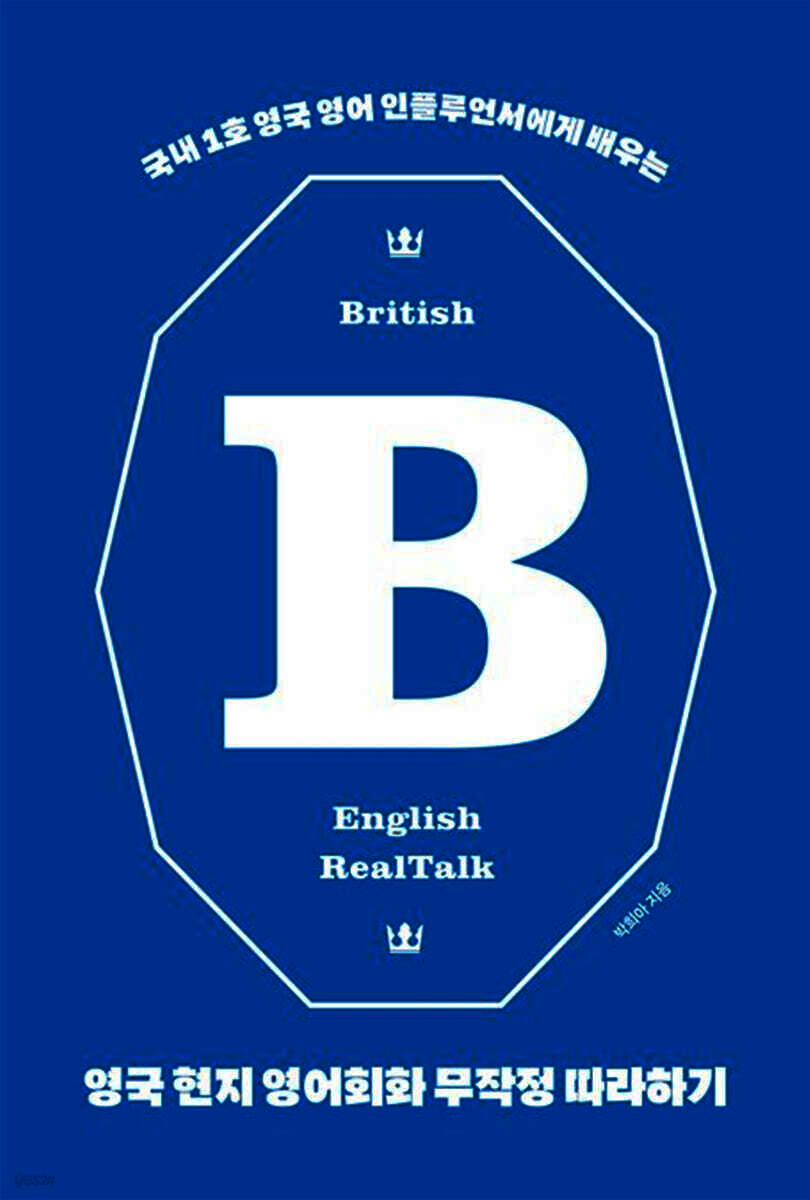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