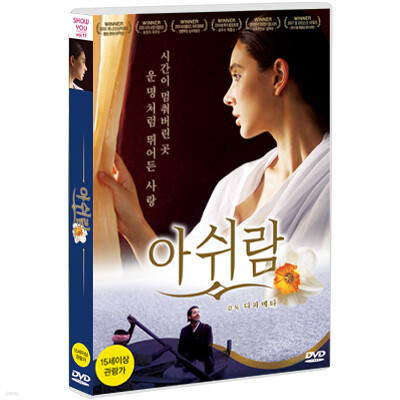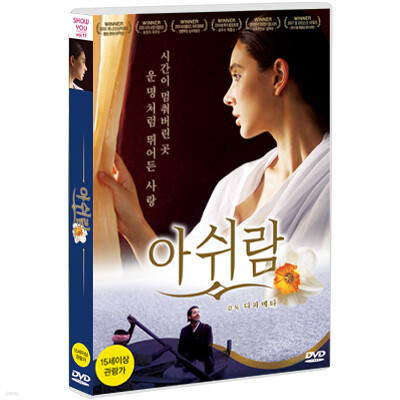천영애
천영애천영애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14.3.19
- 좋아요
- 2
- 댓글
- 1
- 작성일
- 2014.3.19
- 첨부된 사진
- 20
- 작성일
- 2014.3.14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14.3.14
- 첨부된 사진
- 20
- 작성일
- 2014.3.13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14.3.13
- 첨부된 사진
- 20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7.15
- 좋아요
- 31
- 댓글
- 175
- 작성일
- 2025.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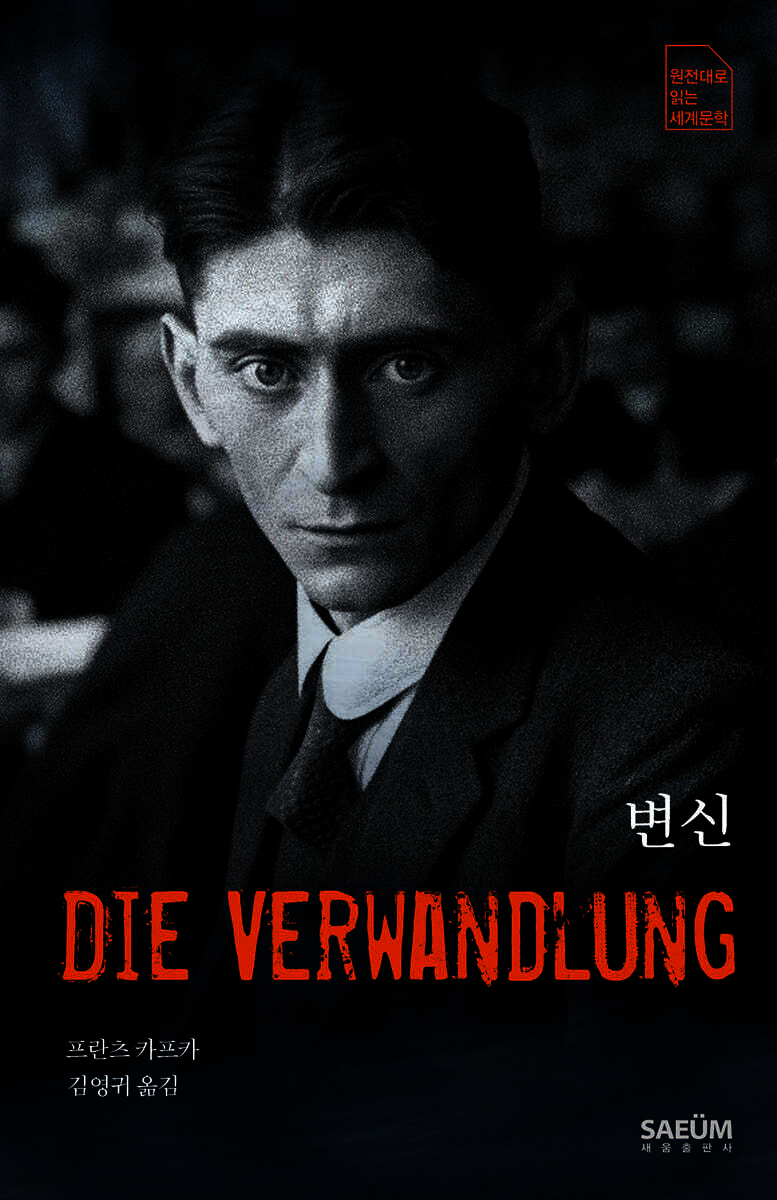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7.14
- 좋아요
- 17
- 댓글
- 126
- 작성일
- 202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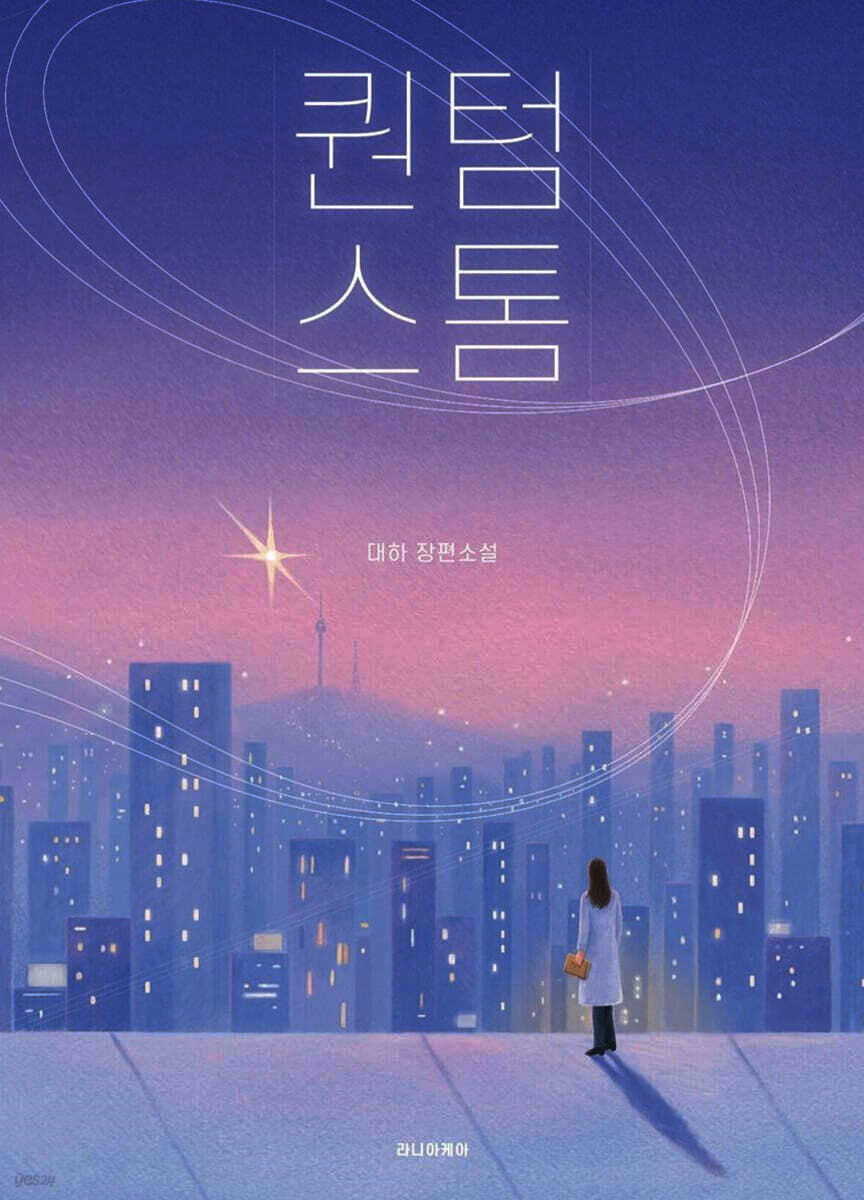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7.14
- 좋아요
- 28
- 댓글
- 166
- 작성일
- 202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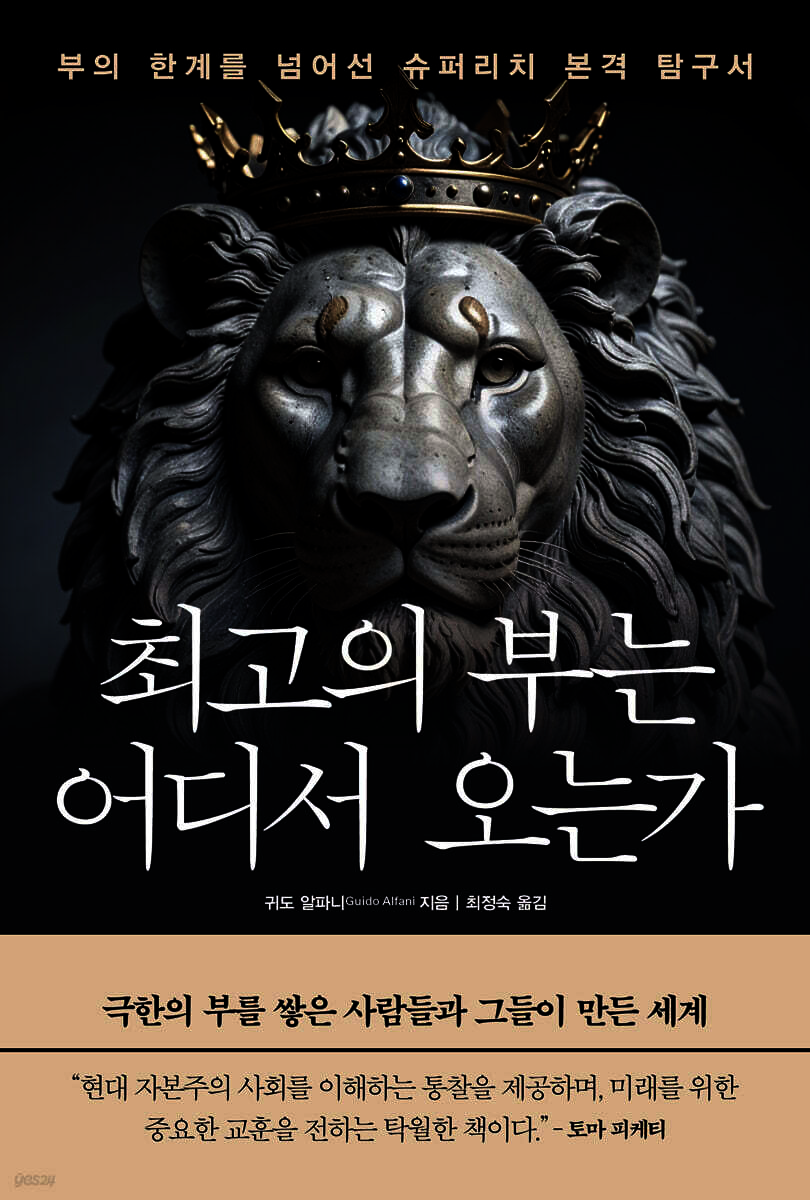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