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카테고리

linda
- 작성일
- 20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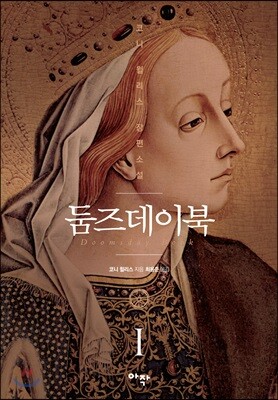
둠즈데이북 1
- 글쓴이
- 코니 윌리스 저
아작
2054년 중세를 연구했던 학생 키브린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중세로 가는데.
뭐 그때부터 그녀를 과거로 보낸 기계가 고장 나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것뿐이면 족하게 하필이면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절로 워프 됐다는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잘 작동해야 할 언어번역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마녀사냥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두렵다.
아무리 중세 사람처럼 하고 갔어도, 그때의 위생과 의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 낼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떠나온 미래에서도 전염병이 크게 돌기 시작했다는 것.
코니 윌리스는 이미 화재감시원으로 이야기 짓는 장인이란 걸 보여준 적이 있다. 최근 본 여왕마저 도는 정말 역작이었다.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의 소설이 다크사이드라면 이건 좀 브라이트 사이드. 그러나 절대 밝지 만은 않다.
어떤 이는 코니 윌리스를 수다쟁이 아줌마라고 재미있게 표현하지만. 그 표현 자체는 이 작가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겐 전방위적으로 박식한 교수님, 그것도 학교에서 재미있기로 소문나서 수강신청 경쟁에서 승리를 해야 들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코니 윌리스 이다.
두뇌와 심장 둘 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문무겸장이라고 정리해보련다.
전염병이라는 주제로 과거와 미래의 세계가 함께 돌아가고 인류가 고통을 받지만, 중세는 그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 또한 전염병 보다 더 심한 인권유린의 현장들. 팔려가듯이 유린당하는 어린 여자아이들과 죽어가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 당시의 모순들. 키브린은 어떻게 어떻게 라틴어를 써가며 적응을 하지만 점점 자신의 건강에도 자신이 없다. 그나마 마음을 붙인 집안의 여자들이 당한 상황을 본다. 여왕마저도에서도 봤듯. 근대도 그렇거니와 중세는 여자들에게 정말 혹독했다. 책을 몇 번이나 접었다 펼쳤다 했을까? 고통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 작은 키브린이 어떻게 움직여갈지 궁금했다. 그렇게 무슨 퍼즐 풀듯.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 지켜보던 부분이 본격적인 흑사병 부분에서 파토스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나 아렌트가 말했던 그 표현 '생명에 대한 집착을 하면 자유가 손상받는다고'. 병이 돌기 시작하면 '생존'이라는 테마에 사람들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되고, 그게 사람들을 비 인간적으로 만든다.
자연재해와 각종 인재들 특히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사람의 가장 밑바닥의 버튼을 누른다.
'잘못하면 죽어', '너도 쟤네처럼 갇힌 채로 죽게 될 거야', '살아야 해 일단은', '접근하지 마!'
인간의 나약함이다. 나라고 다를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감싸는 분노는 어떻게 소용돌이 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때의 종교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른다. 지금처럼 오히려 병균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인간성을 되찾게 진정시킬 수 있고 또는 중세처럼 그저 무력하게 사람이 죽는 걸 방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여기에서 유해한 종교와 무해한 종교가 또 드러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책은 한 신부를 조명한다.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을 끝까지 살리려 하고 키브린이 처음 과거로 오는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는... 뭐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냥 영웅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간 겪은 많은 재해 속에서 본
믿을 수 없는 보석들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소녀의 죽음과 신부의 죽음이었다.
항상 무언가를 책임지려하는 사람들은 가장 크게 다친다. 요 며칠 이유도 없이 많이 울었는데...
자꾸 일선 의료진과 공무원들 이 사태를 어쨌든 해결하려 하는 행정부가 떠올라서였다.
이 소설의 나머지 한 축은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현실감 있게 우왕좌왕하는 동안, 이 키브린을 어찌 되었든 현재로 데려오려고 노력하는 던 워디 교수는 뭔가 모르게 그 신부님을 닮기도 했다.
인간은 정말 나약하고, 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다.
작은 바이러스와 보이지 않는 원자에 죽어가고 파괴되는 게 인간
그 인간이 제멋대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빚어온 그 많은 참극들
그리고 지구가 주는 재앙일지 울부짖음일지 모르는 것들.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어수선할 때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
그동안 책을 읽으며 책을 덮은 다음엔 보통 아 좋은 책이었다 이렇게 남아있는 데
이렇게 가끔, 그리고 비슷한 순간이 오면 강렬하게 올라오는 책이 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책은 내 방의 책장이 아닌 마음의 서가에 꽂힌다.
이 '둠즈데이 북' 바로 그 책이다.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만든 분이 바로
코니 윌리스다.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