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속에저바람속에
흙속에저바람속에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흙속에저바람속에님의 최신글
- 작성일
- 6시간 전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6시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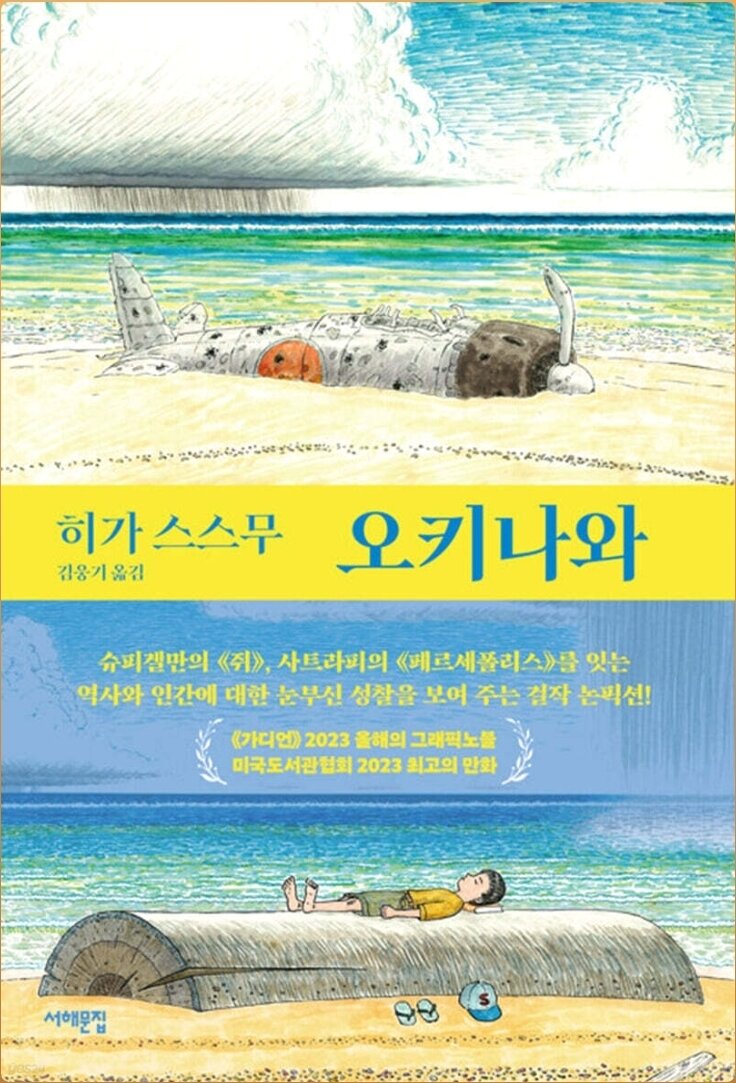
- 작성일
- 2026.1.7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6.1.7

- 작성일
- 2026.1.4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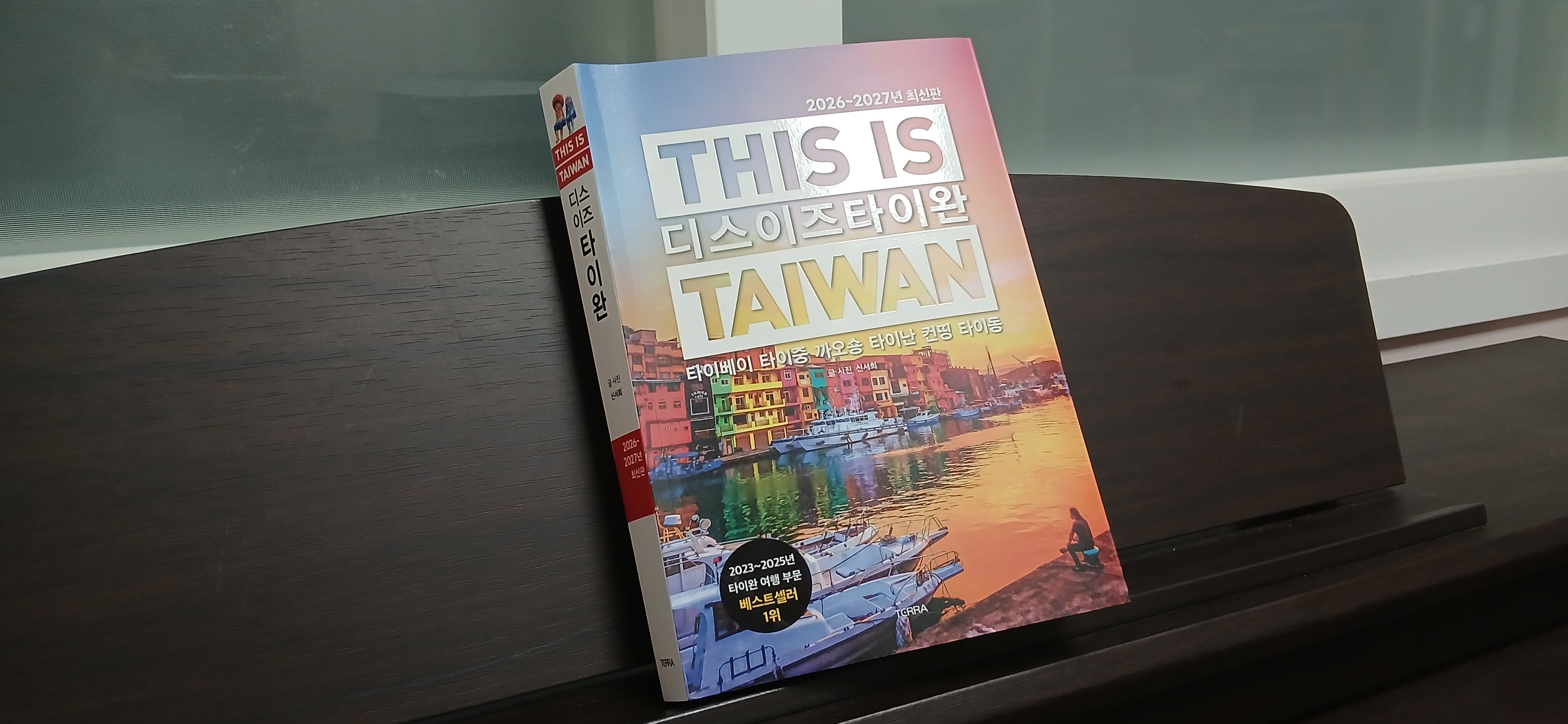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5
- 좋아요
- 30
- 댓글
- 168
- 작성일
- 20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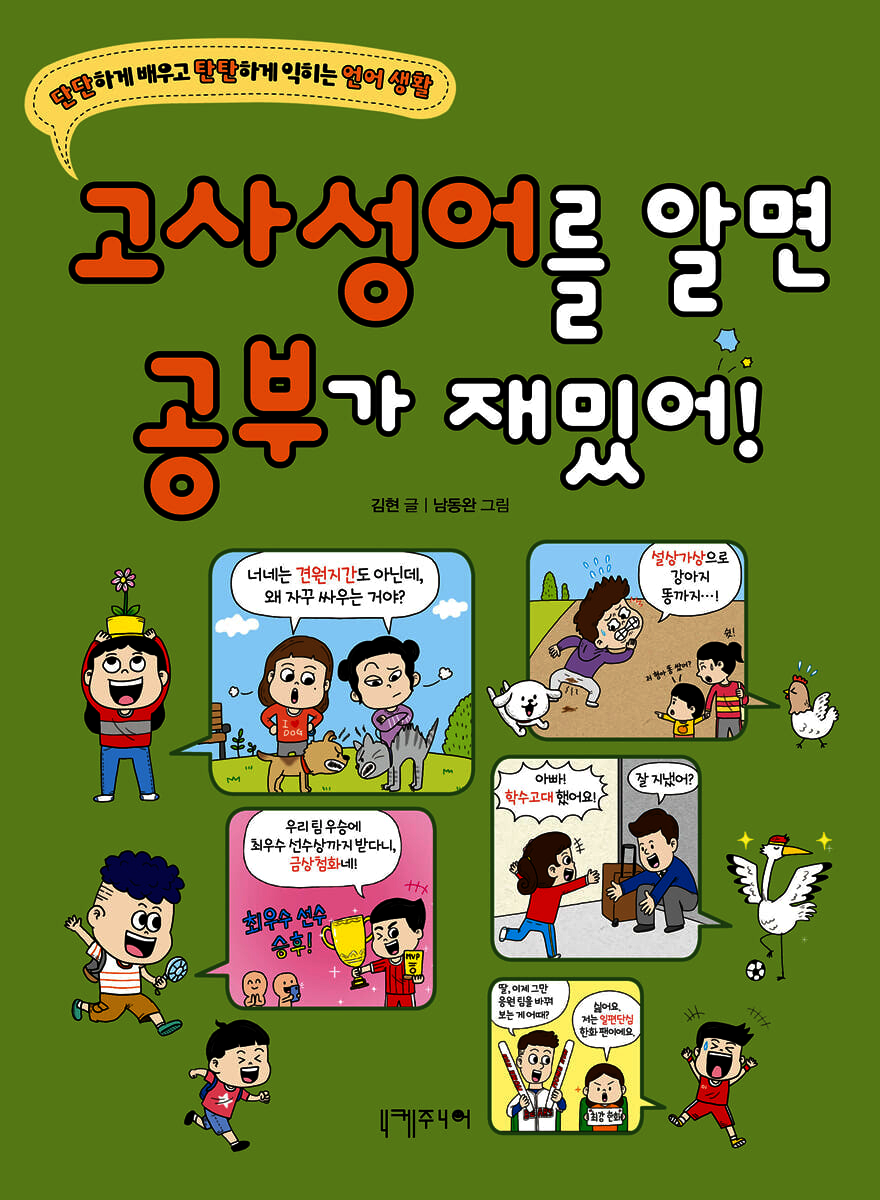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5
- 좋아요
- 24
- 댓글
- 126
- 작성일
- 20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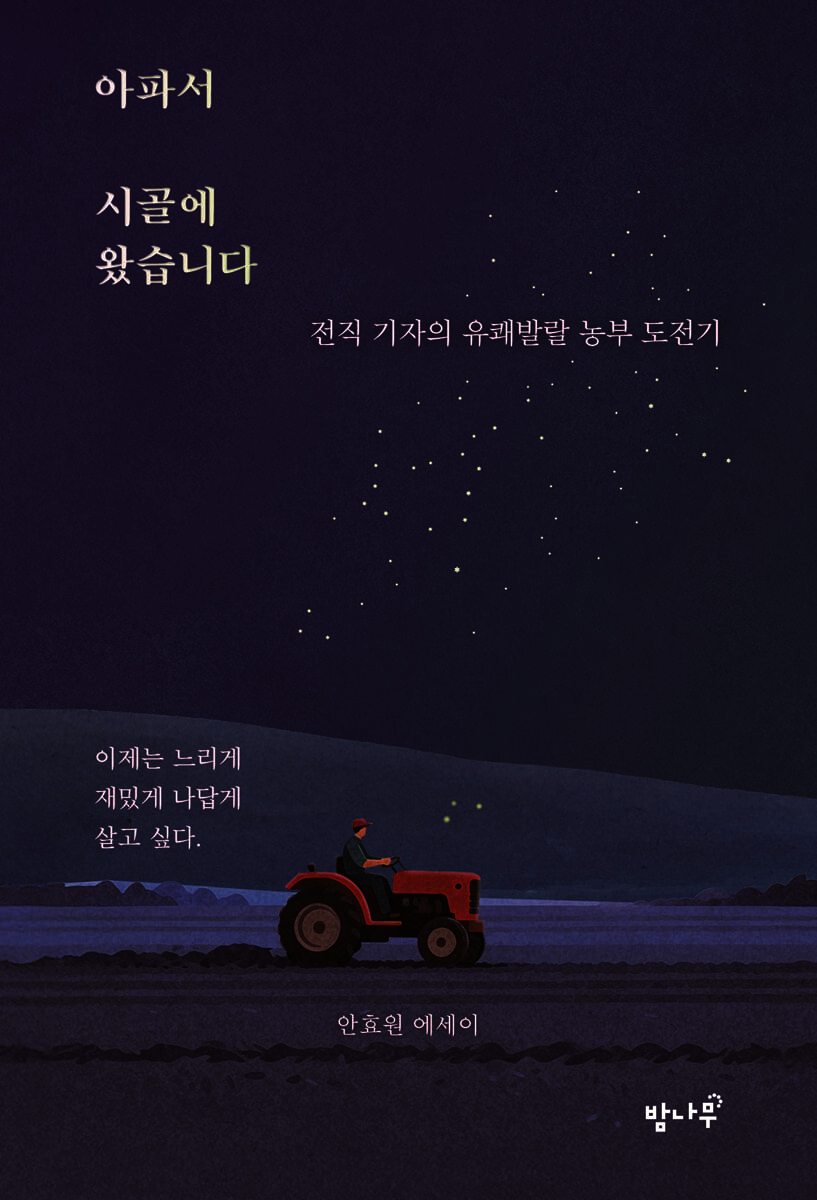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7
- 좋아요
- 16
- 댓글
- 93
- 작성일
- 202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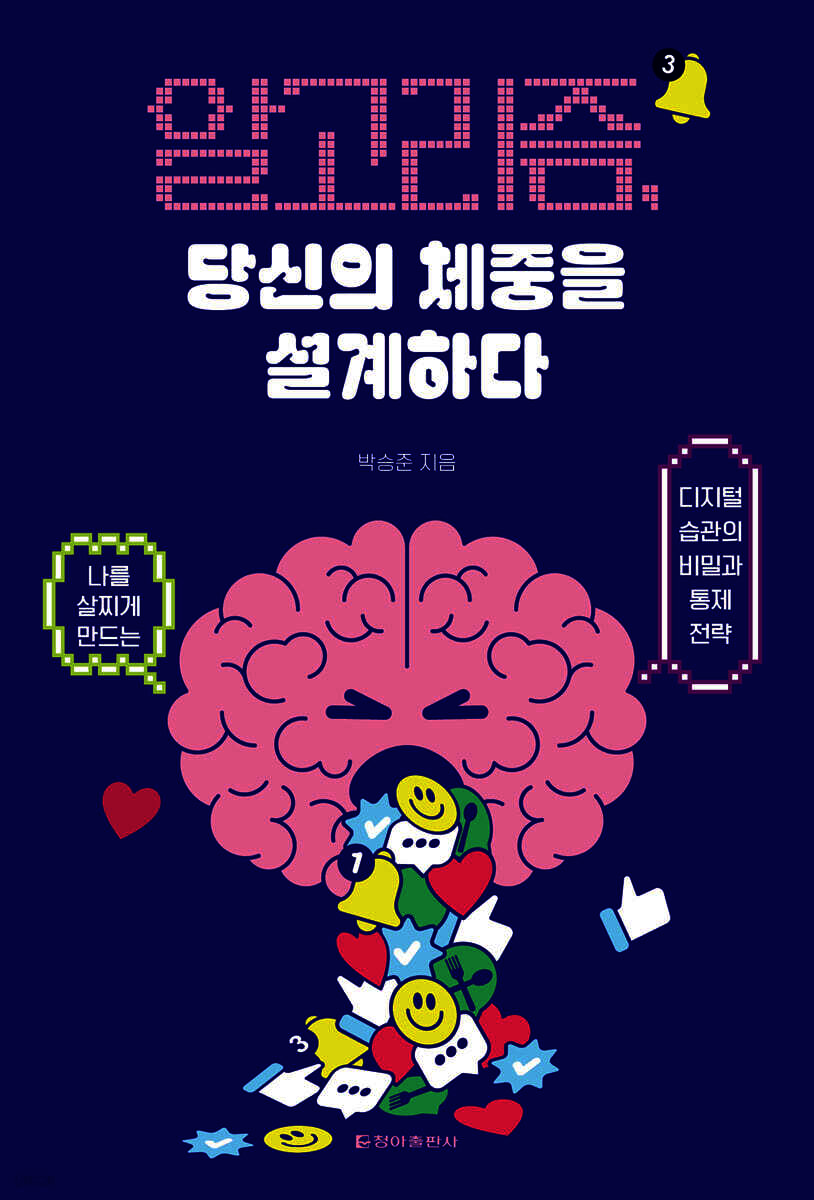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