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카테고리

연파
- 작성일
- 2017.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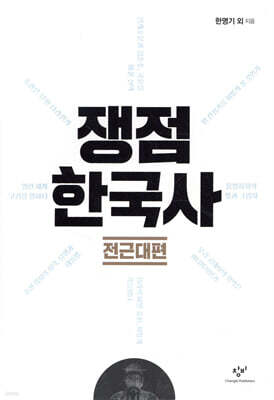
쟁점 한국사 전근대편
- 글쓴이
- 한명기,이기훈,박태균,송호정,강종훈,임기환,채응석,안병우,도현철,이정철 등저
창비
이 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공저인 만큼 관심을 두었던 꼭지를 골라 그 글에 관련된 글을 쓰고 싶다.
------------------------------------------------------------------------------
한때 고려와 몽골(원)의 관계는 민족의 수난사 또는 국난 극복의 역사로 이해되곤 했다. 이런 관점에서 몽골의 내정 간섭이나 고려 관제의 격하, 몽골에 대한 고려의 공납 모두 외세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로 이해되었다. 반면, 몽골이라는 외세에 맞서 항전했던 사실은 모두 국난 극복의 역사로 강조되었다.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하여 30년 동안 항전했다는 사실이나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몽골에 저항했다는 점 등을 모두 국난 극복의 역사로 이해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이러한 설명은 고려와 몽골(원)의 관계를 ‘민족사’ 또는 ‘일국사’(一國史)의 관점에서 이해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족적ㆍ일국사적 관점을 넘어서 고려-몽골(원) 관계사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책(『쟁점 한국사』)에 실린 「원 간섭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고려-몽골(원) 관계사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잘 보여준다. 고려-몽골(원) 관계사에 관한 최근 논의의 특징은 양국의 관계를 책봉-조공관계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책봉-조공관계는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국왕조와 그 이웃나라가 관계를 맺는 방식 중 하나였다. 중국왕조는 주변의 소국(小國)을 제후로 책봉하고, 소국은 중국왕조에 조공을 하는 형태로 책봉-조공관계가 맺어졌다. 물론 이때 책봉-조공관계는 양국의 정치적ㆍ외교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양상은 양국의 정치ㆍ사회적 상황이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달라졌다.
‘원 간섭기’에 고려 국왕ㆍ부마ㆍ정동행성 승상을 겸직했던 고려의 왕은 몽골(원)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몽골이 고려 국왕의 책봉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몽골(원)의 의지에 따라 고려 국왕은 폐위되기도 하고 다시 왕위에 오르기도 했다. 몽골(원)은 책봉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고려 내정에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는 여전히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몽골(원)과 전통적인 책봉-조공관계를 맺고 있었다. 고려와 몽골(원) 사이에는 ‘세조구제’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의 고유한 풍속과 왕조 체제의 보존을 인정한 것이었다. 고려는 이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의 독립과 고유한 문화를 지켜냈다. 그러면서도 고려는 성리학으로 핵심으로 하는 몽골(원)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보편문명에 참여하려고 했다. 요컨대, “원의 강력한 간섭에도 불구하고 고려라는 국가체와 고유한 문화, 역사 공동체를 지켜냈으며, 성리학을 핵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유교 문명사의 흐름에 동참해 유교 문명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고려의 왕은 고려 국왕이라는 지위 외에도 부마와 정동행성 승상을 겸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부마와 정동행성 승상은 단지 ‘명목상의 지위’라고 설명되어 왔지만, 세 지위의 관계는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동행성 승상이 명목상의 지위였음에도 왜 100년 동안 존속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고려가 몽골제국 내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좀 더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고려-몽골(원) 관계를 책봉-조공관계로 이해하는 설명은, 민족사ㆍ일국사적인 관점을 넘어서 고려-몽골(원)의 관계를 정합적으로 설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민족사ㆍ일국사적인 관점은 단지 고려-몽골(원)의 관계를 침략과 저항의 이분법으로만 설명한다. 이 경우 침략을 당했던, 또 몽골(원)에 조공했던 고려는 수동적인 존재로만 그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 간섭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양국의 책봉-조공관계가 양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상황, 동아시아 국제질서라는 변수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고려가 왜 몽골(원)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지, 또 그 관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