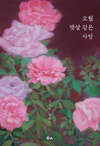다시 한 번 말하자면 우리는 X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왠지 B의 논리가 더 그럴 듯해 보이네요.”라는 반응들을 보인다. 이를 유사성(similarity) 효과라고 한다. 즉, B의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곰이라는 범주와 결론에 해당하는 말이라는 범주가 A의 곰과 새보다 서로 더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주가 추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사성의 원리에 의해서만 발현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양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포괄성(diversity) 효과다. 아래를 보자.
A
* 전제 1: 곰은 X를 지니고 있다.
* 전제 2: 말은 X를 지니고 있다.
* 결론: 도마뱀은 X를 지니고 있다.
B
* 전제 1: 곰은 X를 지니고 있다.
* 전제 2: 참새는 X를 지니고 있다.
* 결론: 도마뱀은 X를 지니고 있다.
이번에도 B가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 왜일까? 결론에 포함되어 있는 도마뱀이라는 범주는 동일하지만 전제에 포함되는 범주에 있어서 ‘곰-말’ 보다 ‘곰-새’가 더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더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곰과 말은 포유류고 참새는 조류이기 때문에 파충류인 도마뱀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번에는 전형성(typicality) 효과라는 것을 예시해준다. 이번에도 B가(그러나 다른 이유로) A보다 왠지 더 그럴듯하다.
A
* 전제 : 고래는 X를 지니고 있다.
* 결론: 포유류는 X를 지니고 있다.
B
* 전제 2: 곰은 X를 지니고 있다.
* 결론: 포유류는 X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B에서 결론의 포유류라는 상위 범주(즉, 곰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범주)에 대해 곰은 A의 고래보다 더 전형적인 일원(member)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X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제와 결론에 대해 추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범주에 관한 기존의 지식에 기초해 다른 느낌을 경험한다
지금까지의 예만 보더라도 “인간의 추리는 불완전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할 것 같다. 왠지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이다.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한 사람에게 완벽한 귀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판단이나 추리의 대상이 되는 영역의 모든 경우를 보여주지도 않으며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시간도 현실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론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 더 정확히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싶어 한다. 이러한 자동적 욕구가 다양한 상황과 만나 어떠한 요인이 우리의 추론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고민해 왔고 오늘 이 공간에서는 범주 지식이 미치는 영향력 하나를 알아봤을 뿐이다. 앞으로 본 캐스트를 통해 하나하나 계속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