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애공식계정
하우애공식계정하우애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6.1.4
- 좋아요
- 3
- 댓글
- 0
- 작성일
- 202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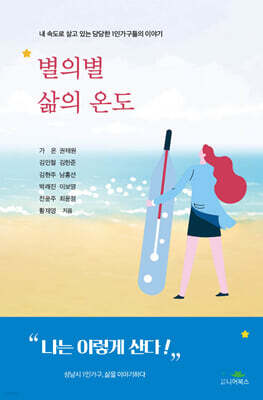
- 작성일
- 2025.11.22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5.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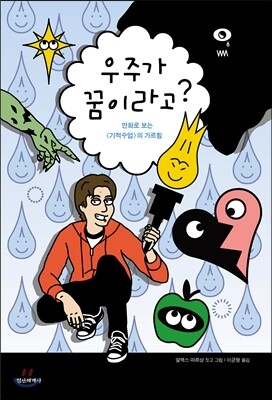
- 작성일
- 2025.11.9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5.11.9

사락 인기글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31
- 좋아요
- 45
- 댓글
- 77
- 작성일
- 2025.12.31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30
- 좋아요
- 34
- 댓글
- 170
- 작성일
- 2025.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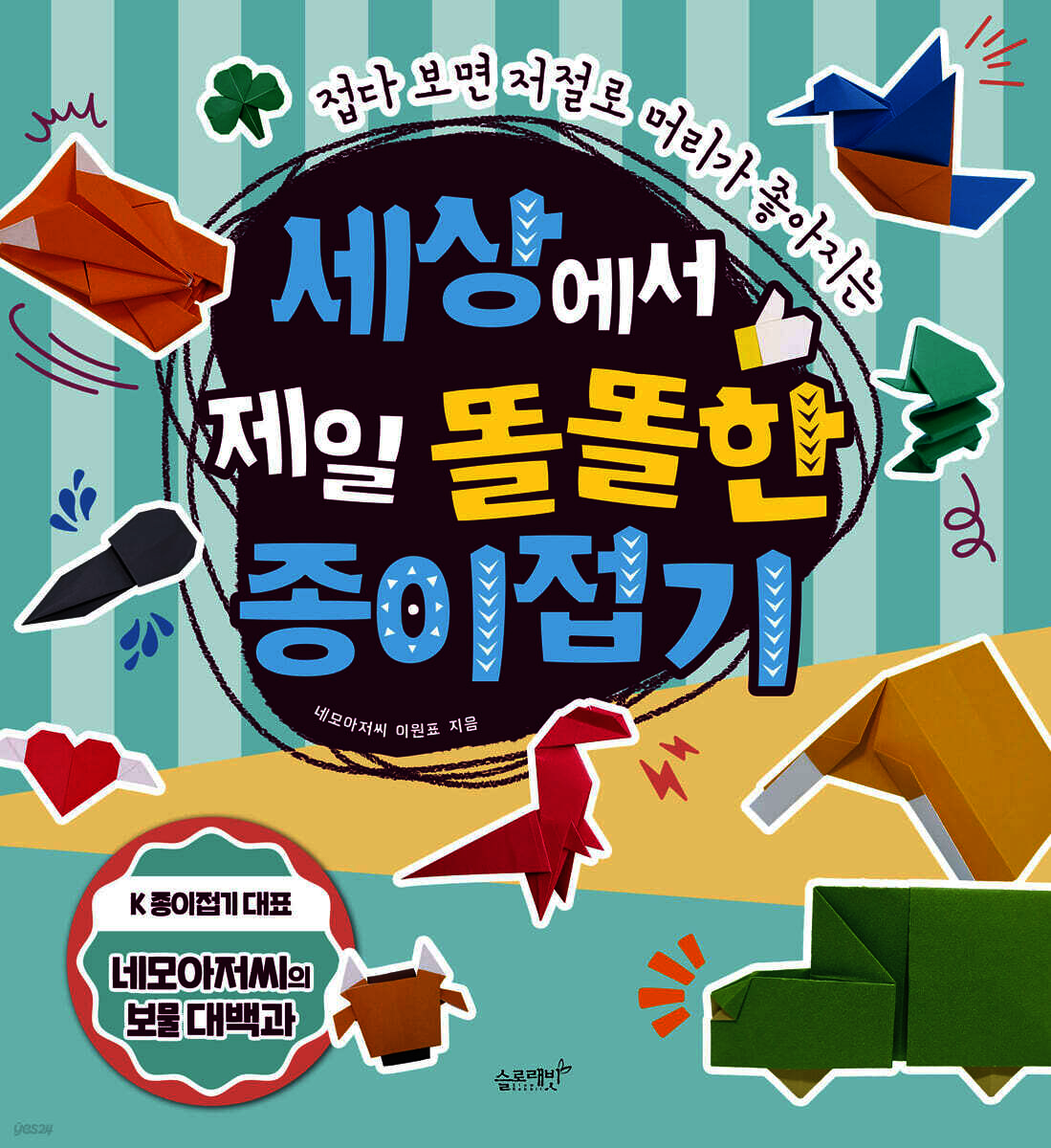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2
- 좋아요
- 15
- 댓글
- 91
- 작성일
- 202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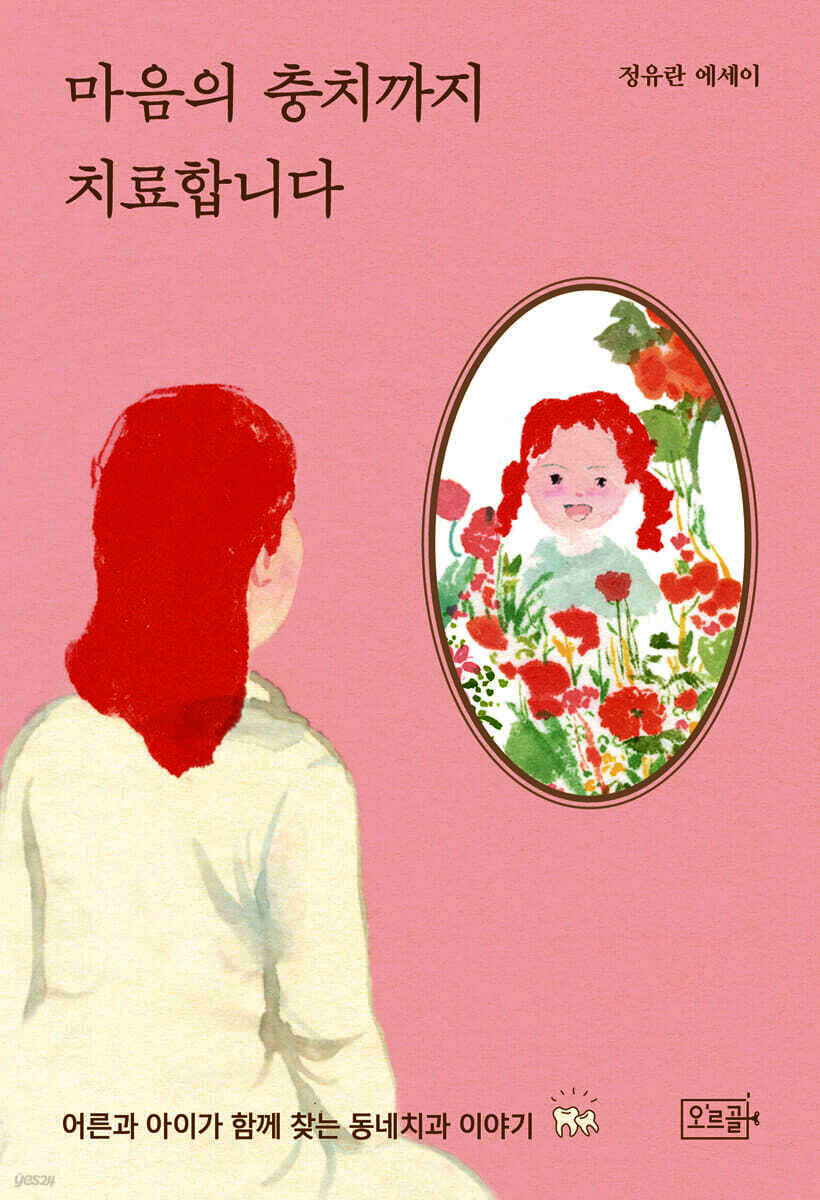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