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문

벤투의스케치북
- 작성일
- 2019.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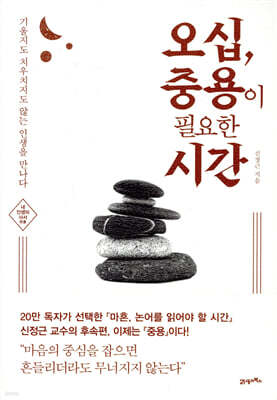
오십, 중용이 필요한 시간
- 글쓴이
- 신정근 저
21세기북스
신정근 교수의 ‘오십, 중용이 필요한 시간’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특별히 오십대에게 필요한 중용 해설서다. 중용은 유교의 대표적 경전 가운데 하나다. 50을 조명이 쏟아지는 특별한 화려함보다 공기처럼 편안하고 일상처럼 부담 없는 보통에 다시 눈이 가는 나이로 설명하는 저자는 그렇게 해서 50과 중용은 평범함에서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한다, 저자는 중용을 인간의 진실에 따라 모든 것을 걸고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도전하는 길로 정의한다.
책은 1강 극단부터 12강 포용까지 각 장을 다섯 부로 나눈 총 60개 부의 해설서다. 각 부를 문에 들어선다는 의미의 입문(入門), 마루에 오른다는 의미의 승당(升堂), 방에 들어선다는 의미의 입실(入室), 함께 이야기한다는 의미의 여언(與言) 등 네 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입문에서는 해당 구절의 현대적 맥락을 소개했고, 승당에서는 중용 원문의 독음과 번역을 소개했고, 입실에서는 ‘중용’ 원문에 나오는 한자어의 뜻과 원문 맥락을 풀이했고, 여언에서는 중용을 현대 맥락에서 되새겨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천 년 전 책인 ‘중용’에서 이미 해괴한 주장을 늘어놓고 괴상한 짓을 벌이는 소은행괴(素隱行怪)란 말이 나오고 있음이 주목할 만하다.
저자에 의하면 ‘중용’은 소은행괴의 세상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한 책이다. 공자는 사이불염(死而不厭)과 지사불변(至死不變)을 비교했다. 둘 다 죽음 앞에 당당함을 의미하지만 배경이 다르다. 전자는 복수심과 공명심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죽음의 위기에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도에 바탕을 두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삶의 행배를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공자는 후자를 강조했다.
저자가 말했듯 ‘중용’대로 살기는 쉽지 않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중용’이라는 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서민들이 중용대로 살지 않게 되면 공동체는 멸망하게 된다. 물론 유교 사회의 몰락은 왕실의 부패에서 비롯되고 군자 또는 사대부의 타락에서 확대되고 일반 서민의 이반에 이르러 실제로 결정난다.
공자는 자신도 중용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중용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을 뿐 아니라 관련된 사태와 사람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중용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다. 중용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도 평생에 걸쳐 계속되기 때문에 삼중으로 어렵다.
군자의 도 또는 유학의 도는 일상과 인륜에서 시작한다. 언고행행고언(言顧行行顧言)이란 말이 있다. 말과 행동이 서로 돌아보게 한다는 의미다. 줄여서 언행상고(言行相顧)라 할 수 있다. 할 말을 딱 부러지게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하고, 핼 행동을 제때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예즉립(事豫則立)은 일을 미리 대비하면 제대로 풀린다는 의미의 말이다. 불예즉폐(不豫則廢)는 그렇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화(中和)란 말이 중요하다. 중은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등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화는 드러나서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말한다.
중은 세계의 위대한 근본이고 화는 세계의 공통된 길이다. 발이중절(發而中節)은 감정이 드러나더라고 수용과 공감의 정도에 들어맞는다는 의미다. 중용(中庸)이란 기울어지지도 치우치지도 않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중(中)과 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의미하는 용(庸)이 만난 말이다. 중용은 어렵다. ‘중용‘에 중용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즁용’은 지(知)를 샛으로 나눈다. 나면서부터 아는 생지(生知), 배워서 아는 학지(學知),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아는 곤지(困知)다.
‘중용’은 행(行)도 셋으로 나눈다. 편안하게 실천하는 안행(安行), 하나하나 따져가며 실천하는 이행(利行), 억지로 노력해서 실천하는 면행(勉行) 또는 강행(强行)이다. 저자는 대부분 곤지면행 또는 곤지강행의 처지에 잇지 않을까? 란 말을 한다. 물론 궁지에 몰려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곤이불학(困而不學)도 있다.
우리는 중용을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는 것, 또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대충 타협하는 것이라고 알기 쉽다. 하지만 그것은 중용의 진의가 아니다. 저자는 중립은 무지를 드러내지 않고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론을 찾고자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 말한다. ‘중용’은 삼중(三重)을 제시한다. 의례(議禮), 제도(制度), 고문(考文)이다. 예에 따라 논의하고 도(규정)를 살피고 문(전통)을 고려하는 것이다.
‘중용’이 쓰인 시대는 극단의 시대였다. 극단의 시대는 경쟁하는 사람끼리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다. 공유하기보다 독점으로 나아간다. ‘중용’을 비롯하여 유학에서는 a하지만 b하지 않는다는 형식을 중용으로 제시한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움을 주되 너무 의존하여 자립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형식이 담이불염(淡而不厭)에서 나타난다. 담박하지만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간이문(簡而文) 온이리(溫而理)다 마찬가지다. 간결하면서 문채가 있고 온화하면서 조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시중(時中)은 중용이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특정 시공간에서 가장 적절한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물론 현재의 시중도 미래의 시중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사람은 주관적이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감정적이어서 일관성을 잃기 쉽다. 그렇기에 중용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조(正租)를 다룬 영화 ‘역린(逆鱗)’을 예로 든다. 정조가 암살의 위기에서 자신을 지키는 말로 인용한 것이 중요의 한 구절이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주희는 성선(性善)을 믿지만 특정 상황에 대한 앎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왕양명은 성선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박학지(博學之) 심문지(審問之) 신사지(愼思之) 명변지(明辨之) 독행지(篤行之)란 말이 있다. 널리 배우고 지세하게 묻고 조심스레 생각하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돈독하게 실천하라는 의미다. ‘중용’은 주위 사람이 한 번 해서 성공하면 나는 백 번 시도하고 주위 사람이 열 번 해서 성공하면 나는 천 번을 하라고 제안한다.
12강은 포용에 관한 글이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을 담았다. ‘중용’을 비롯한 유학 고전들은 보통 사람이 덕행을 가리키는 중용과 진실을 뜻하는 성(誠)을 통해 사(士), 현인(賢人)을 거쳐 성인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용’은 자기주도적인 군자와 이기적인 소인의 특성을 확연하게 구분한다. 군자가 걸어가는 길은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아슴푸레하며 흐릿하고 맛이나 냄새가 진하지 않고 약하다.
소인이 걸어가는 길은 겉으로 뚜렷하다. 누가 봐도 뭐가 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극단의 시대에 쓰인 ‘중용’은 자극적이고 색다른 것이 주는 즐거움에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주는 평안함의 가치를 되돌아보자고 제안한다. 저자는 독자가 책에 서명을 요청하면 이름에 애심원견(愛深遠見)이란 글자를 덧붙인다고 한다. 사랑이 깊으면 멀리 내다본다는 의미다. 사랑도 깊고 멀리 내다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반영이다.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