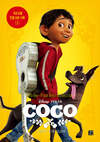- 책을 읽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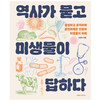
ena
- 공개여부
- 작성일
- 2023.3.26
많은 사람들이 뉴턴이 수줍음 많고, 과묵한 연구자라는 인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다. 조폐국의 책임자로 오래 일하면서 위폐 단속에 열을 올렸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인상은 조금 가실지 모르겠다. 그런데 과학자로서 뉴턴은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떨어지는 사과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 말고, ’거인의 어깨‘와 같은 감동적이지만(물론 실상을 알고 보면 그런 감동도 사라지긴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 말고.
서양 유럽 위주의 과학사를 탈피하여 잊힌 과학의 반쪽 역사를 복원한 제임스 포스켓의 『과학의 반쪽사』에서는 뉴턴의 과학 활동이 네트워크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증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은 요약이다.
“1687년 출간된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는 흔히 계몽주의의 시작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내러티브에서 뉴턴은 보통 이성적인 원리를 적용해 과학 활동을 벌이는 고립된 천재로 묘사된다. 하지만 『프린키피아』를 읽다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듯 이런 묘사는 부정확하다. ... 뉴턴이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것... 그 이유는 그가 고립되어서가 아니라 외부와 무척 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뉴턴은 제국과 노예제, 전쟁을 포함한 더 넓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주요 과학적 돌파구를 만들 수 있었다. 만유인력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뉴턴은 노예선을 타고 탐사하는 프랑스 천문학자들과 중국에서 동인도회사 간부들이 수집한 데이터에 의존했다.” (177쪽)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