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을 읽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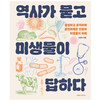
ena
- 공개여부
- 작성일
- 2011.11.24
니얼 퍼거슨의 <시빌라이제이션>을 전체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부분부분 납득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점도 역시 적지 않다.
‘제국주의’를 나쁜 제국주의와 좋은 제국주의로 나누어서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를 옹호한다거나 제국주의의 지배로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식의 서술도 그런 종류이다. 그리고 다윈의 ‘자연선택’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영국식 산업 도시가 세계 전역으로 퍼지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중 일부는 크게 고무되었지만 절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 다윈은 고무된 측이었다. 그 자신은 <종의 기원>에서 인정한 것처럼 산업혁명을 경험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연 선택에 대한 다윈의 설명 중 상당 부분은 19세기 중반 섬유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중략)
그러한 면에서 살펴보면 역사가들이 산업 ‘진화’를 다윈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을른지도 모른다.” (334-335쪽)
이건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다름 아니다. 자연의 진화처럼 사회도 진화한다고 설명하고,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한다. 그리고 약육강식을 옹호하며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은 법칙이라 하는 것이다. 그건 개인과 개인에도 통용되며,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통용되는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바로 제국주의였다.
진화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알듯이 다윈의 자연선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다윈이 지적하고 있듯이 생물에는 ‘고등’과 ‘하등’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으며, 자연선택에 진보라는 개념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상황에서 더 많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개체, 혹은 집단이, 그리고 유전자가 살아남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것을 사회에 묘하게 적용하여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지배와, 사회에서 강한 자의 약한 자에 대한 착취를 옹호한 것이 바로 ‘사회진화론’이었다. 그런데, 니얼 퍼거슨의 견해는 그것과 아주 흡사하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해버리는 순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니얼 퍼거슨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분 옹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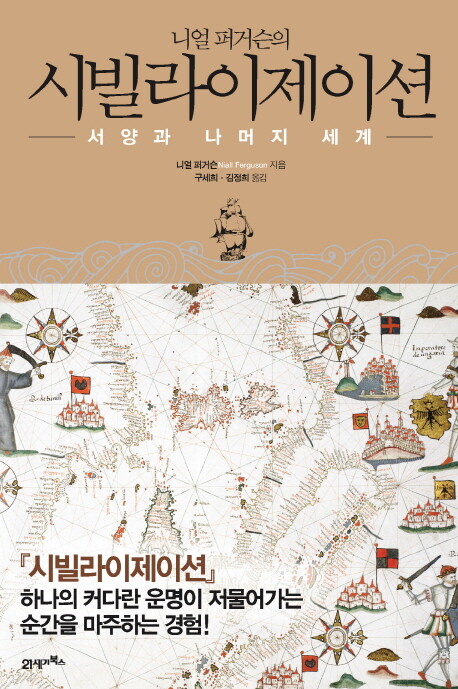
- 좋아요
- 6
- 댓글
- 2
- 작성일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