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을 읽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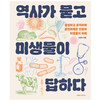
ena
- 공개여부
- 작성일
- 2016.5.23
인류
초기에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이론, 혹은 주장은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대체로 많은 이들이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다. 그 함의가 무엇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데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모두 식인종이다』의 <여성과 사회의 기원>)
모권제 사회는 대체로 신화 등에 의해 지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레비 스트로스는 그것을 신화의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신화에 역사적 신빙성을 부여하며 모권제의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신화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기인한 것이다.”
(154쪽)
즉, 신화란 현재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를 끌어들이는 것인데, 그렇게 꾸며지는 과거는 현재와는 다른 어떤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신화는 현재와는 다른, 그렇지만 다소는 설득력 있는 제도가 과거에 존재했음을 상상해낸다는 것이다. 현재가 부권(父權)이 강력한 사회라면 신화는 과거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 즉 모권(母權)이 강력한 사회였다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레비 스트로스는 어떤 의미에서든 존재했을 모권제 사회에 대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모권제 사회는 아니었다고 한다.
“민족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한때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모권제의 환상에 종지부가 찍어졌다. 부권제 아래에서는 당연하지만 모권제 아래에서도 권력은 남성의 몫이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모권제에서는 어머니의 남자 형제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부권제에서는 남편이 권력을 행사했다는 게 유일한 차이였다.”
(154쪽)
하지만 요는 과거가 부권제 사회였는지, 모권제 사회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겠지만, 현재의 가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남녀가 조화롭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이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서로를 억압하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차이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부권제 사회이든, 모권제 사회이든 중요한 것이다.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