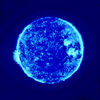- 책을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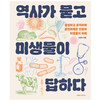
ena
- 작성일
- 202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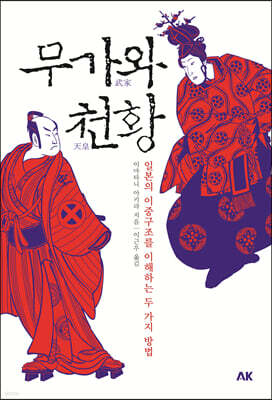
무가와 천황
- 글쓴이
- 이마타니 아키라 저
AK(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일본의 천황제도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커녕 이해하기에도 난감하다. 명칭에서 보면 천황이라면 최고의 지위를 의미하는 게 분명한데 정작 실제 권력은 장군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입헌군주와 같은 위치 같아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한다. 17, 18세기 일본과 제한적으로 교류하던 유럽의 문헌에서 ‘교황’이라고 표현했듯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저 제사장이었으면 메이지유신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일본 밖에서 잘 이해하기 힘든 제도가 천황제인데, 그래서 이에 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진다. 현대 일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마타니 아키라의 《무가와 천황》는 그런 시도 중 하나다. 그는 모든 시기의 천황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가장 역동적이었던 시기 중 하나인 센고쿠 시대 전후(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 후기에서 도쿠가와 막부 전기까지)를 통해서 천황제가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존속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맨 처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은 이후 히데타다가 (장군으로서) 정권을 쥐고 있던 시기, 고미즈노오 천황이 막부와의 교감도 없이 양위를 강행한 사건이다. 이는 무로마치 막부, 특히 요시미쓰 시기였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천황은 자기 마음대로 그 지위를 내려놓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미즈노오는 도쿠가와 막부(에도 막부)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표출했던 것이고, 결국은 막부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양위에 성공한다(이로써 거의 800년 만에 여성 천황인 메이쇼 천황이 즉위한다).
이 사건은 분명 돌출적인 사건임이 분명하지만, 이마타니 아키라는 이것을 천황의 위치에 대한 흐름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 즉 무로마치 시대 요시미쓰가 천황을 찬탈하려던 것에서 실패한 이후 센고쿠 시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시대를 거치면서 (무가(武家)들이 무력으로 천하를 쟁패하던 시대였음에도) 점점 천황의 존재감이 커져갔던 흐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흐름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거의 천하를 통일했지만(이에야스 측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이에야스와 손을 잡아야만 했다), ‘장군’이라는 칭호를 쓰지 못하고, ‘관백’이라는 칭호를 써야만 했다. 관백은 통상 공가(公家), 즉 문신으로서 천황의 신하로서 갖는 지위였다. 관백 히데요시는 자신의 의사를 천황의 입과 문서를 통해서 전달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권력을 천황의 권위로서 보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마타니 아키라는 이를 ‘왕정복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 사망 이후 세키가하라 전투와 오사카 전투를 거치면서 완전한 천하 통일을 이루었고, 히데요시와는 달리 장군의 지위에 오른다. 그리고 천황과의 관계를 히데요시 이전으로 돌리고자 한다. 죽은 후에 신의 위치에 오르는데 이는 죽기 전부터 추진했던 것이다. 천황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천하를 호령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미즈노오 천황의 갑작스런 양위 사건은 막부 체제가 결코 천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만다.
실력만으로 보면 천황이 될 수 있는 무가의 실력자들은 많았다. 하지만 누구도 천황이 되지 못했다. (메이지 유신 이전) 천황이 아무리 유폐된 존재였지만 천황이라는 존재에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은 점점 공고화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현대의 일본에서도 (천황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천황에 대해서 거의 공기처럼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 셈이다.
이마타니 아키라의 시각이 일본 역사학계의 완전히 보편적인 시각은 아니라는 점은 옮긴이 후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천황제라는 것의 성격상 보편적인 해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면서, 또한 핵심 중 하나인 천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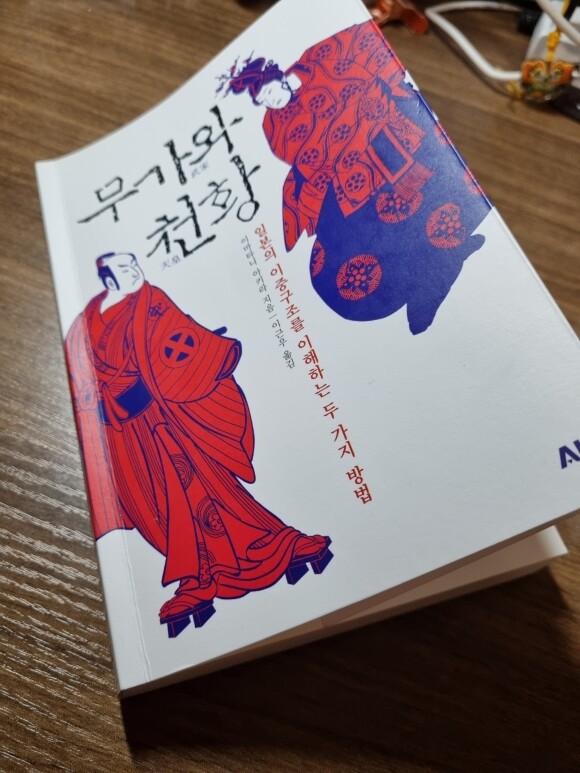
* 일본의 ‘천황’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느 것도 흡족하지 않다. ‘천황’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이 없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일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아, 그들이 부르는 대로 ‘덴노’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이 표현들을 나는 모두 써봤다). 어느 곳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보통 나는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따르기로 한다. 여기서는 ‘천황’이라고 했다. 사실 일본의 ‘천황’이라는 표현에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중국의 ‘황제’라는 표현에 끄덕이는 것은 이중적이기도 하다. 그저 그쪽에서 부르는 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고 그들의 관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천황’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이 좀 없어지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또한 ‘장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將軍’이니 ‘장군’이지만, 우리가 부르는 장군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쯤은 상식이다. 그래서 종종 ‘쇼군’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위는 우리의 한자음대로 번역하면서(예를 들어, 천황과 관백) 이것만 쇼군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 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장군과 다르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으니 그냥 ‘장군’이라고 번역하더라도 혼란은 없을 것이니 그렇게 번역한 것 같다.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