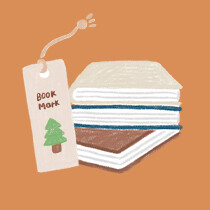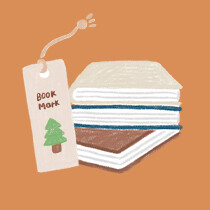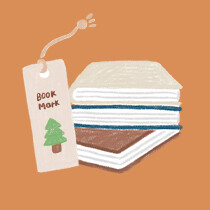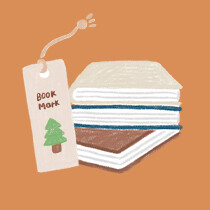 ena
ena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ena님의 최신글
- 작성일
- 10분 전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10분 전

- 작성일
- 2026.2.1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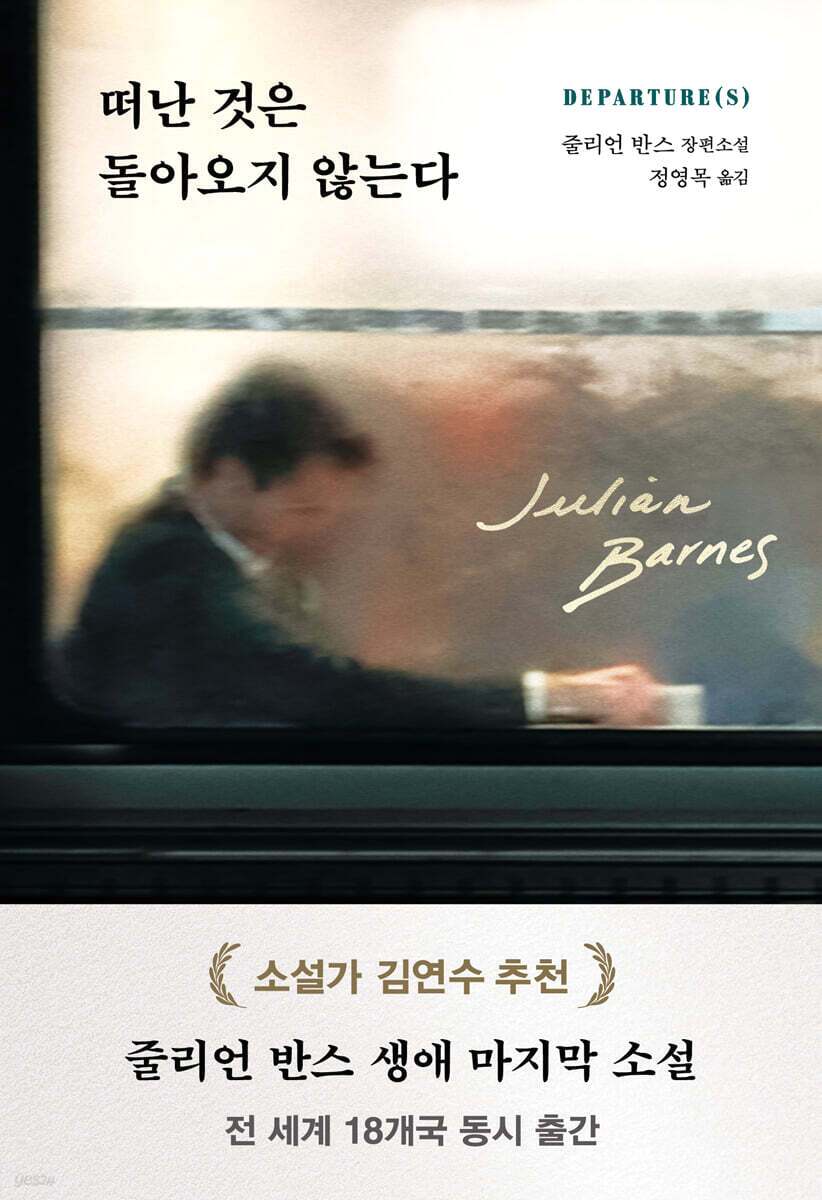
- 작성일
- 2026.1.31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6.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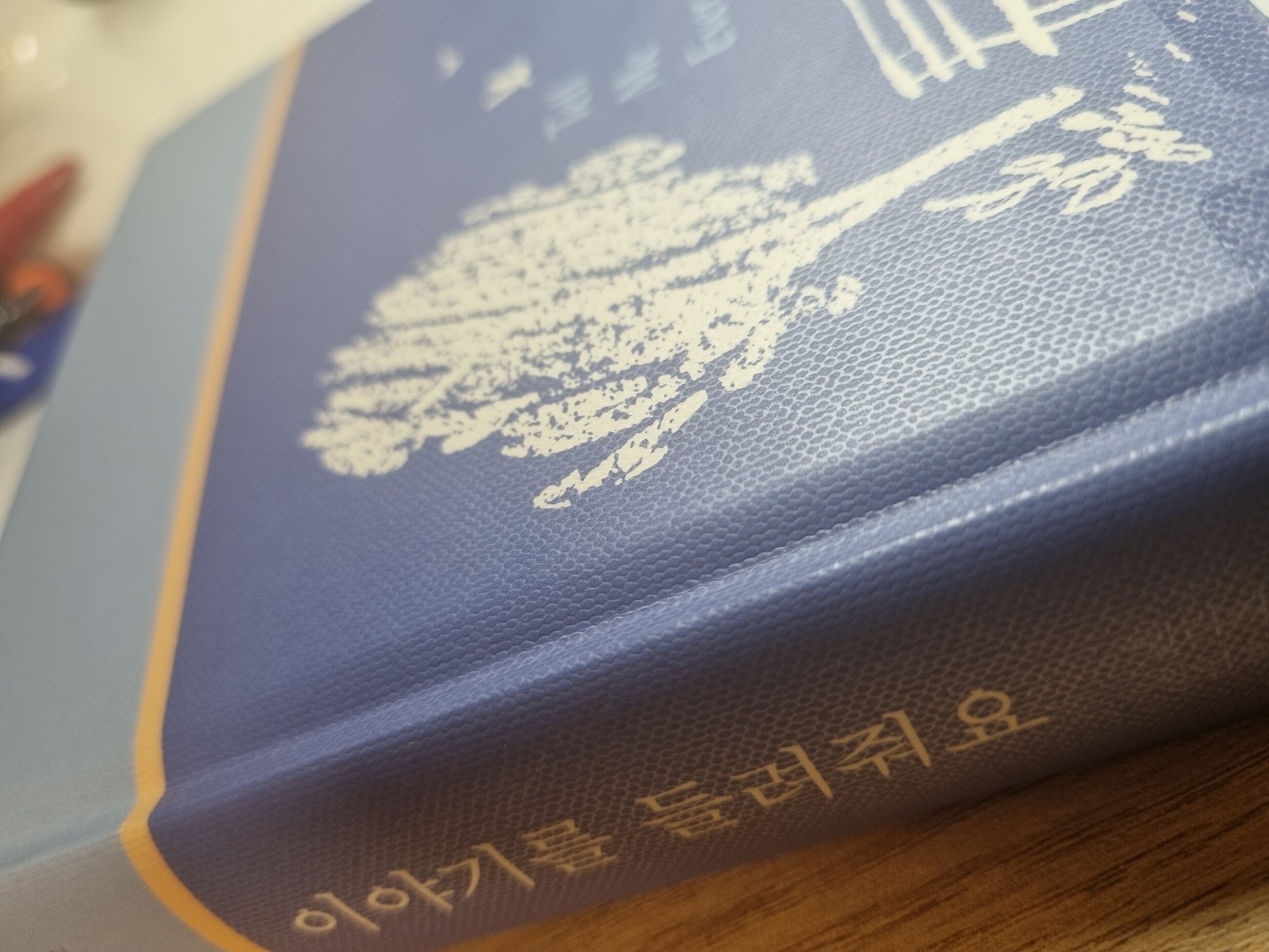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28
- 좋아요
- 56
- 댓글
- 98
- 작성일
- 2026.1.28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29
- 좋아요
- 26
- 댓글
- 146
- 작성일
- 2026.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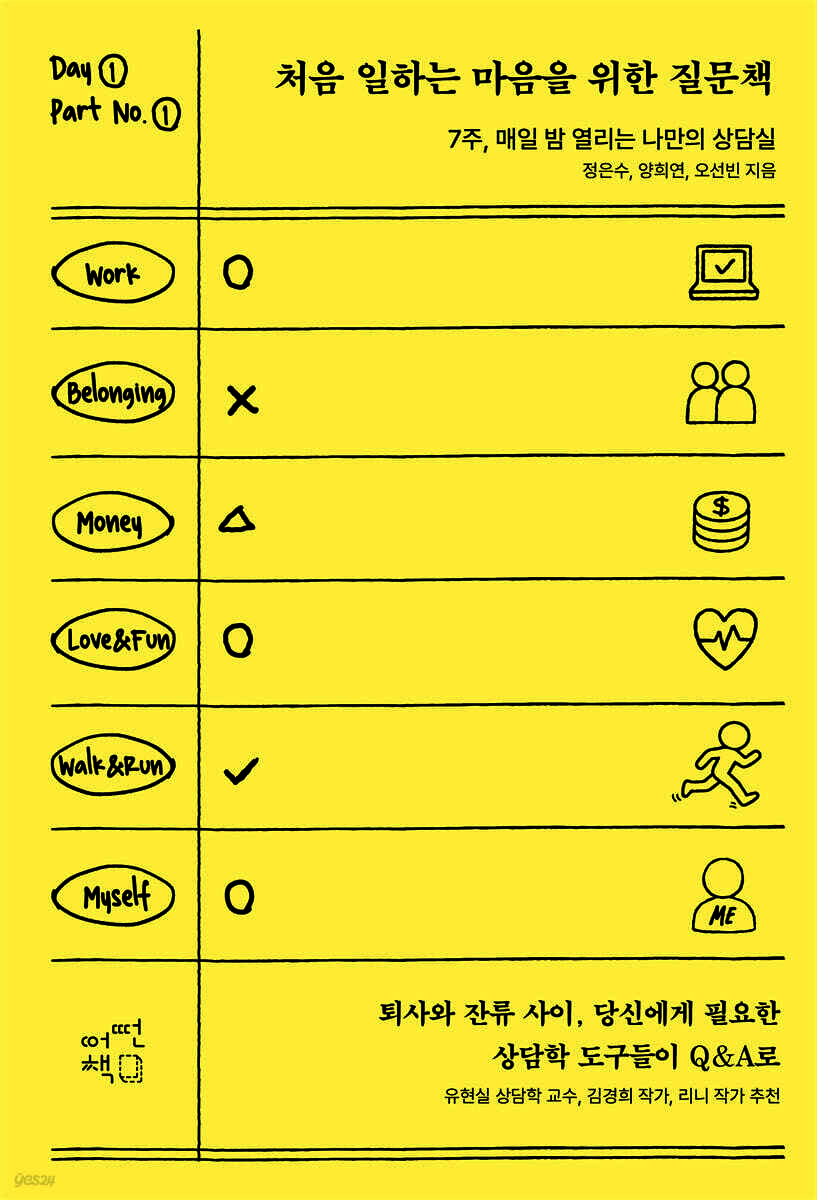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28
- 좋아요
- 25
- 댓글
- 162
- 작성일
- 2026.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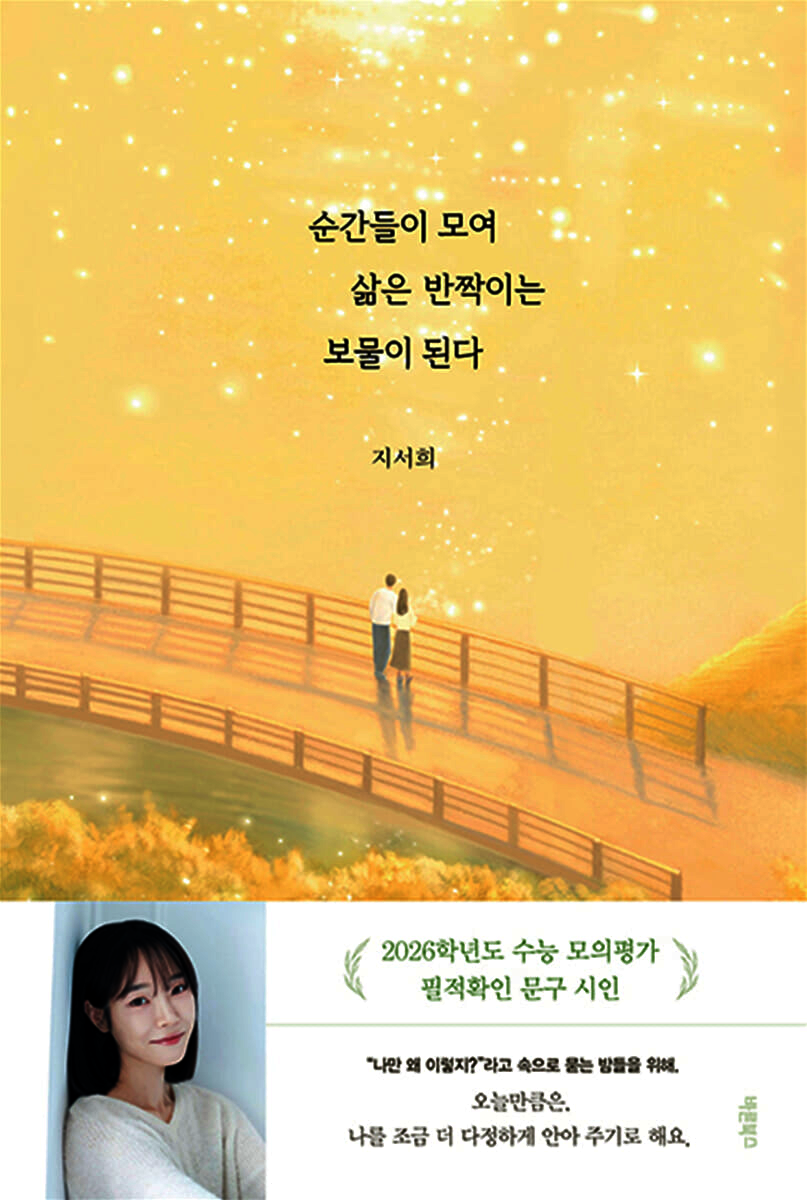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