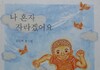- 시집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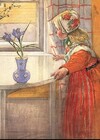
오르페우스
- 작성일
- 2021.7.22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 글쓴이
- 안희연 저
창비
언덕
온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걸어갔다
언덕이라 쓰고 그것을 믿으면
예상치 못한 언덕이 펼쳐졌다
그날도 언덕을 걷고 있었다
비교적 완만한 기울기
적당한 햇살
가호를 받고 있다는 기쁨 속에서
한참 걷다보니 움푹 파인 곳이 나타났다
고개를 들자 사방이 물웅덩이였다
나는 언덕의 기분을 살폈다
이렇게 많은 물웅덩이를 거느린 삶이라니
발이 푹푹 빠지는 여름이라니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
언덕은 울상을 하고서
얼마 전부터 흰토끼 한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했다
그 뒤론 계속 내리막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밤이 왔다
언덕은 자신에게
아직 토끼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지만
고요 다음은 반드시 폭풍우라는 사실
여름은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계절이라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토끼일까
쫓기듯 쫓으며
나는 무수한 언덕 가운데
왜 하필 이곳이어야 했는지를 생각했다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
- 안희연,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시인은 “온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걸어갔다”라는 시구로 시를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나’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시인이 말하는 ‘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인은 ‘나’를 일상적 자아로 생각하는 듯싶다. 일상적인 자아는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 욕망은 늘 무언가를 향한 욕망으로 표현된다. 욕망하는 자아=나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자연을 파괴한 자리에 문명을 건설한 근대인들을 떠올려 보라. 근대인이 설정한 ‘나’와 자연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다. ‘나’는 자연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사물이 정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근대인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물을 온전히 지배하려고 한다.
어찌 보면 시적 사유란 근대인의 사물 인식을 내부로부터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 시인은 보이는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보이는 사물 너머에서 빛나는 ‘흔적’에 시인은 주목한다. 그 흔적에 이르려면 시인은 사물을 지배하려는 헛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시의 문맥을 따르자면, “온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 시인이 특정한 장소를 걷는 것은 아니다. “언덕이라 쓰고 그것을 믿으면”이라는 시구에 주목해 보자. 시인은 상상의 장소로 길을 떠난다. 하긴, 상상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나를 잃어버리기 위한 여행이라면 시인은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예상치 못한 언덕이 펼쳐져도 기꺼이 여행을 떠날 마음을 먹고 있다. 한마디로 시인은 어떻게든 ‘나’를 잃어버리려고 한다.
그날도 시인은 언덕을 걷고 있었다. 비교적 완만한 기울기의 언덕에는 적당한 햇살이 내리비쳤다. “가호를 받고 있다는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드는 찰나, 갑자기 움푹 파인 곳이 나타났다. 사방이 물웅덩이로 뒤덮여 있다. “발이 푹푹 빠지는 여름”에 암시된 대로, 여기저기에 생긴 물웅덩이는 언덕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에둘러 보여준다. 시인은 묻는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언덕은 울상을 하고서/ 얼마 전부터 흰토끼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다 했다”. 흰토끼가 사라지면서 언덕에는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만큼 언덕은 흰토끼를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얘기리라. 흰토끼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이후로 언덕의 삶은 계속 내리막이었다. 감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밤이 와서 언덕을 옥죄었다.
이상한 점은 아직 언덕 곁에는 토끼가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언덕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흰토끼와 토끼는 다른 것일까? 언덕 입장에서 보면 흰토끼는 그저 토끼가 아닐지도 모른다. 오직 하나의 흰토끼가 있을 뿐이다. 언덕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흰토끼를 잃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언덕은 왜 이리 흰토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고요 다음은 반드시 폭풍우라는 사실”을 언덕은 잘 알았고, “여름은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 존재하는 계절이라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다”. 흰토끼에 매여 울상이 된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언덕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는데도 언덕은 도무지 흰토끼로부터 놓여날 수 없다. 놓아버리려는 마음을 먹을수록 흰토끼는 더욱 더 언덕에게 들러붙는다.
언덕은 왜 이런 곤경에 빠진 것일까? 흰토끼를 찾으면 언덕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까? 시인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토끼일까”라고 묻고 있다. 토끼를 잃어버렸으면 토끼를 찾으면 된다. 한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흰토끼를 쫓는 사람이 도리어 흰토끼에게 쫓기는 격이라고나 할까? 흰토끼에 집착하면 흰토끼 너머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언덕은 흰토끼 너머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무수한 언덕 가운데/ 왜 하필 이곳이어야 했는지를 생각했다”라고 시인은 적는다. ‘나’를 온전히 잃으려는 상상의 여행길에서 시인은 왜 멜랑콜리에 빠진 언덕을 상상한 것일까? 멜랑콜리에 빠진 주체는 죽은 사물에 집착한다. 죽은 사물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언덕이 지금 그렇다. 언덕은 사라진 흰토끼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 시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라는 시구의 의미는 정확히 이 맥락에 걸려 있다. 가고 있다는 사실은 시간 속에서 변하는 모든 사물을 가리킬 것이다. 변하지 않고 어떻게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하고, 잊을 것은 잊어야 한다. 반으로 접히는 어떤 시간은 이리 보면 기억으로 주름진 시간을 나타낸다고 봐야 하겠다. 하지만 그 기억 자체가 삶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시인의 말마따나 “펼쳐 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멜랑콜리에 빠진 언덕은 바로 시간 속에서 다른 풍경이 될 수밖에 없는 ‘흰토끼’에 집착하고 있다. 시인은 온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이 점을 깨닫는다. 시간을 견뎌내는 사물은 없다는 것. 그러므로 보낼 것은 보내야 한다는 것. ‘나’라고 해서 다를까? 끊임없이 변하는 ‘나’를 시인은 여름 언덕에서 배운 셈이다.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