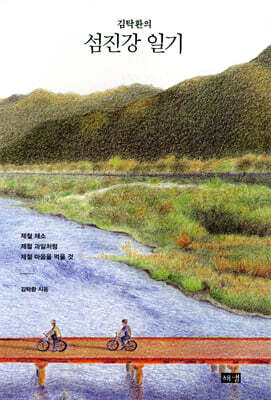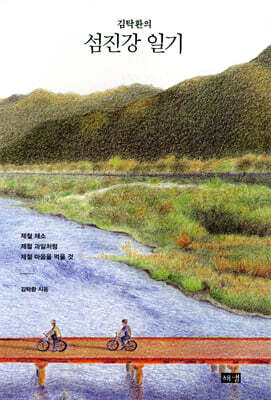quartz2
quartz2quartz2님의 최신글
- 작성일
- 13시간 전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13시간 전

- 작성일
- 2025.9.10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9.10

- 작성일
- 2025.9.8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9.8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9.8
- 좋아요
- 28
- 댓글
- 197
- 작성일
- 202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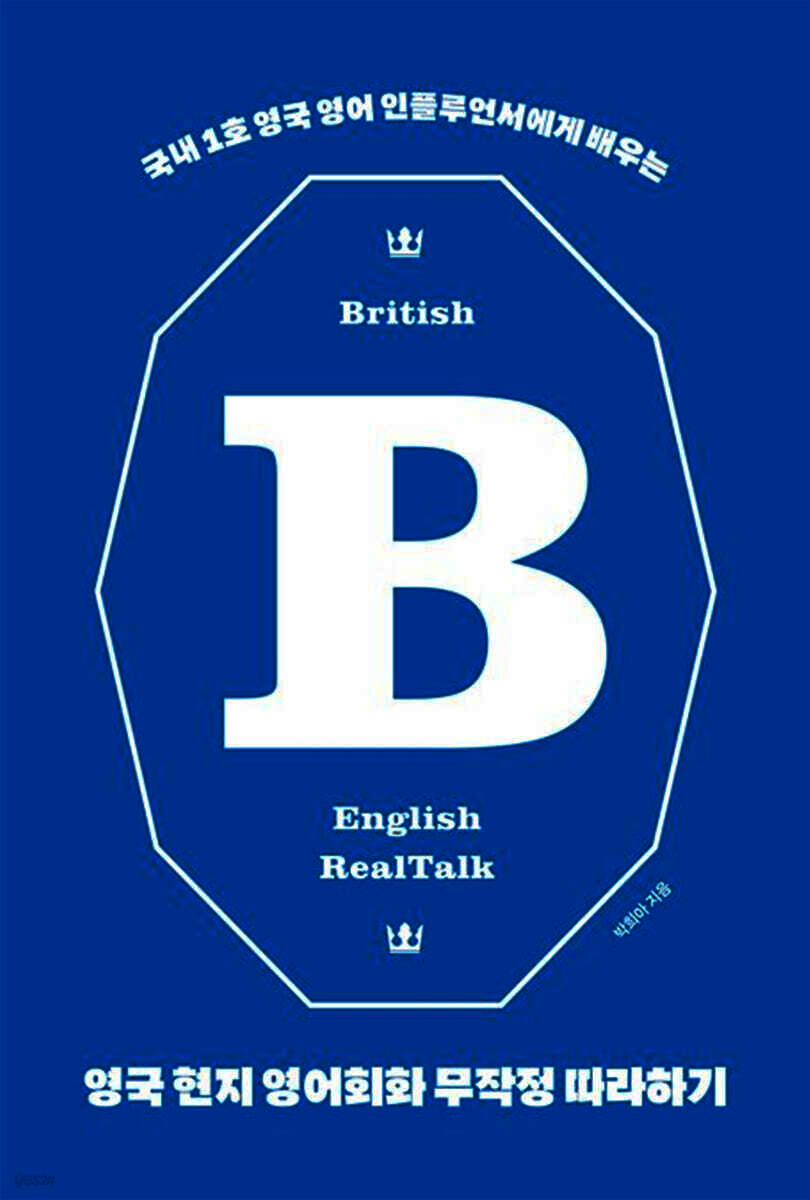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9.8
- 좋아요
- 16
- 댓글
- 73
- 작성일
- 2025.9.8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9.8
- 좋아요
- 42
- 댓글
- 239
- 작성일
- 202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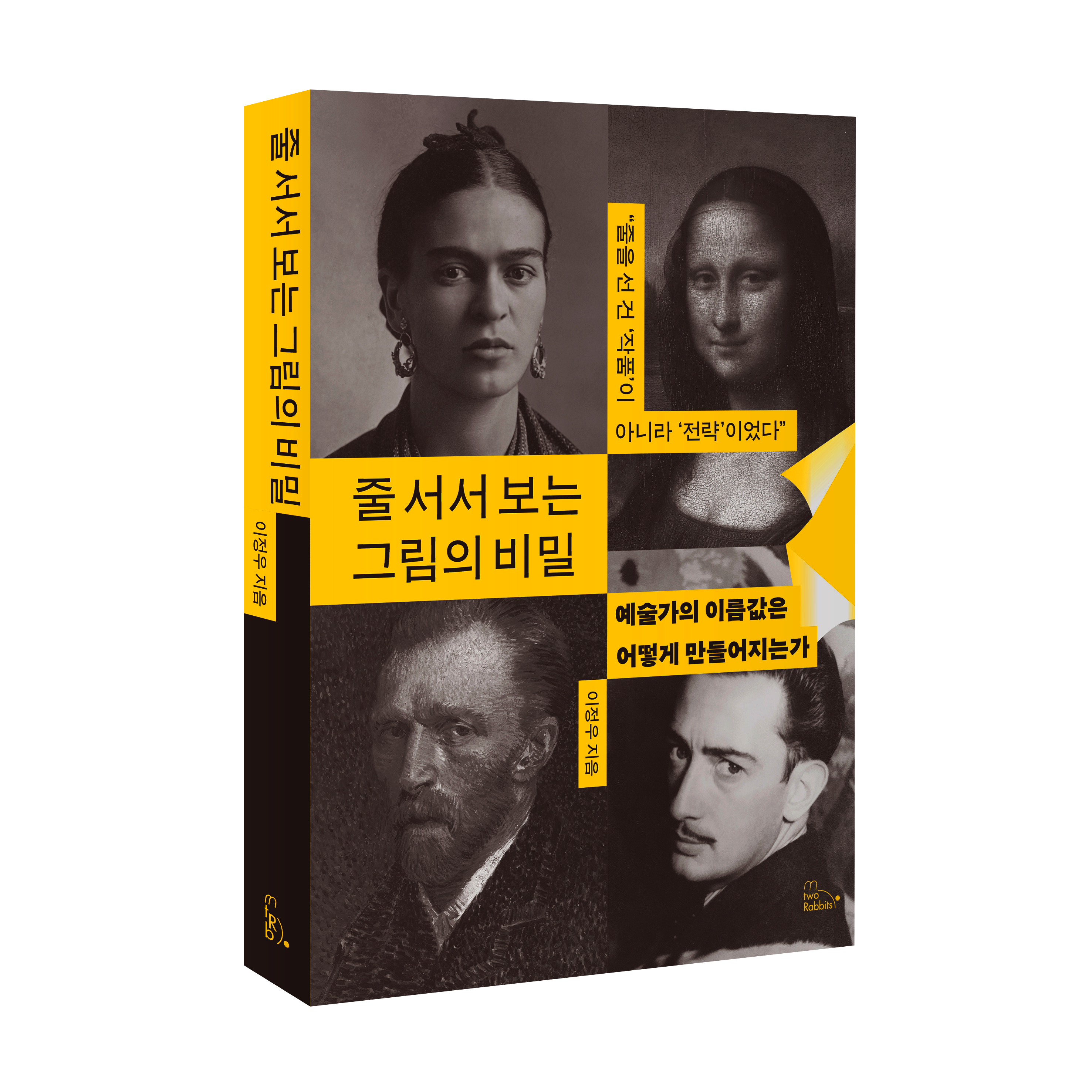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