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읽는니터
책읽는니터책읽는니터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5.12.23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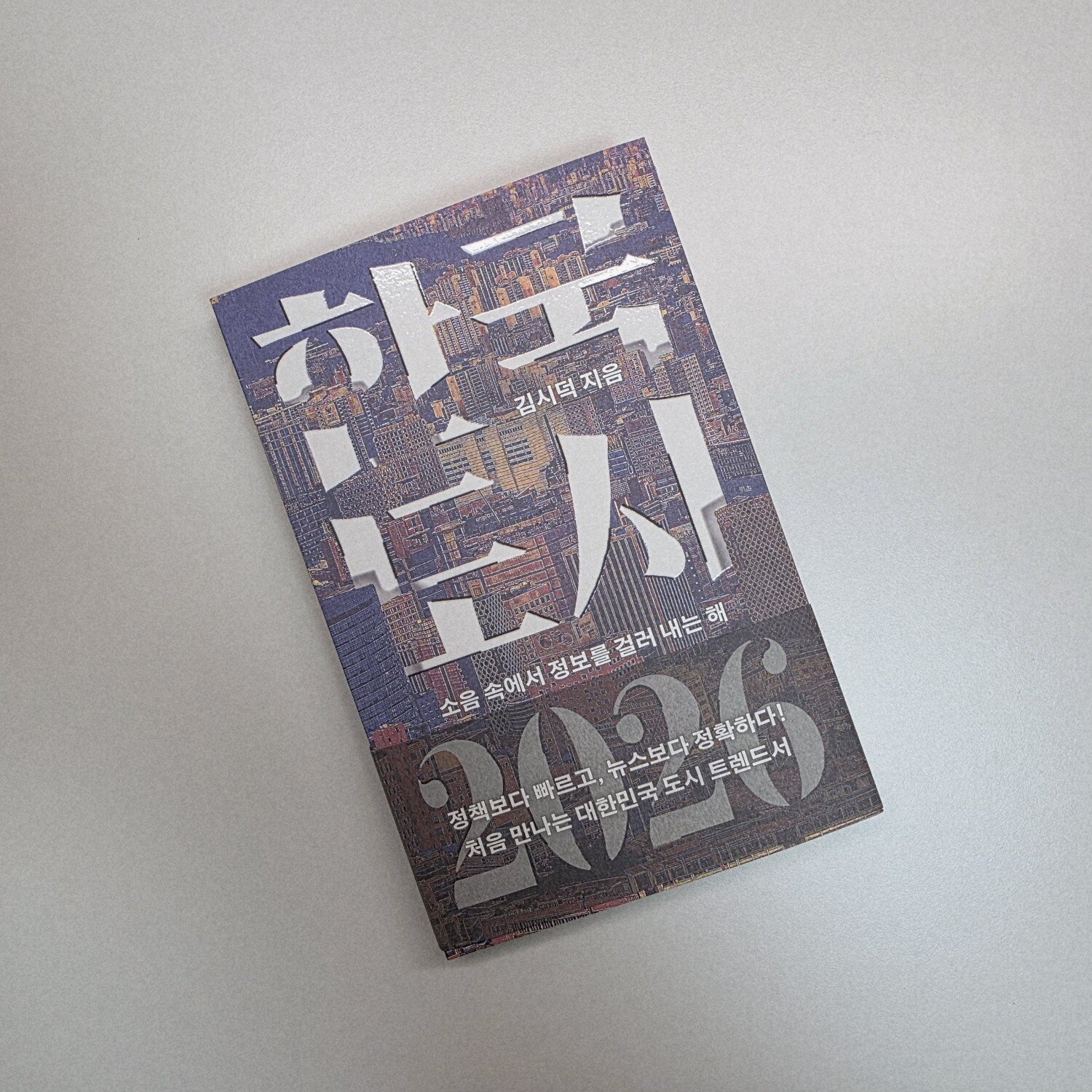
- 작성일
- 2025.12.19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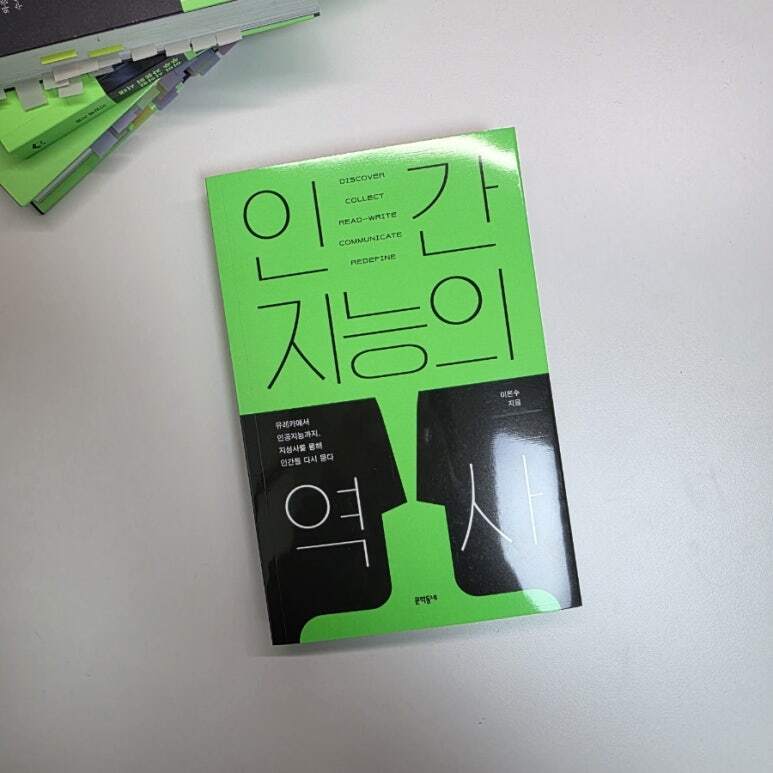
- 작성일
- 2025.11.17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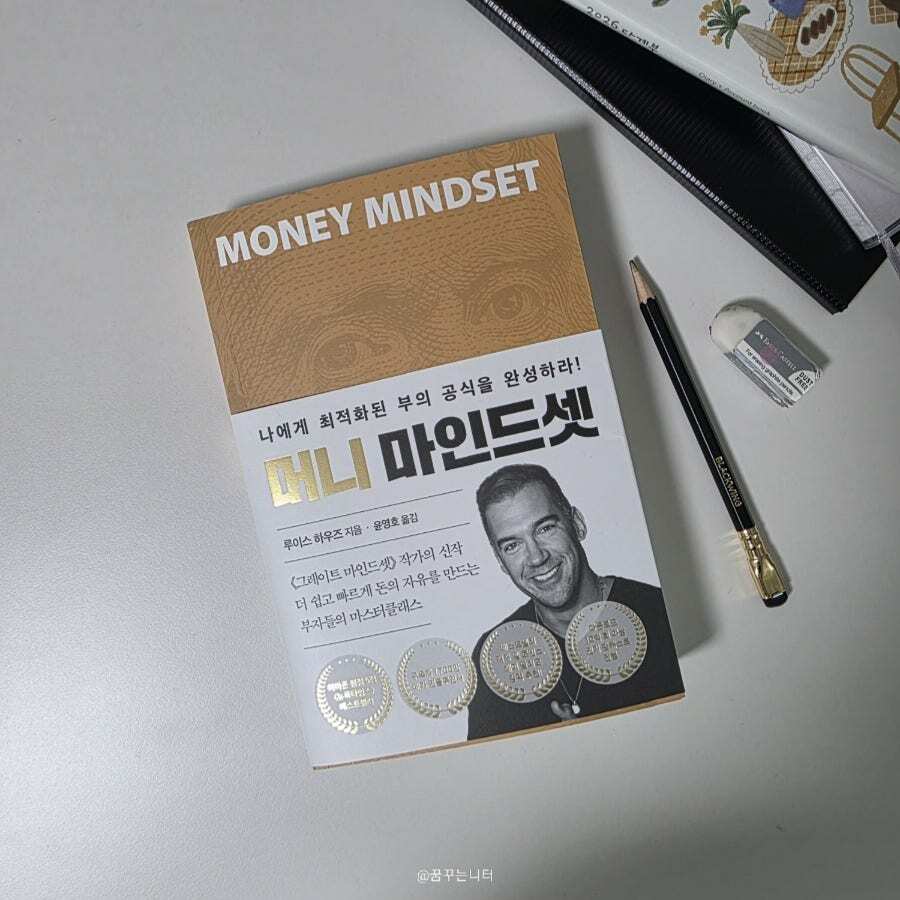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14
- 좋아요
- 37
- 댓글
- 230
- 작성일
- 2026.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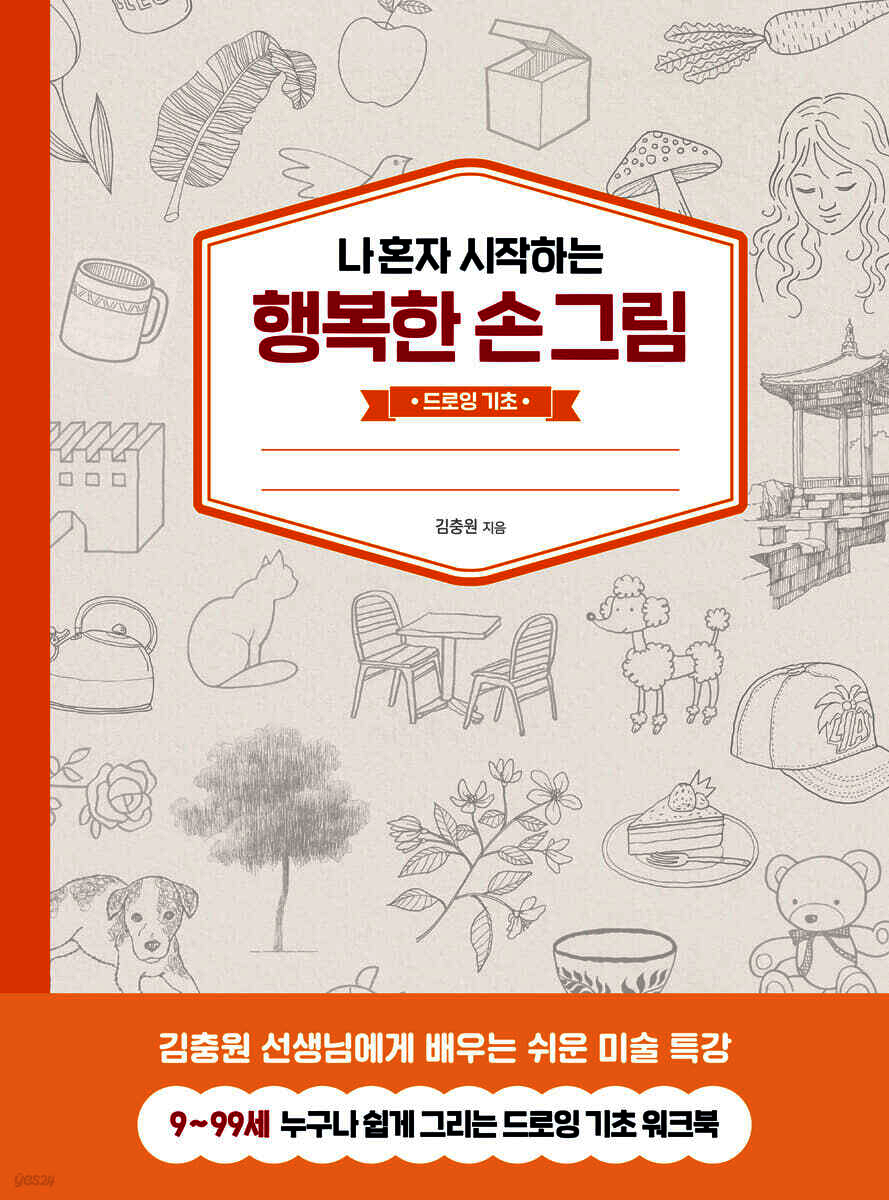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14
- 좋아요
- 55
- 댓글
- 93
- 작성일
- 2026.1.14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15
- 좋아요
- 28
- 댓글
- 195
- 작성일
- 2026.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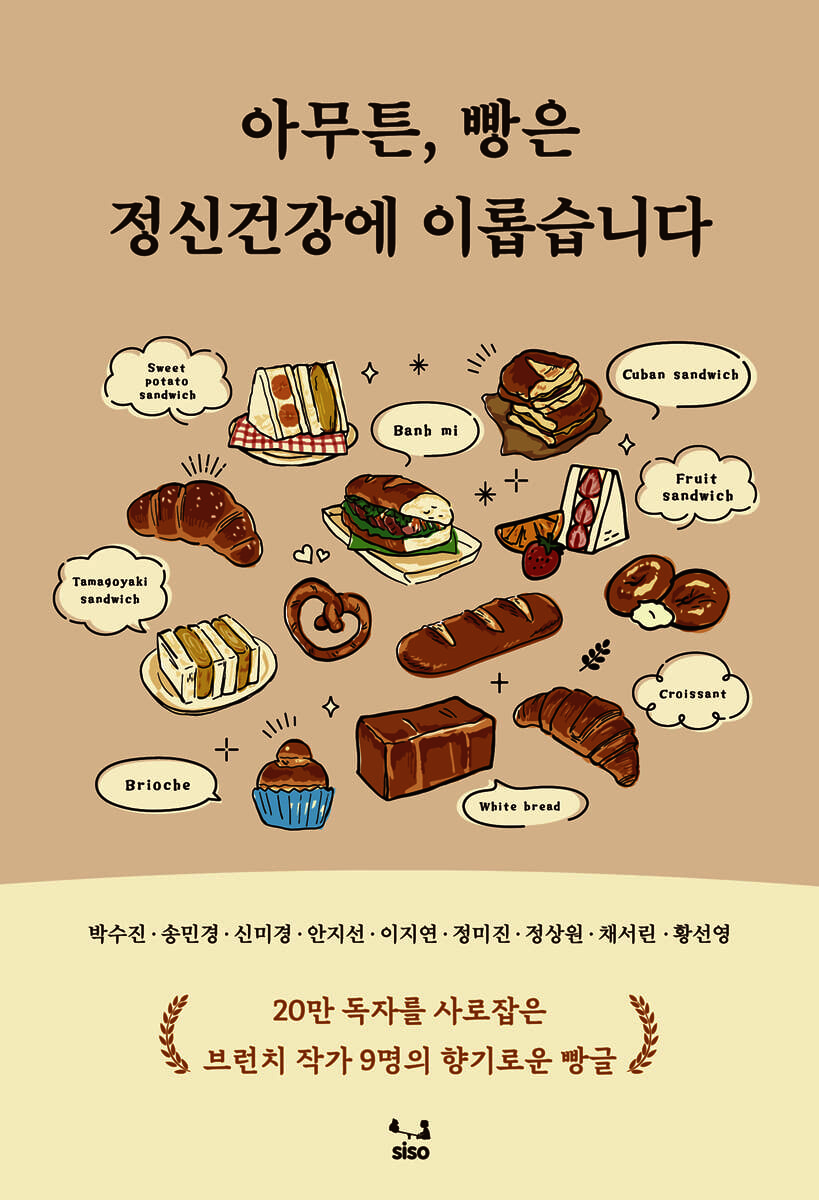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