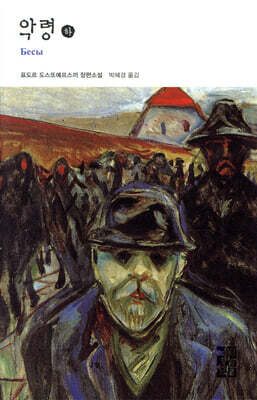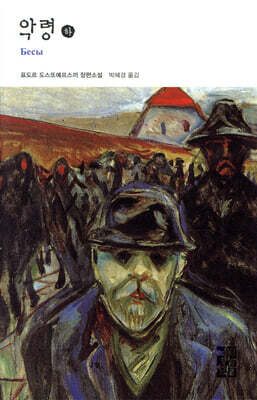쿠니토리
쿠니토리쿠니토리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2.2.8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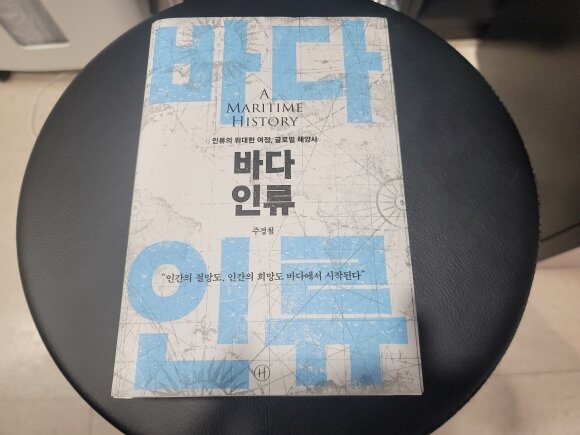
- 작성일
- 2022.1.31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2.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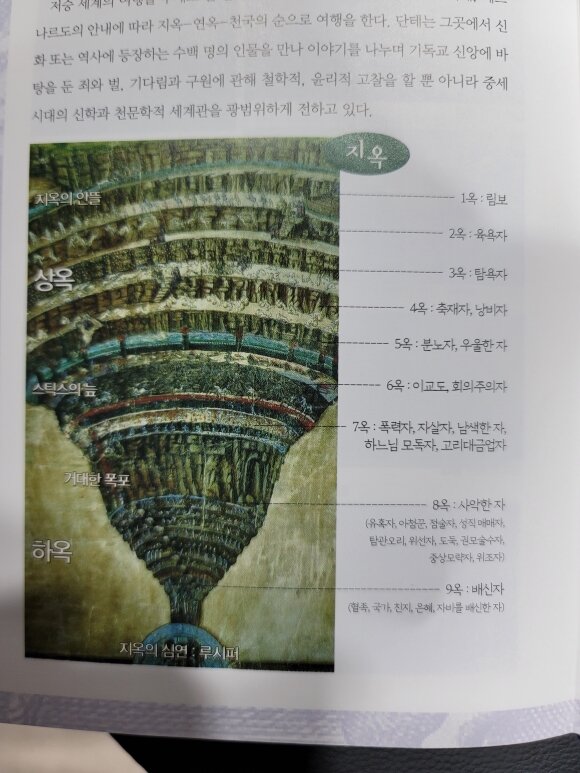
- 작성일
- 2022.1.25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202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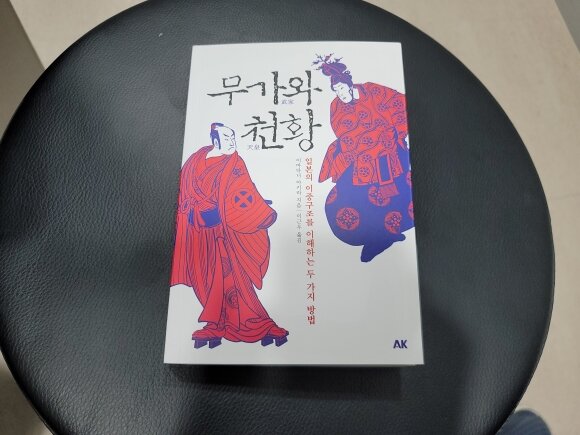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0
- 좋아요
- 58
- 댓글
- 113
- 작성일
- 2025.12.10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1
- 좋아요
- 26
- 댓글
- 145
- 작성일
- 2025.12.11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1
- 좋아요
- 30
- 댓글
- 174
- 작성일
- 2025.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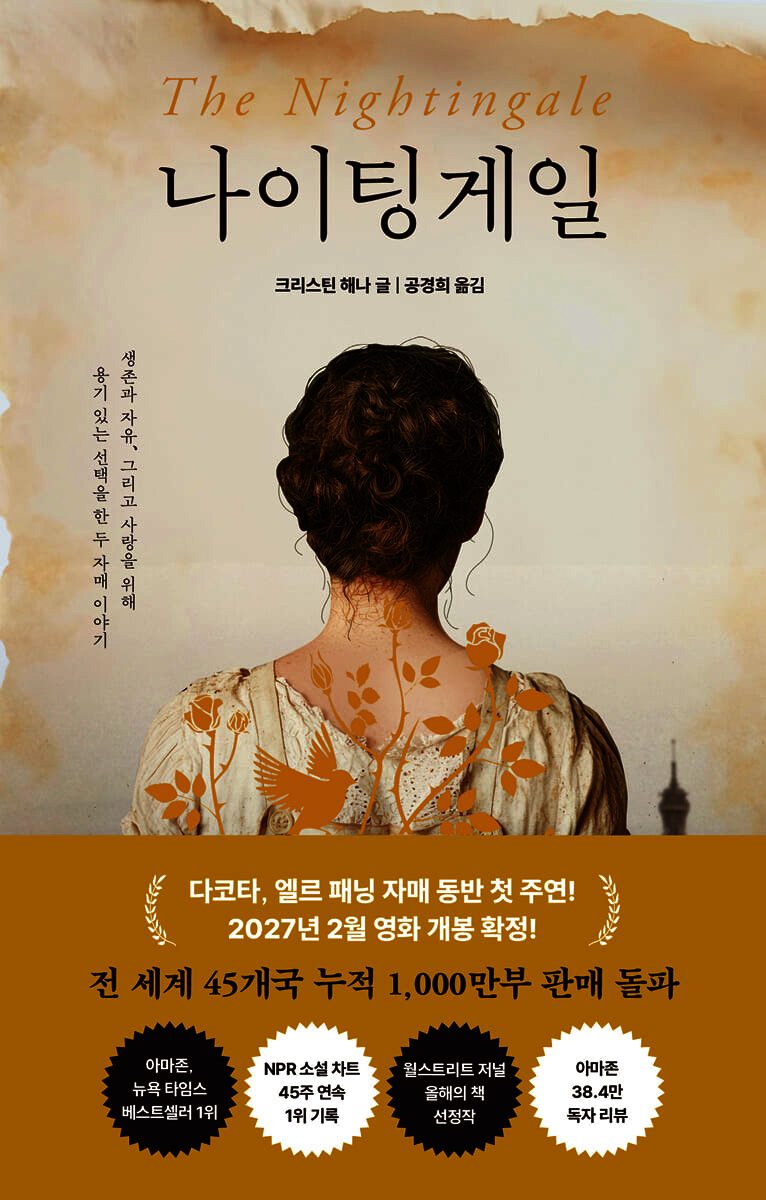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