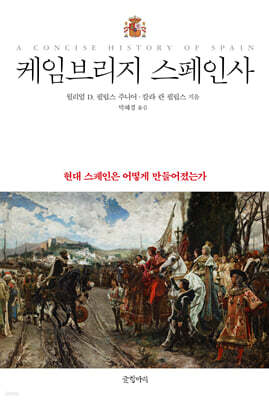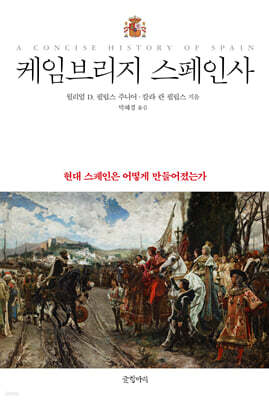waterelf
waterelfwaterelf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6.1.4
- 좋아요
- 9
- 댓글
- 4
- 작성일
- 2026.1.4
- 작성일
- 2025.12.24
- 좋아요
- 8
- 댓글
- 4
- 작성일
- 2025.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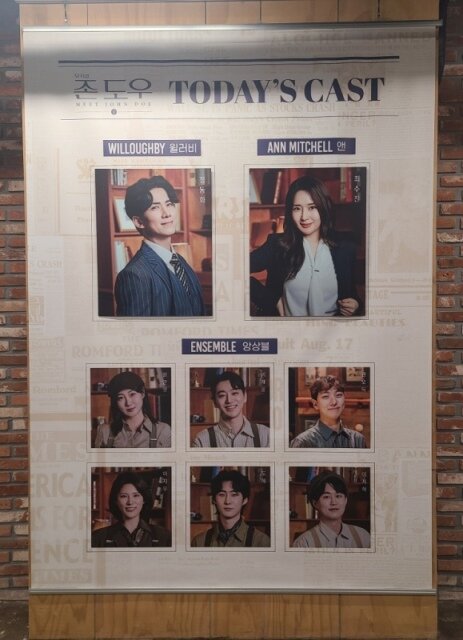
- 작성일
- 2025.12.6
- 좋아요
- 9
- 댓글
- 2
- 작성일
- 2025.12.6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14
- 좋아요
- 37
- 댓글
- 228
- 작성일
- 2026.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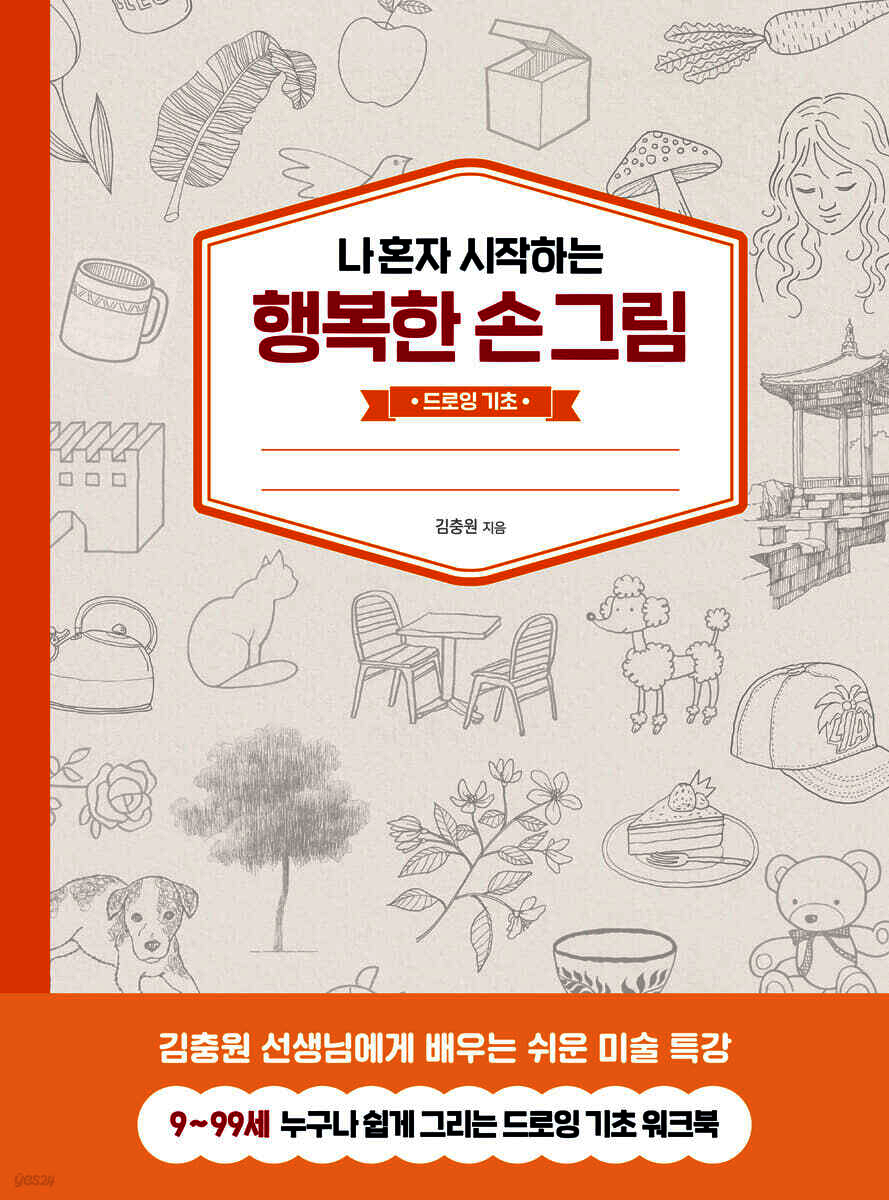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12
- 좋아요
- 28
- 댓글
- 169
- 작성일
- 2026.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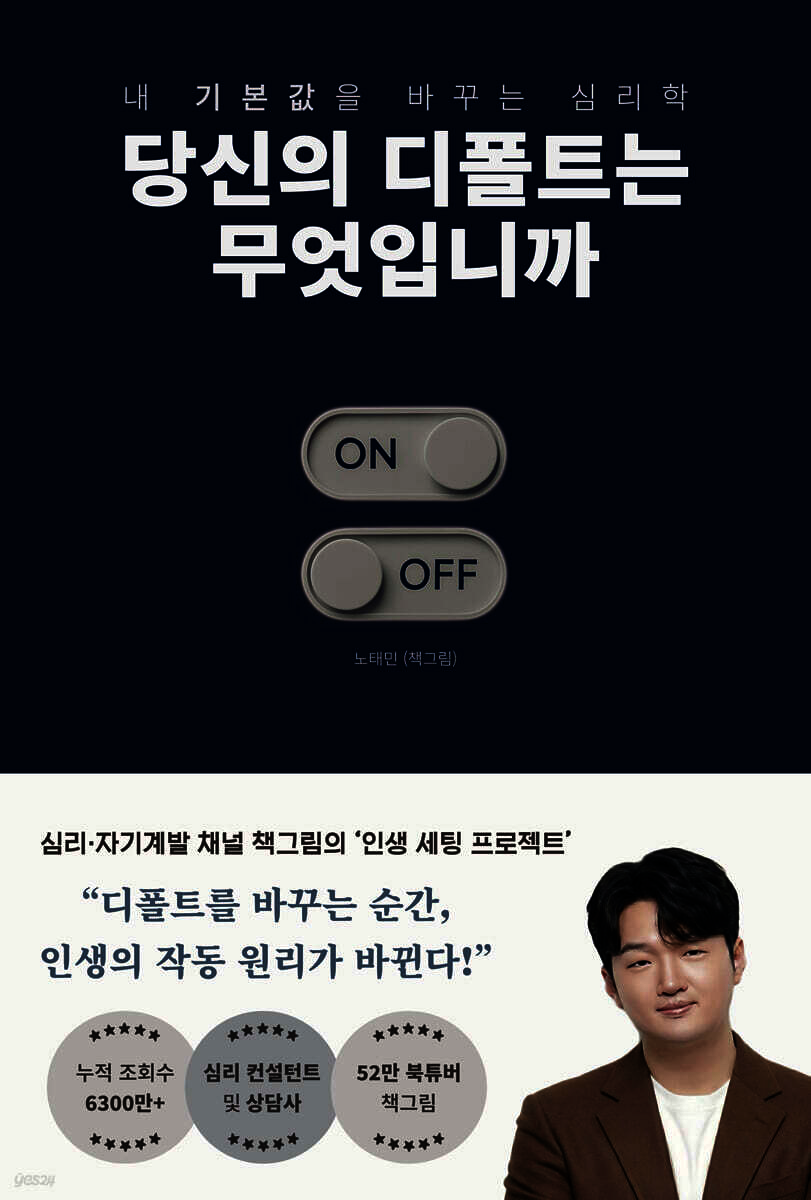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15
- 좋아요
- 27
- 댓글
- 177
- 작성일
- 2026.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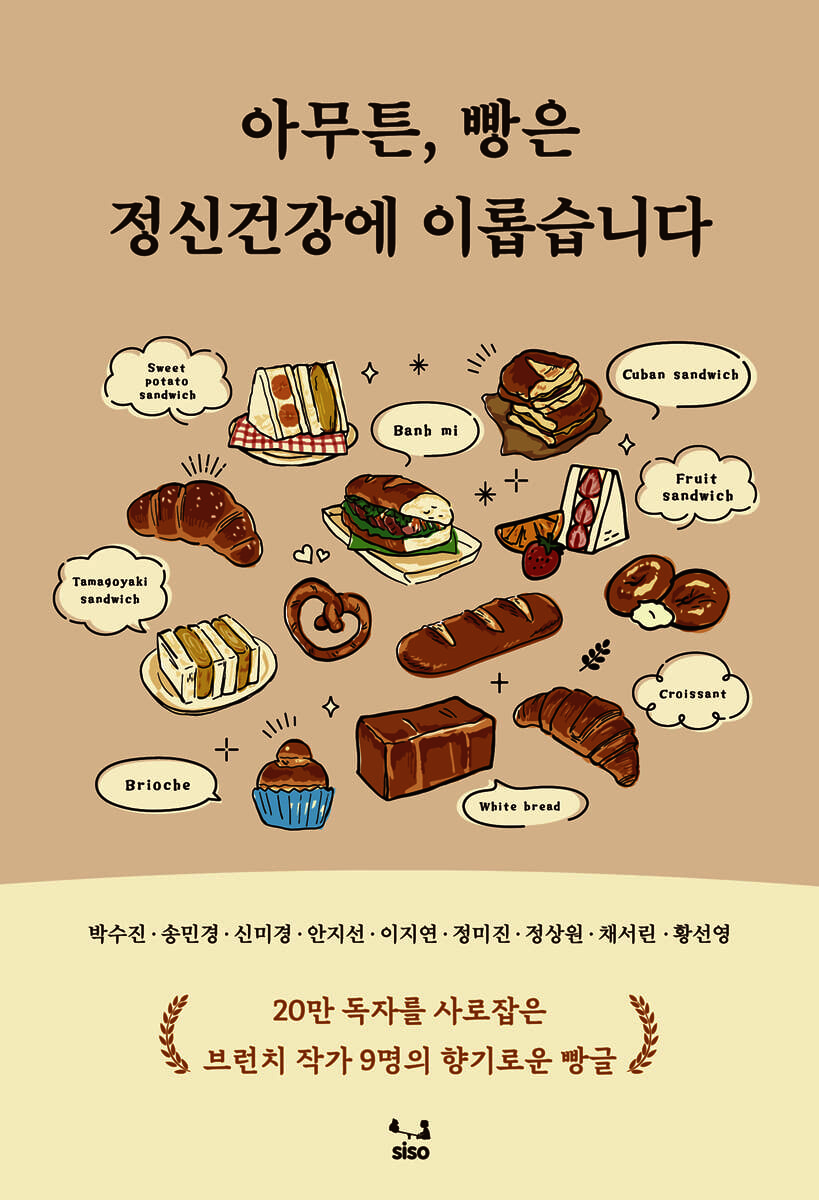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