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율
사율사율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6.1.7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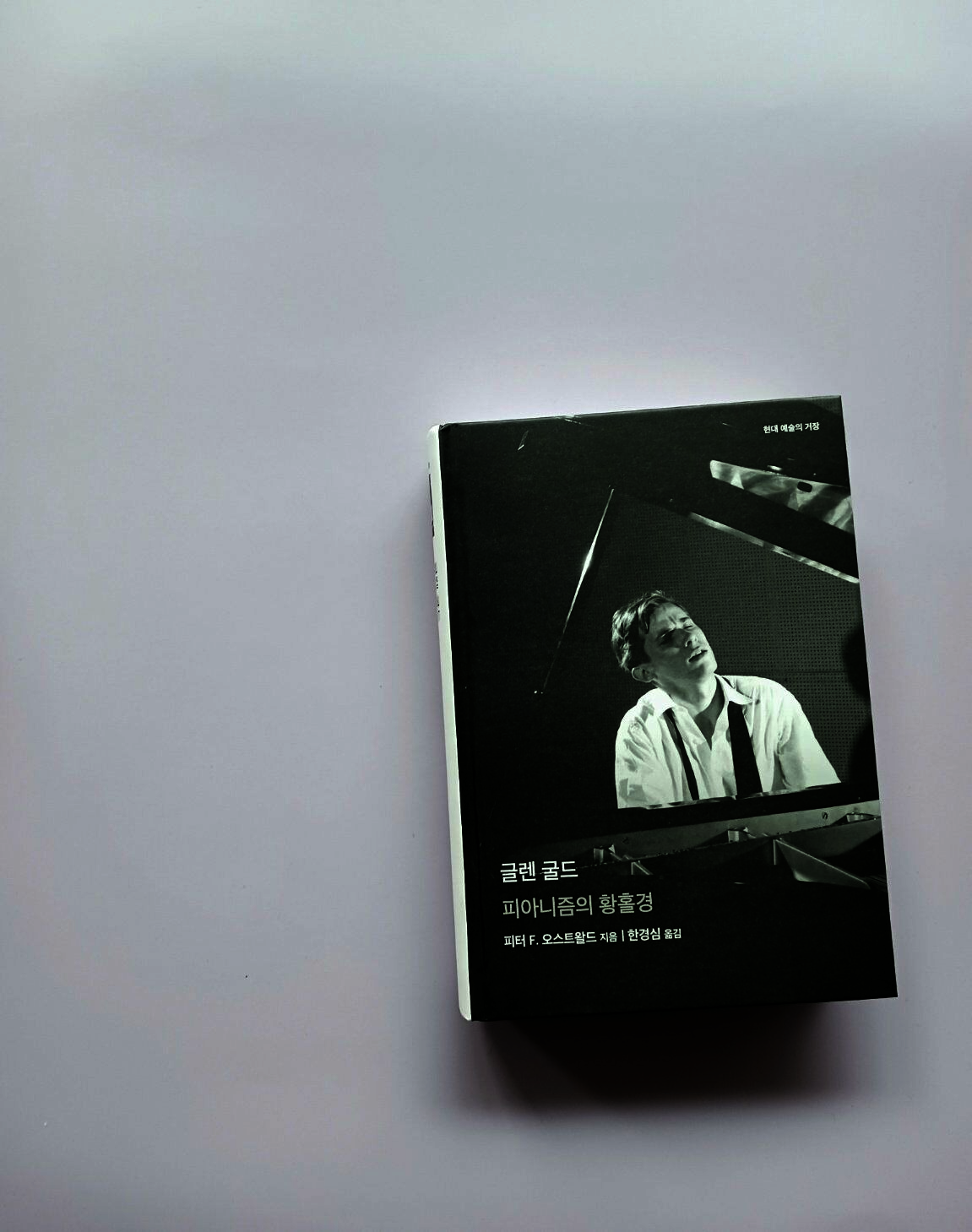
- 작성일
- 2025.3.22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3.22

- 작성일
- 2025.3.14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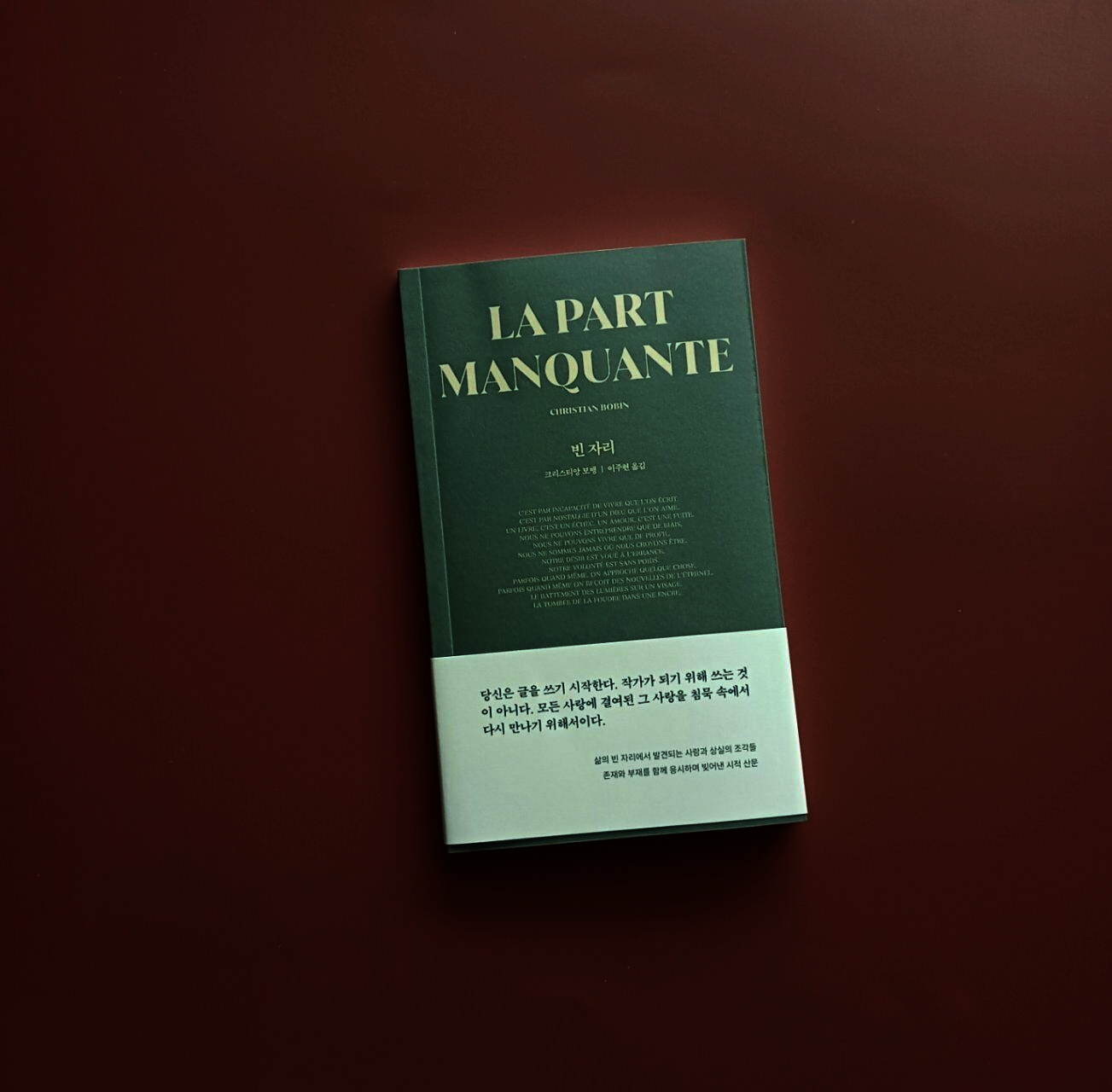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3
- 좋아요
- 38
- 댓글
- 238
- 작성일
- 202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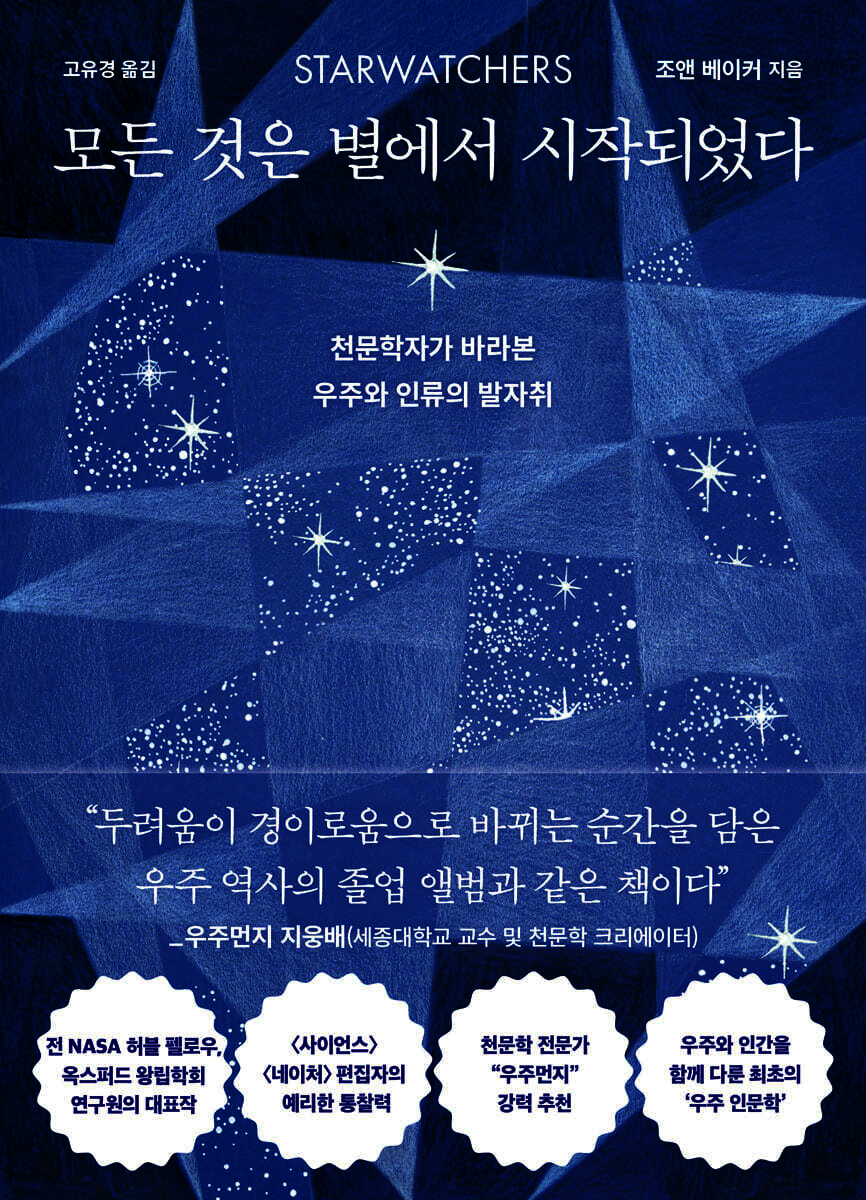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2
- 좋아요
- 31
- 댓글
- 187
- 작성일
- 202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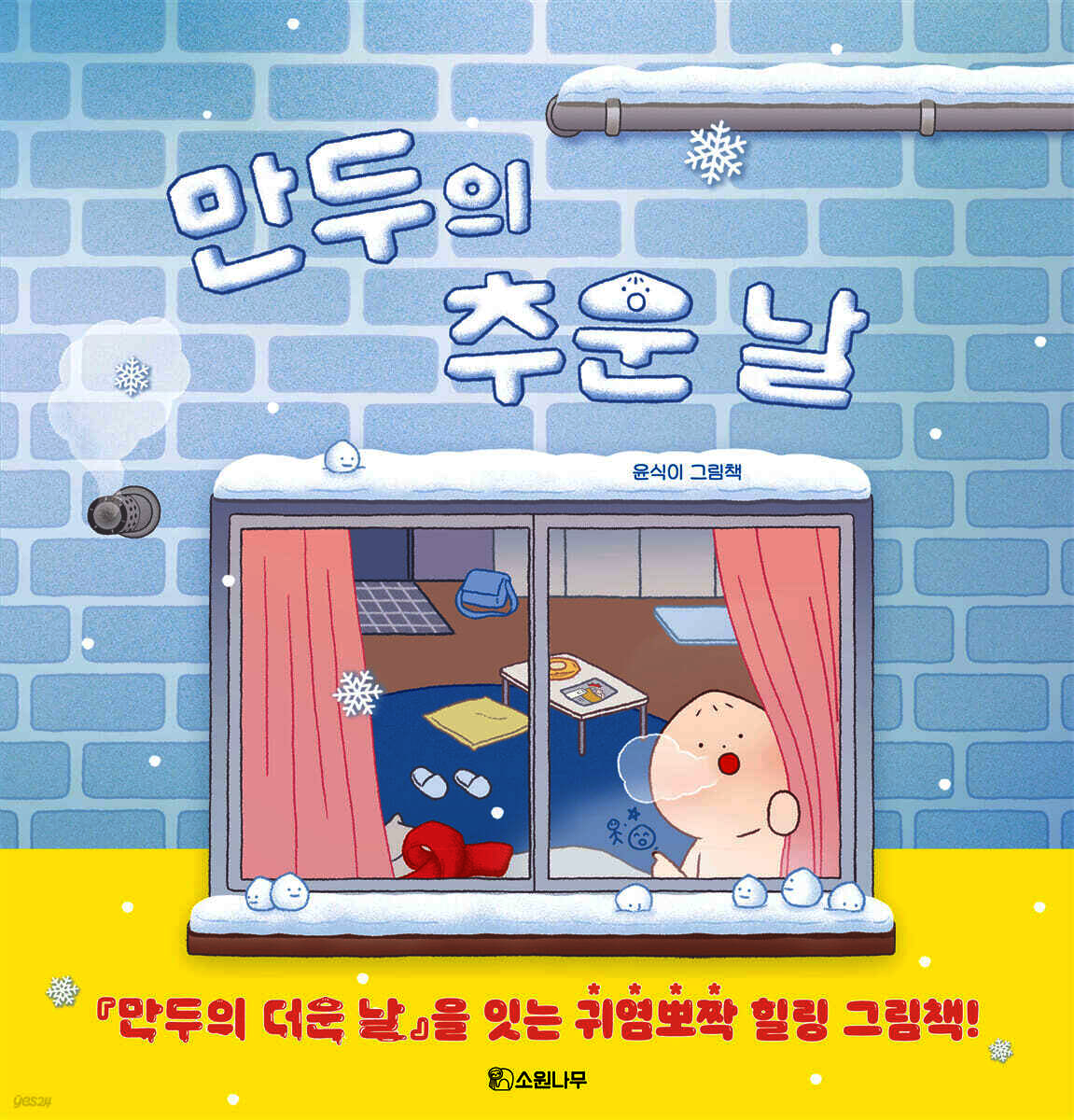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2
- 좋아요
- 30
- 댓글
- 214
- 작성일
- 202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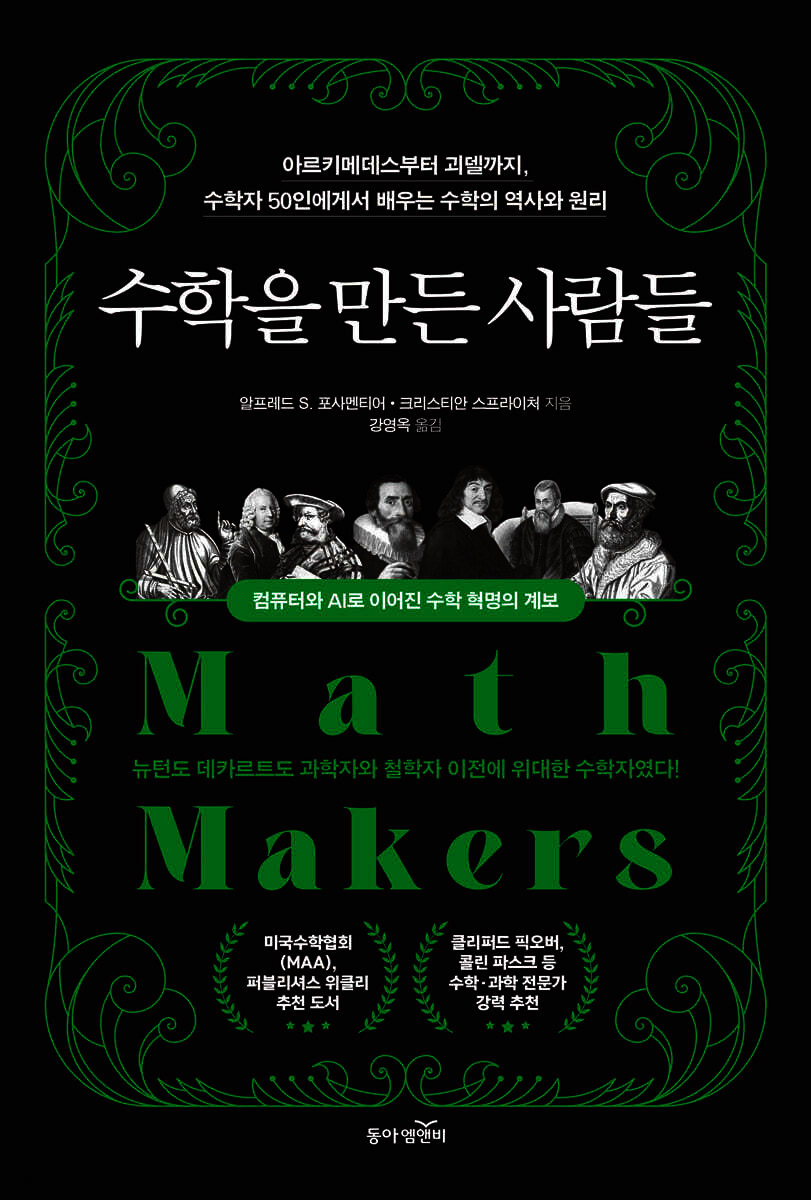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