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연공식계정
목연공식계정
- 좋아요
- 6
- 댓글
- 2
- 작성일
- 2023.04.26
목연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5.5.29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2025.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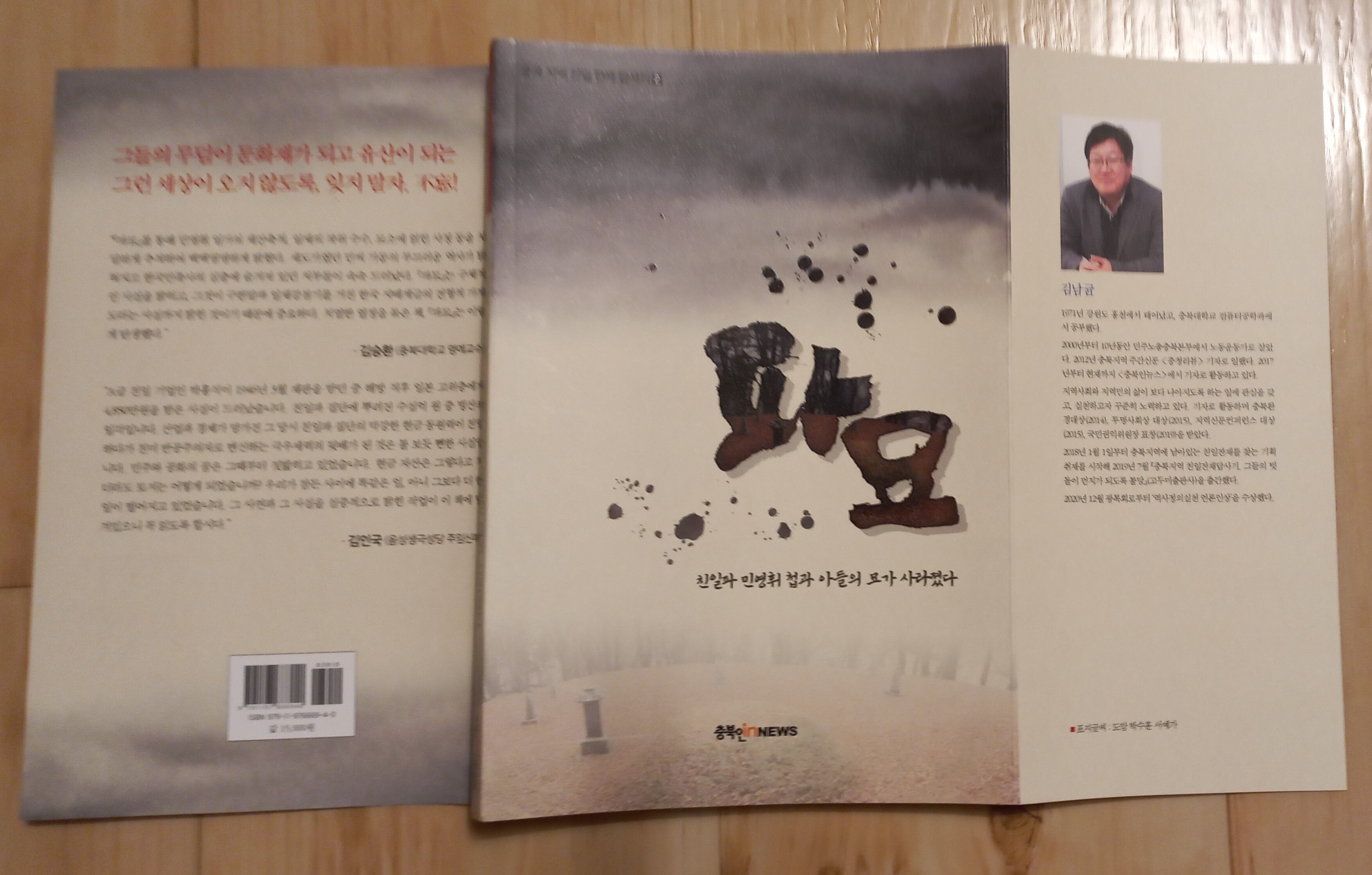
- 작성일
- 2025.1.4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202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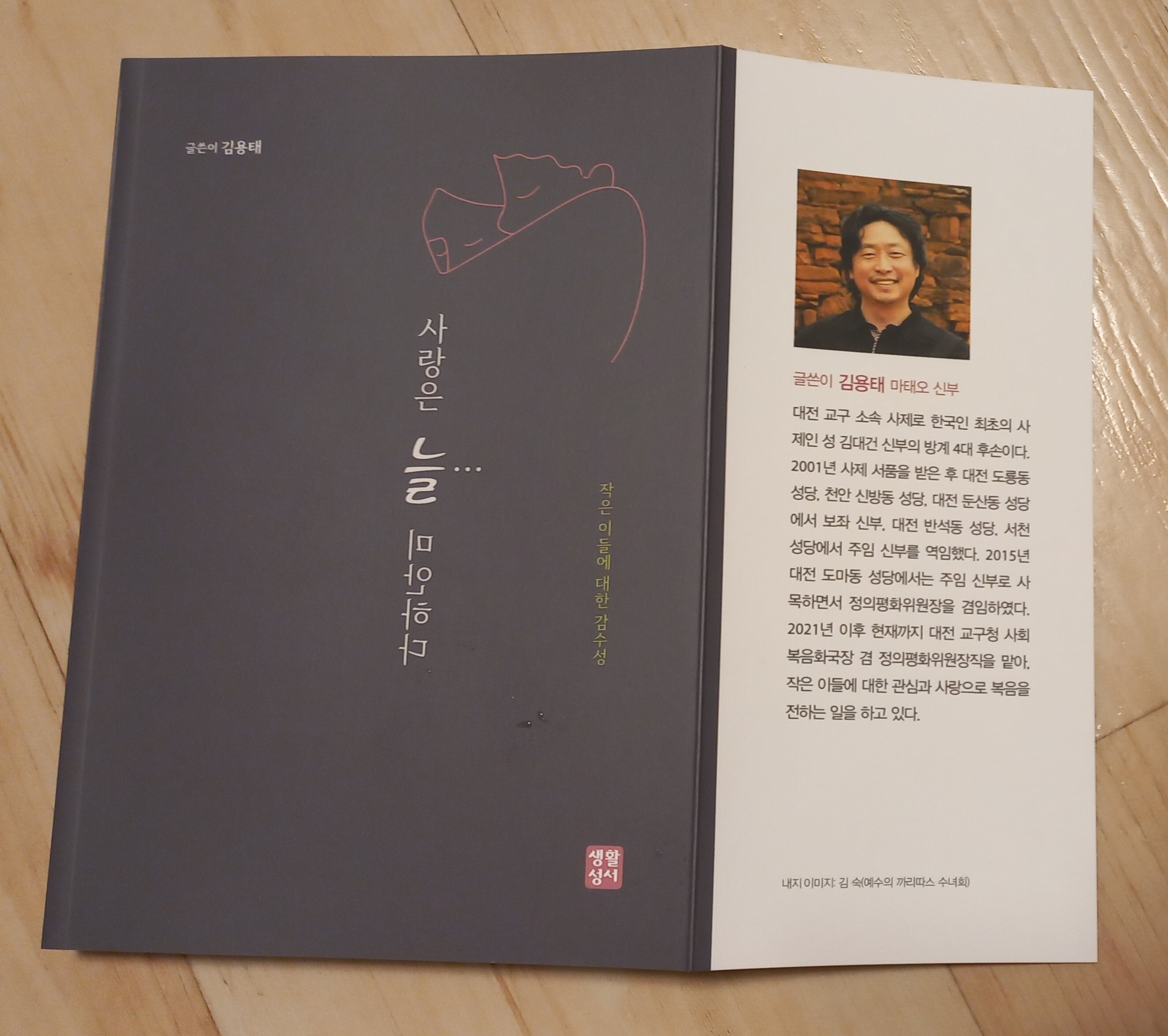
- 작성일
- 2024.9.21
- 좋아요
- 5
- 댓글
- 0
- 작성일
- 2024.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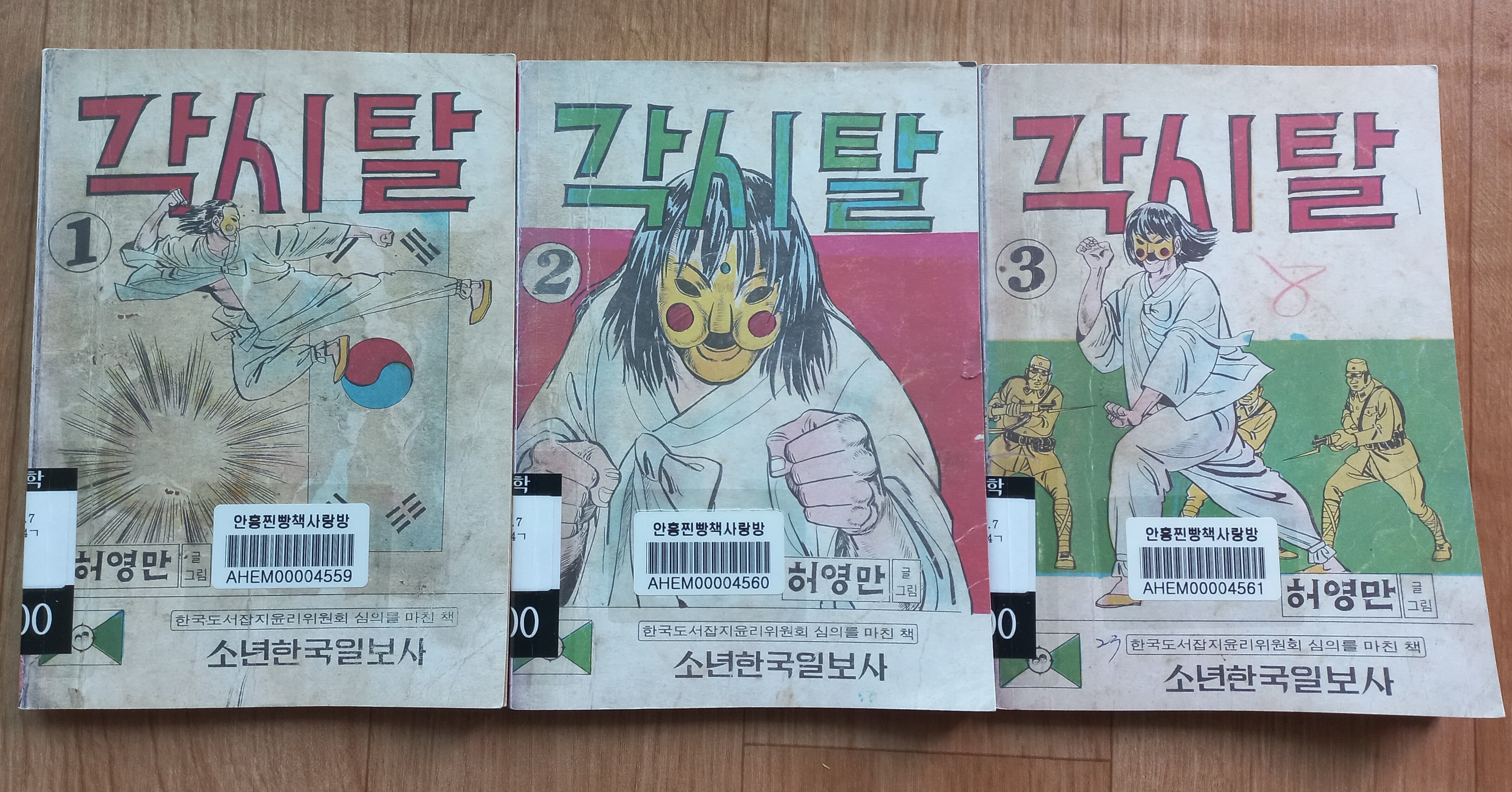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7.30
- 좋아요
- 36
- 댓글
- 162
- 작성일
- 2025.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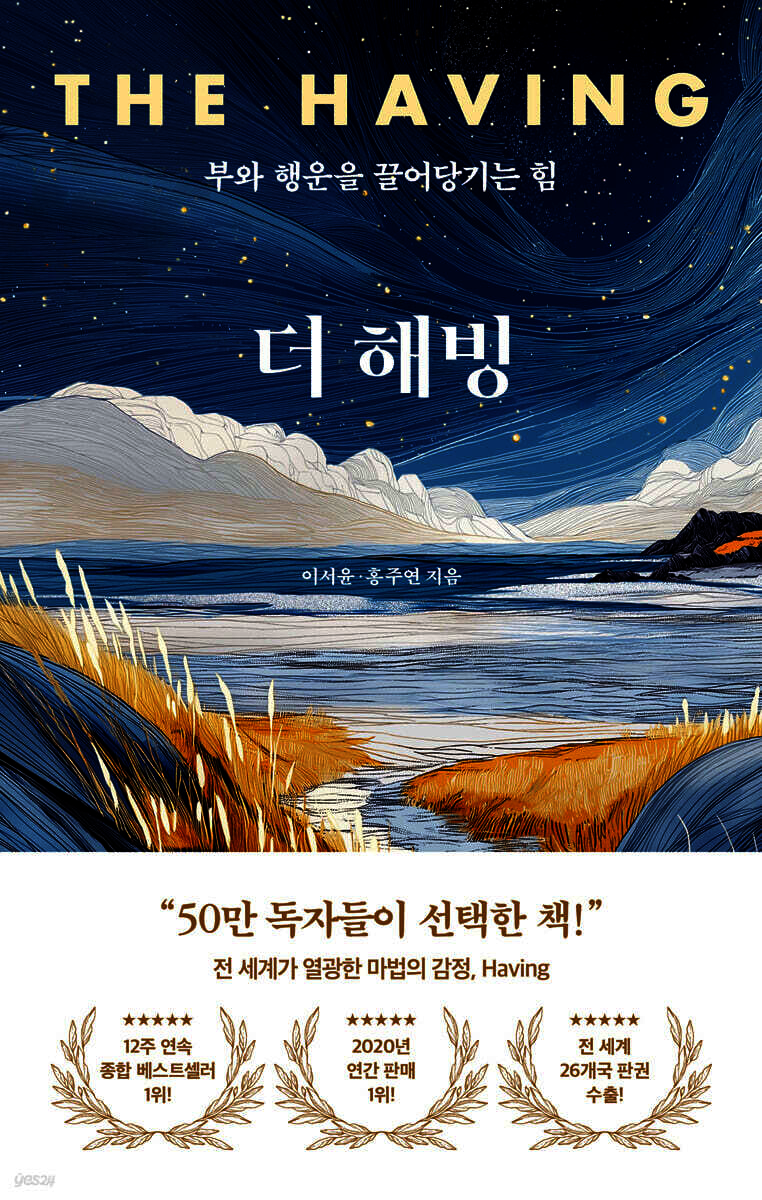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7.29
- 좋아요
- 25
- 댓글
- 128
- 작성일
- 2025.7.29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7.30
- 좋아요
- 12
- 댓글
- 74
- 작성일
- 2025.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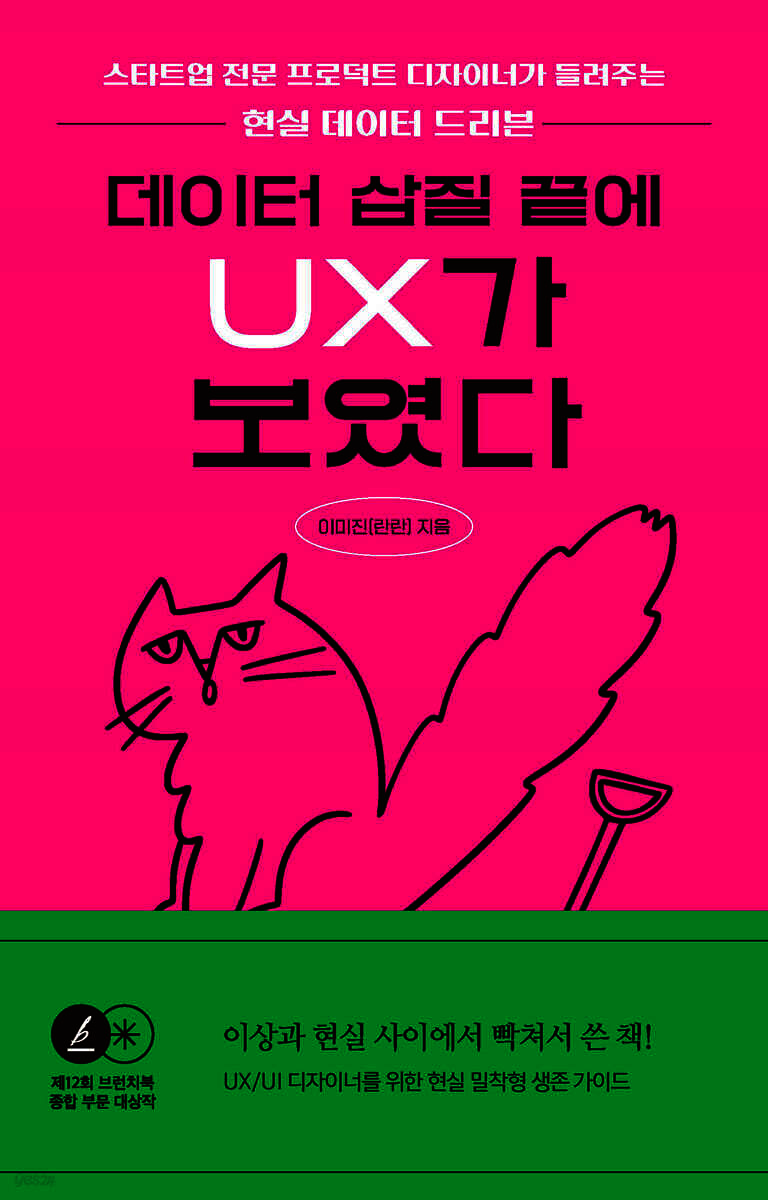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