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다른나
또다른나댓글 2

추억책방
- 작성일
- 2020. 9. 19.

또다른나
- 작성일
- 2020. 9. 19.
또다른나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6.1.31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6.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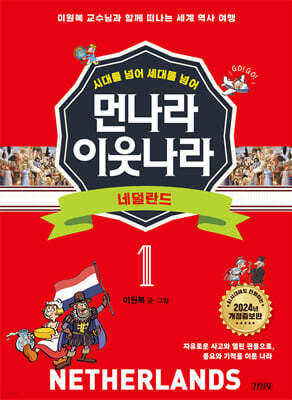
- 작성일
- 2026.1.30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6.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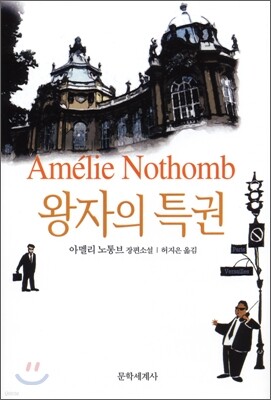
- 작성일
- 2026.1.28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6.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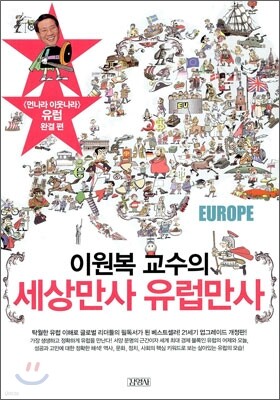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27
- 좋아요
- 44
- 댓글
- 249
- 작성일
- 2026.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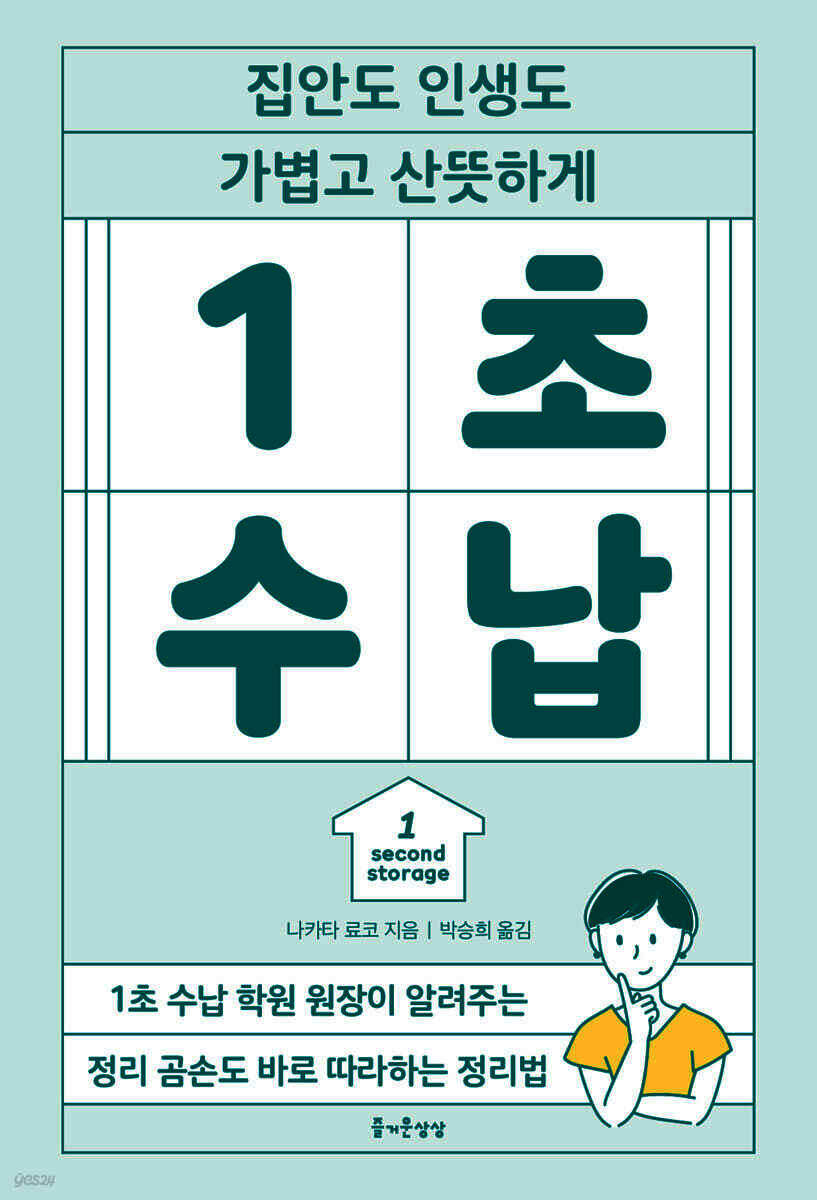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28
- 좋아요
- 50
- 댓글
- 87
- 작성일
- 2026.1.28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29
- 좋아요
- 25
- 댓글
- 134
- 작성일
- 2026.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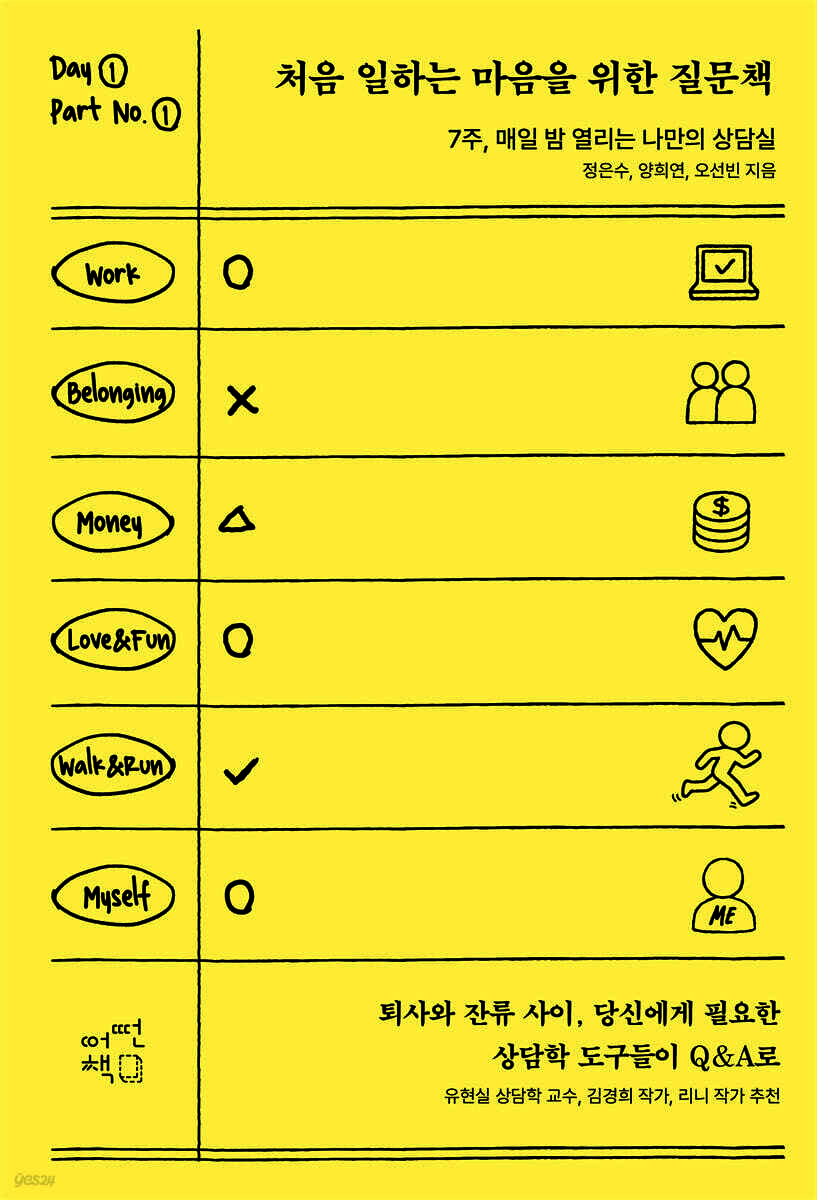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