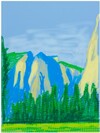- 문학

CircleC
- 작성일
- 2018.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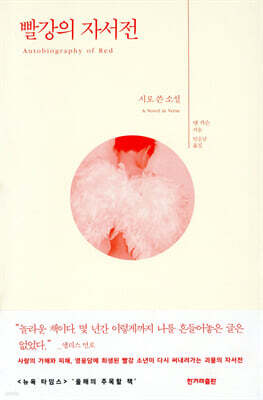
빨강의 자서전
- 글쓴이
- 앤 카슨 저
한겨레출판
앤 카슨은 두 눈먼 시인 호메로스와 스테시코로스 차이를 서두에서 꺼낸다. ‘호메로스는 세상 만물에 그것의 가장 적절한 속성을 나타내는 고정적인 형용사를 붙여 서사적 소비를 한다. 호메로스적 방식에는 열정이 있는데, 그것은 보드리야르가 말한 “소비는 실체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기호에 대한 열정’이었다.’ 그에 반해 스테시코로스는 전통적인 형용사구의 걸쇠를 벗겨내는 이였다. 호메로스가 영웅 서사를 공고히 한 반면 스테시코로스는 영웅에 가려진 인물에 더 집중한다. 호메로스가 ‘헤라클레스’의 12과업에 집중했다면 스테시코로스는 헤라클레스가 열 번째 과업에서 만난 에리테리아(빨강 섬)에 사는 괴물 ‘게리온’에 집중해 시를 쓴다. 스테시코로스는 그 아름다움에 찬양의 대상이던 헬레네가 간통한 자라는 시를 쓴 뒤 눈이 멀자 바로 ‘철회의 시’를 씀으로써 다시 시력을 찾는다. 카슨은 스테시코로스가 원인을 더 정확히 찾아보려 한 이였다고 말한다.
많은 작품이 유실된 스테시코로스의 뜻을 이어받아 카슨은 이 책에서 현대판 게리온의 서사를 펼치고 있다. 그녀는 “우리 모두 거의 항상 자신이 괴물이라고 느끼니까요”라고 말하며 게리온의 괴물성에 매료된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그 괴물성은 ‘특별함’이기도 했다. “그 빨강 날개가 그의 괴물성을 나타내는 육체적 표식이라면, 극단적인 비사회성과 동성애적 성향은 괴물성의 정신적 발현이다.”(해설, p253)
가정과 세계 어디에서도 친화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소년 게리온은 헤라클레스를 만나 동성애이면서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을 깨부수는 여정을 겪게 된다. 단순히 이 작품이 그리스 고전을 재해석하기 때문이 아니라 로맨스(중세 유럽의 기사 모험담을 다룬 문학 장르)이자 자기 극복의 영웅 이야기로 해석되는 이유이다.
이 소설은 왜 ‘빨갛다'는 형용사를 적극 수용했는가. 카슨은 말한다.
“형용사란 무엇인가? 명사는 세상을 이름 짓는다. 동사는 이름을 움직이게 한다. 형용사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 온다. 형용사(adjective, 그리스어로는 epitheton)는 그 자체가 ‘위에 놓인’, ‘덧붙여진’, ‘부가된’, ‘수입된’, ‘이질적인’이라는 형용적 의미이다. 형용사는 그저 부가물에 지나지 않는 듯하지만 다시 잘 보라. 이 수입된 작은 메커니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특정성 속에서 제자리에 머무르게 한다. 형용사의 존재는 걸쇠다.”
(<빨강 고기 : 스테시코로스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中)
게리온의 고통은 바로 그러한 ‘형용사’의 걸쇠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명사이고 사랑하다는 동사인데, 게리온이 헤라클레스를 사랑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허용된 방식이 아니다. 그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는 ‘은밀하다’, ‘자유롭다’, ‘어둡다’, ‘빽빽하다’, ‘(냄새를) 맡다’, ‘끔찍하다’ , ‘뜨겁다’ 같은 ‘형용사’들이 설명해준다.
동사는 외부적이고 형용사는 내부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내부적인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두 기록하기로 결심해 자서전을 쓰려 한다. 그러나 글로써가 아니다. 사진은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형용사적이다. 이 세계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한 채 사는 그의 삶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가 마주하게 되는 이칸티카(*) 화산도 하나의 상태이자 상태를 시험하는 곳-명사이다.
(*)이칸티카Icchantika는 산스크리트어로 ‘욕망을 가진 사람’, 영구히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중생’을 뜻한다. 이칸티카스는 실제로 페루에 있는 화산 이름이 아니라 가상의 지명이다.
“다시 동물의 으르렁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뒤이어 멜론이 땅에 떨어지는 듯한 쿵쿵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앙카시를 보았다.
높은 곳의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새들 날개가 타서 떨어지는 거야. 앙카시가 말을 멈췄다.
그와 게리온은
서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날개’라는 말에 두 사람 사이에 진동 같은 게 지나갔다.”
(<빨강의 자서전> ⅩⅩⅩⅢ. 빨리감기 中)
날개가 있어서 무사할 수도 있지만 날개마저 떨어질 수 있는 화산에 뛰어들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
“앙카시가 말하고 있었다.
우아라스 북쪽 산지에 주쿠라는 마을이 있는데 주쿠에는
이상한 믿음이 있지.
거긴 화산 지역이야. 지금은 활화산이 아니지만. 옛날에 주쿠 주민들은
화산을 신으로 숭배했고
사람들을 거기 던지기도 했어. 제물로? 담요에서
머리를 내민 게리온이 물었다.
그건 아냐. 그보단 하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었지. 그들은 화산 내부에서 온 사람을
찾고 있었어. 현자들을.
성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 케추아어로는 ‘야스콜 야스카마크Yazcol Yazcamac'인데
‘가서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야ㅡ
인류학자는 ‘목격자들’이라고 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목격자들. 게리온이 말했다.
그래. 화산 내부를 본 사람들.
그리고 돌아온.
그래. 어떻게 돌아왔는데?
날개.
날개? 응 야스카마크는 날개 달린 빨간 사람이 되어 돌아 온대.
모든 약점이 다 타서 없어진 상태로ㅡ
인간의 유한성까지도 말이야.”
(<빨강의 자서전> ⅩⅩⅩⅦ. 목격자들 中)
헤라클레스 신화에서는 게리온도 소년의 작은 개도 그에게 죽임을 당한다.
방식은 다르다 해도 게리온 선택에 헤라클레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 때문에 이 소설이 아름답고 슬프게 자꾸 느껴진다. 영화 <아이다호>나 <춘광사설(해피투게더)>을 보면서 그랬듯.
“긁힌 3월 하늘에서 내려
눈먼 대서양의 아침으로 빠져드네 작은
빨강 개 한 마리 저 아래 해변을 달리네
자유를 얻은 그림자처럼”
(<빨강 고기 : 스테시코로스의 단편들> Ⅻ. 날개 中)

- 좋아요
- 6
- 댓글
- 6
- 작성일
- 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