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rmes91
hermes91hermes91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2.10.17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2.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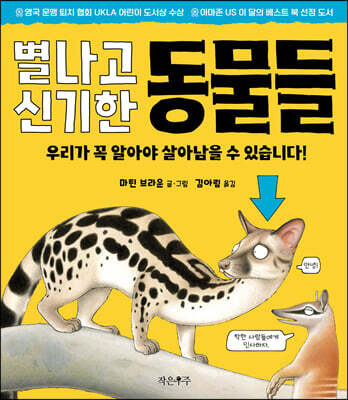
- 작성일
- 2021.12.5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1.12.5

- 작성일
- 2021.7.10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2021.7.10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1.19
- 좋아요
- 26
- 댓글
- 148
- 작성일
- 2025.11.19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1.19
- 좋아요
- 20
- 댓글
- 84
- 작성일
- 2025.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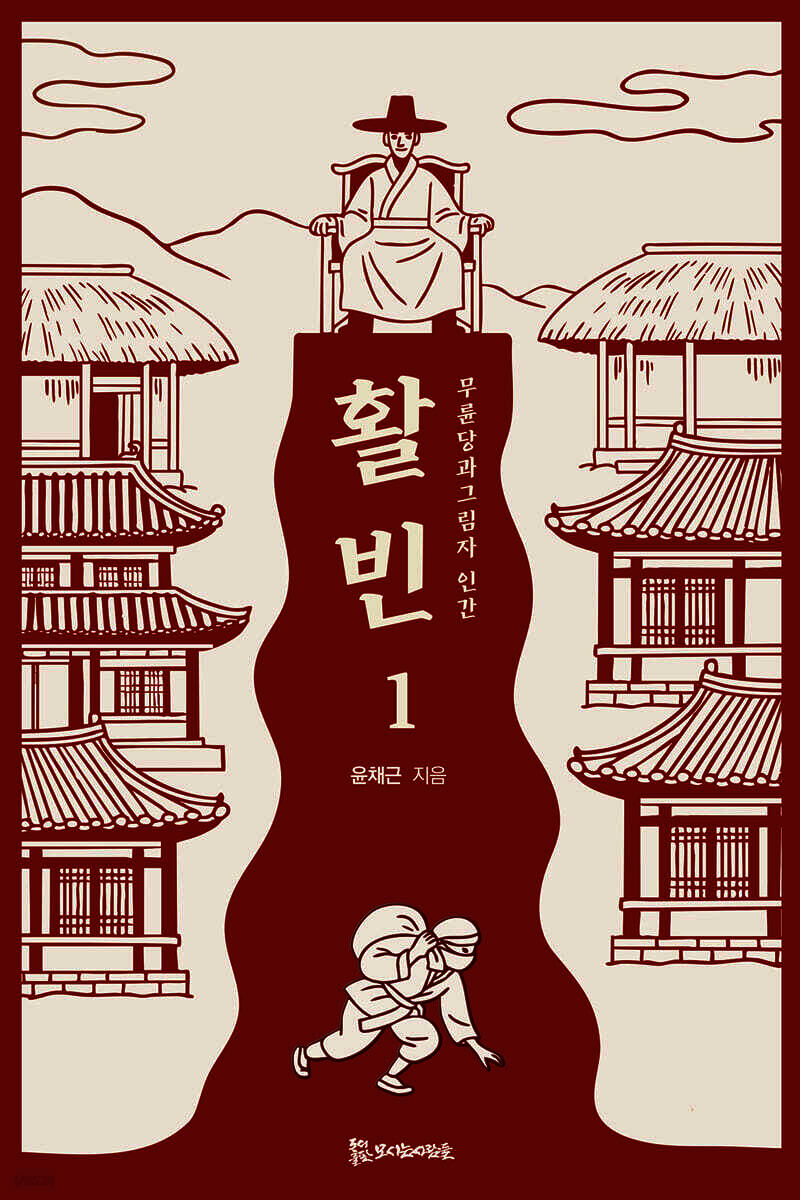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1.17
- 좋아요
- 35
- 댓글
- 193
- 작성일
- 2025.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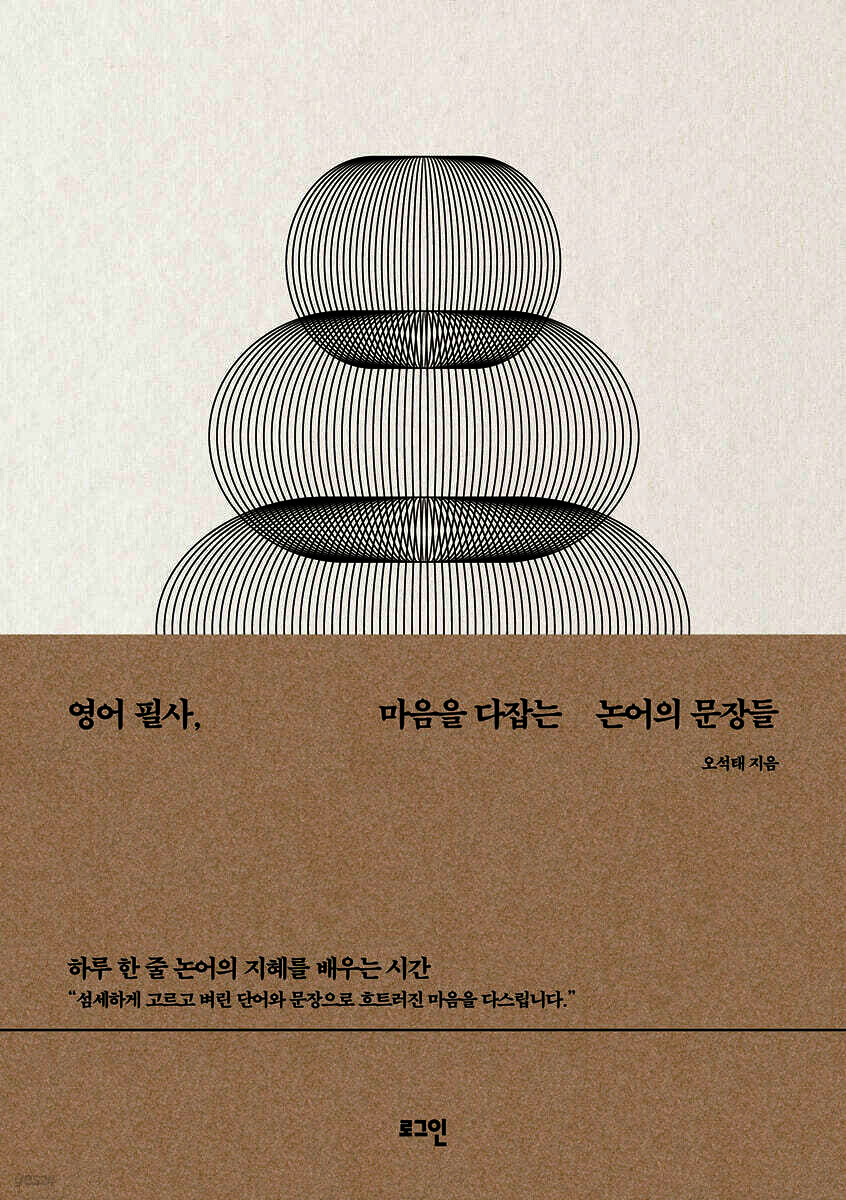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