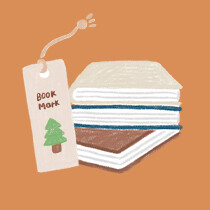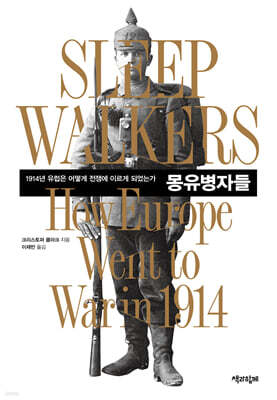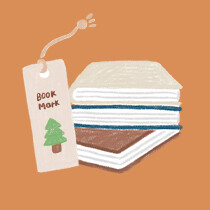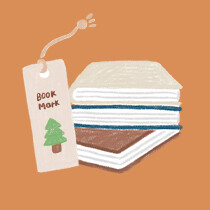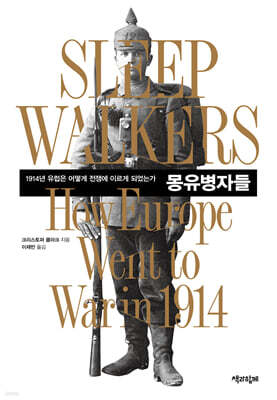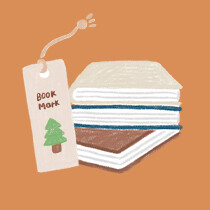 ena
ena댓글 2

가을남자
- 작성일
- 2019.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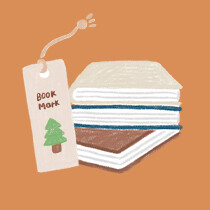
ena
- 작성일
- 2019. 5. 20.
ena님의 최신글
- 작성일
- 5시간 전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5시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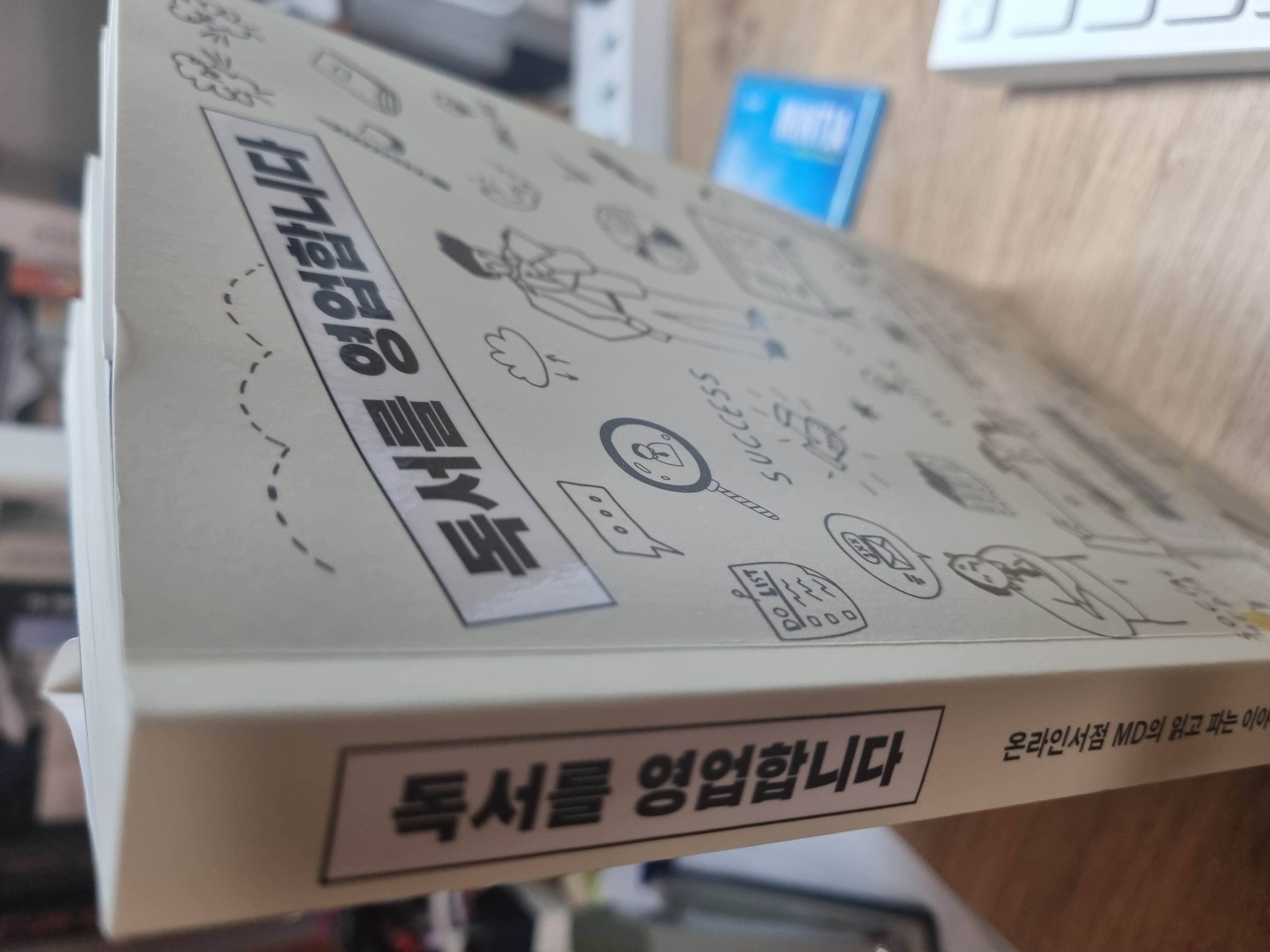
- 작성일
- 2025.12.24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5.12.24

- 작성일
- 2025.12.24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12.24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9
- 좋아요
- 42
- 댓글
- 227
- 작성일
- 2025.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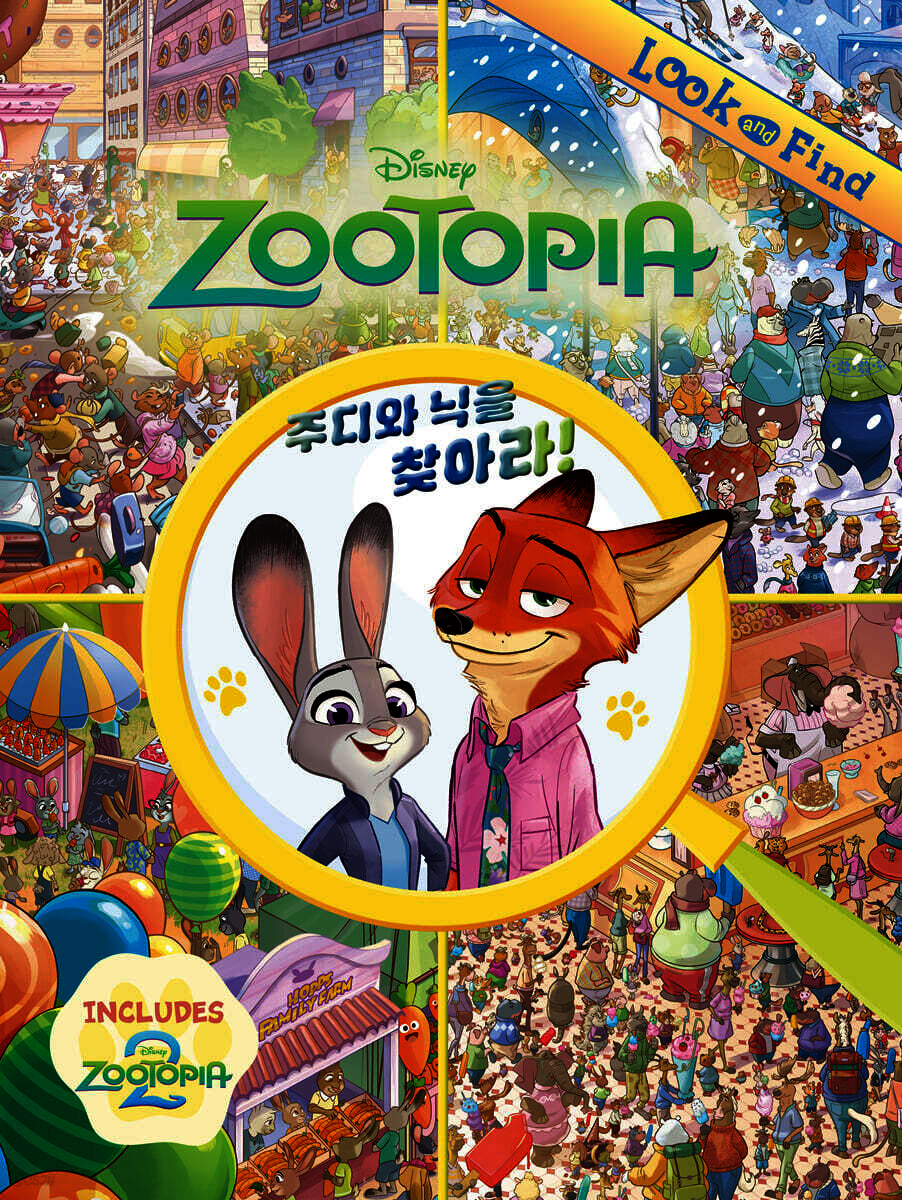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9
- 좋아요
- 18
- 댓글
- 100
- 작성일
- 2025.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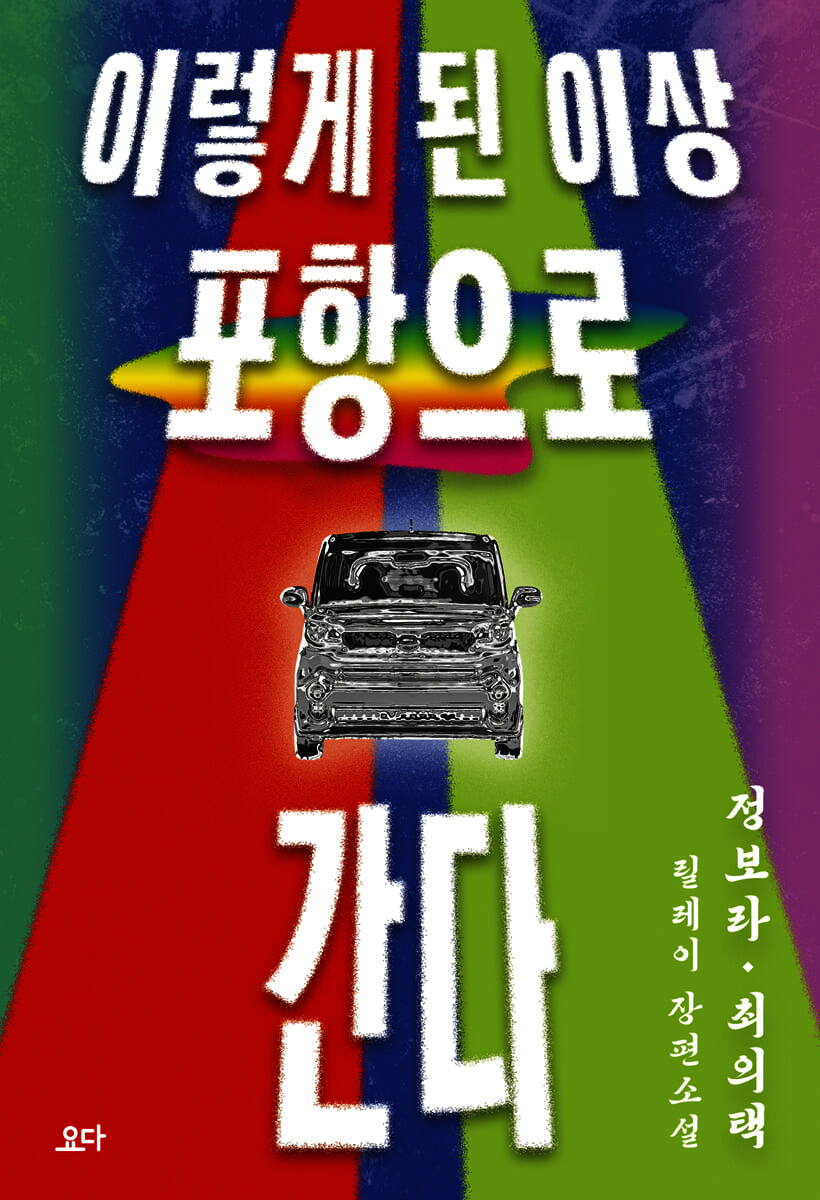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23
- 좋아요
- 12
- 댓글
- 73
- 작성일
- 2025.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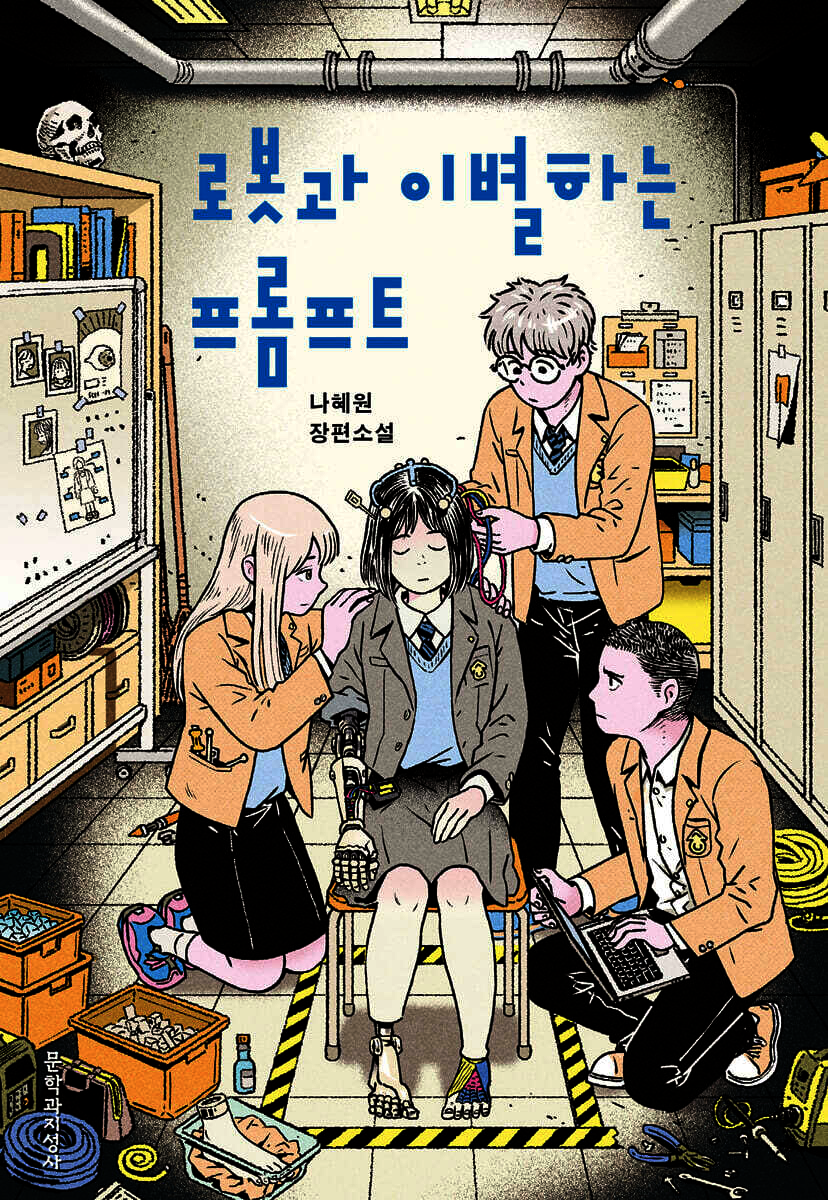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