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꼬마마녀
꼬마마녀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꼬마마녀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6.2.12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6.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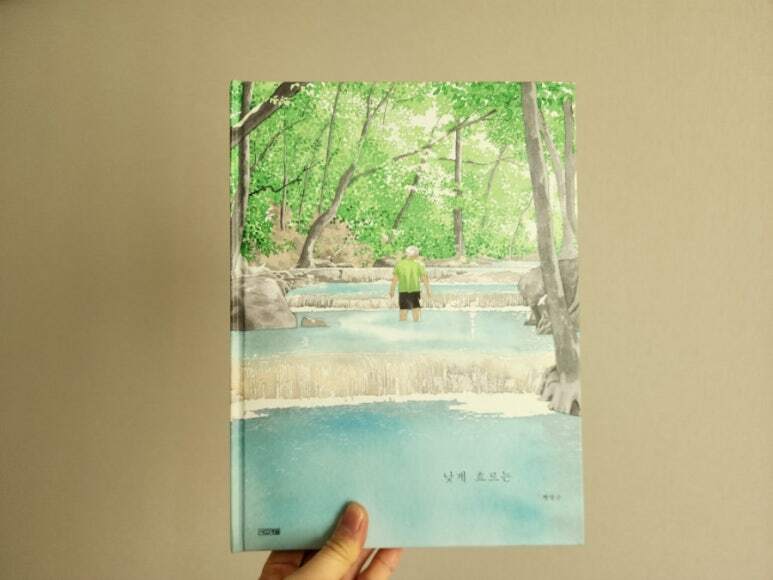
- 작성일
- 2026.1.26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6.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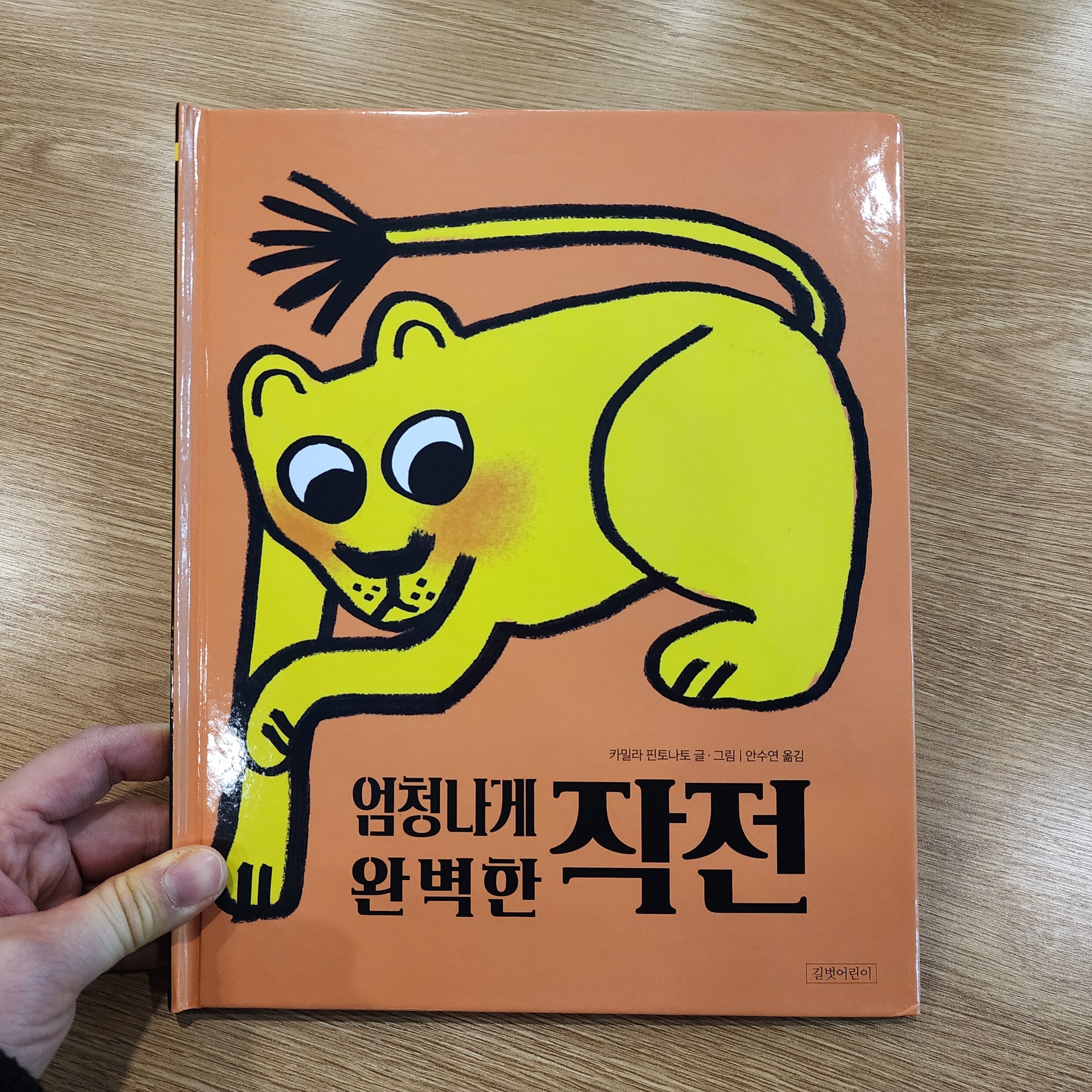
- 작성일
- 2026.1.12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6.1.12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9
- 좋아요
- 25
- 댓글
- 171
- 작성일
- 202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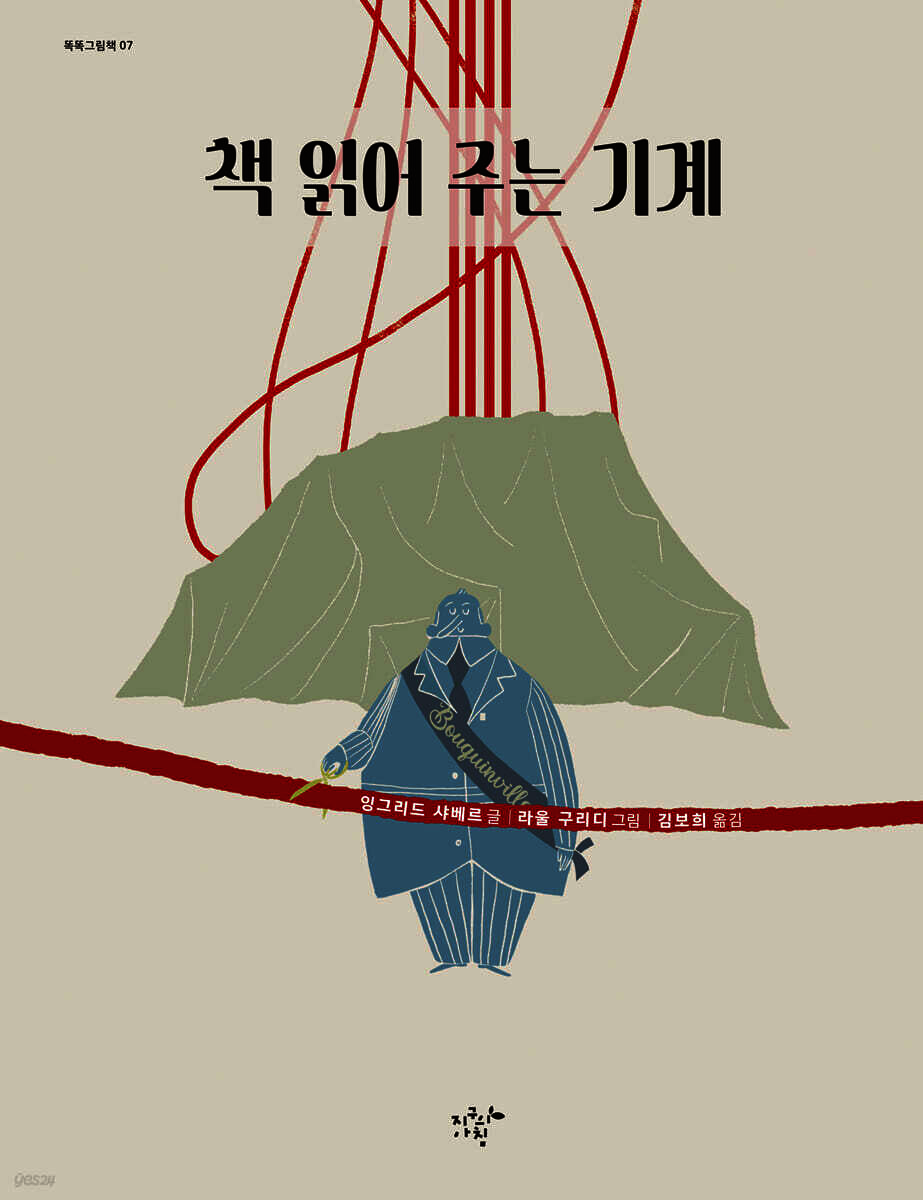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1
- 좋아요
- 27
- 댓글
- 131
- 작성일
- 2026.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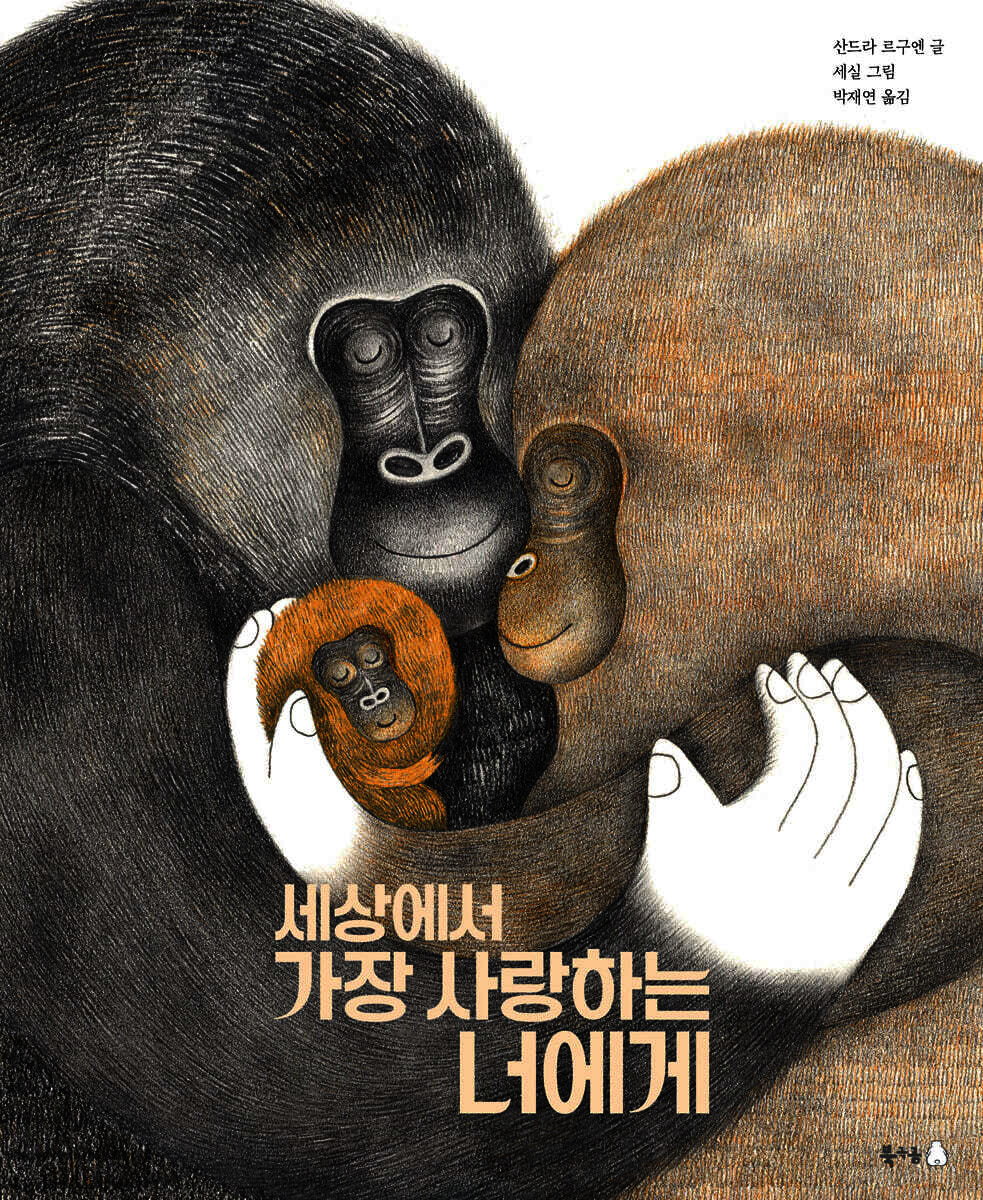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1
- 좋아요
- 22
- 댓글
- 129
- 작성일
- 2026.2.11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