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카테고리

dldudcks62
- 작성일
- 2020.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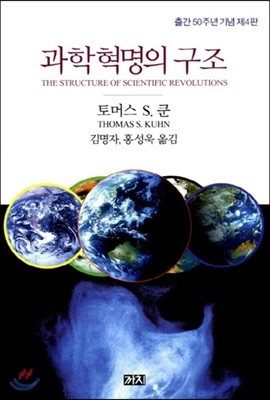
과학혁명의 구조
- 글쓴이
- 토마스 쿤 저
까치(까치글방)
우리 인간이 영겁의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사유하고 있노라면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지금 필자뿐만 아니라 독자 모두가 밟고 있는 땅 역시 수많은 선인(先人)이 수없이 밟고 지나가며, 온갖 사랑과 고난을 겪어왔던 공간임을 잘 알고 있는가? 인간세(世)에 무궁무진한 흥미를 안고 있는 필자는 지나간 역사의 모든 순간을 가치 있다고 여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치 있음’이란 선/악의 구분을 위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오늘날의 사람들이 사유(事由)할 만 하게 여길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소위 ‘문과(물론 오늘날 교육과정 용어로는 저 건너편 세상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지만)’라 불리기는 하지만, ‘과학’, ‘자연’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그리 크지는 않다. 과학이라는 학문 역시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를 구성해오면서 그들과 뗄 수 없을 정도의 긴밀함을 유지해 왔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불을 사용하고 난 순간부터 근세 대항해 시대를 거쳐 근대 산업혁명, 그리고 고도 문명 발달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사실상 ‘사회’만큼이나 어느 한 사람의 삶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그러하듯, 너무나 똑똑해져버린 과학기술로 인해 그것들의 일부라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싸그리 뭉개져버리는 경험을 많이들 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에 많은 관심이 있는 필자의 경우, 과학기술의 과학적 구조 자체는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겪어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존재했었던 것 같다. 과연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학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왔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소할 수 있었던 책이 바로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었고, 지금부터 필자가 이를 읽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과학혁명의 구조>는 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하고 문장의 짜임 자체가 이 세상 사람의 글 솜씨라고 믿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과학사 시간에 배운 덕에 대강 짐작할 수는 있었다. 쿤에 따르면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상과학’이 있고, 이것이 더 이상 어떤 현상이나 이론을 설명할 수 없게 되면 ‘과학의 위기’가 발생한다. 이때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구조가 나오고, 패러다임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정상과학이 기존 정상과학을 대체한다. 이런 과정은 반복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서부터 뉴턴 시대까지 숱한 ‘과학적 단절’이 있음을 알게 됐고, 두 시대는 서로 다른 과학적 패러다임 아래 놓여 있었다고 설명한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뒤엎고, 양자물리학과 일반상대성이론이 뉴턴 역학을 대체한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수용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은데, 그는 ‘새로운 진리는 반대자들을 이해시킴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이 죽고 새로운 진리를 신봉하는 세대가 주류가 되기 때문에 승리한다,’ 라고 남기기도 하였다. 쿤은 또한 과학적 객관성은 과학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어느 한 시기에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역사를 조사해보면 여러 이론의 개념과 관찰 등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설명이 반복됨을 발견한다. 이것들은 교과서와 강의, 실험 등에 나타나는 과학자 집단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말이다. 여기까지가 그가 이야기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 이 이론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필자는 할 수가 없거니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목적도 아니다.
이 도서를 읽으면서 그의 삶에 대해 좀 더 면밀한 탐구(인터넷 조사)가 필요함을 느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자 하는 필자는 한 학자가 시대에서 나름의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삶, 생애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느낀다. 특히 그의 시대가 제1, 2차 세계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서 말이다. 당대 과학자는 자신들의 학문 연구를 굉장히 당연하고 자랑스러워하였을 터. 과학지상주의의 이름 아래, 그리고 근대 유럽으로부터 생겨나 19, 20세기에 전 세계로 뻗어나간 민족주의의 이름 아래 오로지 자국을 위한 것이라면 과학이 무엇을 하든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부터 그들은 더욱 더 활보를 폈다. 그 결과 풍요의 삶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지는 빈부의 문제, 그리고 전쟁 무기의 대량 생산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론 물리학과 응용 윤리학을 모두 배운 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과학 연구에 굉장히 많은 회의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과학기술 자체를 연구하기 보다는 과학의 발전 과정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어쩌면 그야말로 과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계속해서 과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힘을 쓰기 보다는 잠시 멈춰 섰던 것이 아닐까.
그의 이러한 학문적 연구 태도를 보면서 필자가 느끼는 것이 있다. 우선 현대 사회의 무분별한 발전지향적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봉, 그리고 성과주의에 급급한 현대의 논리들이 우리들의 인식 체계 및 삶의 모습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쿤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발전, 업적을 쌓아올리는 데 급급한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많은 교훈을 줌에 틀림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어디쯤에 왔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다시 제동을 걸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주리라 예상한다. 토머스 쿤이 과학기술의 연구보다는 과학이 오늘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보려 그 발전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평생에 걸쳐서 한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그의 연구가 후대 과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많은 연구자들에게 귀감을 주고,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필자 역시 역사학, 인류학 연구를 꿈꾸고는 있고, 이것을 실제로 학문 연구의 방법에 따라 연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지만, 이것의 학문 자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에 대한 고찰 역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 또한 들게 만든 책이었지 않나 싶다. 과학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역사의 패러다임 또한 무궁무진한 베일에 쌓여있을 테니까.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