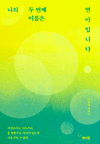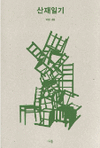- 서평 리뷰

jean217
- 작성일
- 2023.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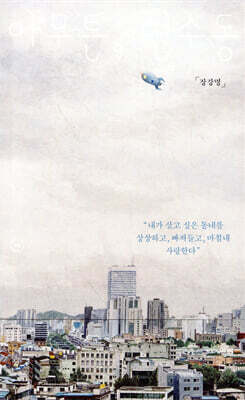
아무튼, 현수동
- 글쓴이
- 장강명 저
위고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다. 그 누구도 자신이 태어났을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나이가 들어 세상물정을 알게 될때 어른들로 부터 "넌 어디어디서 태어났어" 라고 들으면서 "나는 어디 사람이군" 이라고 정의된다. 서울 용산구 어디에서 출생. 이게 나의 호적에 박혀 있다. 그럼 난 서울 사람인가? 부모님도 서울 사람이고 부모님의 부모님도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들었으니 이 정도 되면 서울 토박이 인건가?
서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여러군데 이사를 다녀서 그런지 딱히 어느 한 지점을 두고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20년 넘게 살았던 용산을 비롯해 내가 살았던 동네만도 세어보니 10군데나 된다. 그럼 그 동네에 대해 모든 기억이 온전할까? 그렇지 않다. 그리고 너무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은 기억의 왜곡등으로 지도를 봐도 그 옛집이 있던 동네조차 찾기 애매해졌다.
서울 사람으로서 보는 지금의 서울은 난장판이다. 사람이 많이 몰려서 주거의 공급 문제로 공동주택이 다량으로 들어서려면 기존의 평면을 차지하던 집들을 부수고 그 자리에 입체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지어야 하니 기존의 골목 위주의 집들이 사라졌고 당연히 그 골목을 중심으로 뛰어놀던 나의 추억도 죄다 사라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역시 이 책의 저자 처럼 살던 곳 한 곳을 테마로 삼아 글을 써보라 하면 마포구 공덕동 일대가 아닐까 싶다. 근 10년 정도 살았던 곳이고 변화 무쌍한 그곳의 이야기도 이 책 분량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서다. 그런데 이 책의 배경이 된 현수동은 가공의 지명이긴 한데 내가 살던 공덕동에서 신촌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지나치던 그 길에 있던 현석동일대를 저자가 통칭해서 일컫어 만든 조어였다. 현석동과 신수동, 상수동을 뭉뚱그려 현수동. 이야기의 확장은 행정동 그 이상이 되기에 늘려 놓은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책의 내용은 현실이다. 비록 저자가 이미 그 곳을 떠난 만큼 그 안을 채웠던 이야기는 그가 들었던, 혹은 어딘가에 기재된 지난 이야기지만 이렇게 다시 채록해서 정리해 놓지 않는다면 결국 사라질 것들이다.
지명을 따라 배우는 재미는 쏠쏠하다. 현석동이라는 지명은 검은 玄, 돌 石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예전 이 땅에 검은 바위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동작구 흑석동도 마찬가지인 것 처럼. 인근의 창천동, 창전동, 염리동, 마포등이 각각 조선시대 관청이 주관하던 창고가 있고 소금들이 오가던 이른바 물류의 요지였던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다. 예전 이곳은 서강이라는 지명으로 잘 알려진 그곳이다. 서강대, 서강대교등등.
책에 소개된 지명관련된 이야기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한강에 떠있는 새들의 고향 밤섬이야기다. 군사독재 시절, 여의도를 개발하겠다고 하여 주민들이 거주하던 밤섬을 인위적으로 폭파시키고 거기서 나온 석재로 여의도에 각종 건물들을 짓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섬이 사라진 줄 알았건만 강 바닥에 남은 섬의 뿌리 위로 토사가 쌓이고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몰려들며 폭파시켰을 당시 원래의 섬 크기 보다 더 커진 오늘날의 밤섬, 역시 자연을 이기는 인간은 없다. 난 밤섬하면 영화 김씨 표류기가 떠올랐는데 그 이야기는 없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잠시 살았던 통칭 현수동의 역사, 인물, 전설, 밤섬을 비롯해 상권, 교통, 도서관 이야기를 끄집어 냈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았다. 워낙에 이야기꾼이다 보니 저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소설이 될 것 같다. 아무튼, 컨텐츠가 힘이 되는 시절을 산다.
마포팔경(서강팔경)
율도명사, 용암모연, 우산목적, 마포귀범, 양진낙조, 관악청람, 용호제월, 방학어화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