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속에저바람속에
흙속에저바람속에흙속에저바람속에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6.2.16
- 좋아요
- 4
- 댓글
- 0
- 작성일
- 2026.2.16

- 작성일
- 2026.2.1
- 좋아요
- 3
- 댓글
- 1
- 작성일
- 2026.2.1

- 작성일
- 2026.1.28
- 좋아요
- 5
- 댓글
- 0
- 작성일
- 2026.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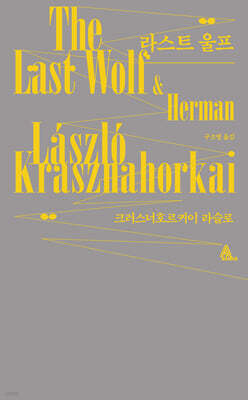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20
- 좋아요
- 39
- 댓글
- 209
- 작성일
- 2026.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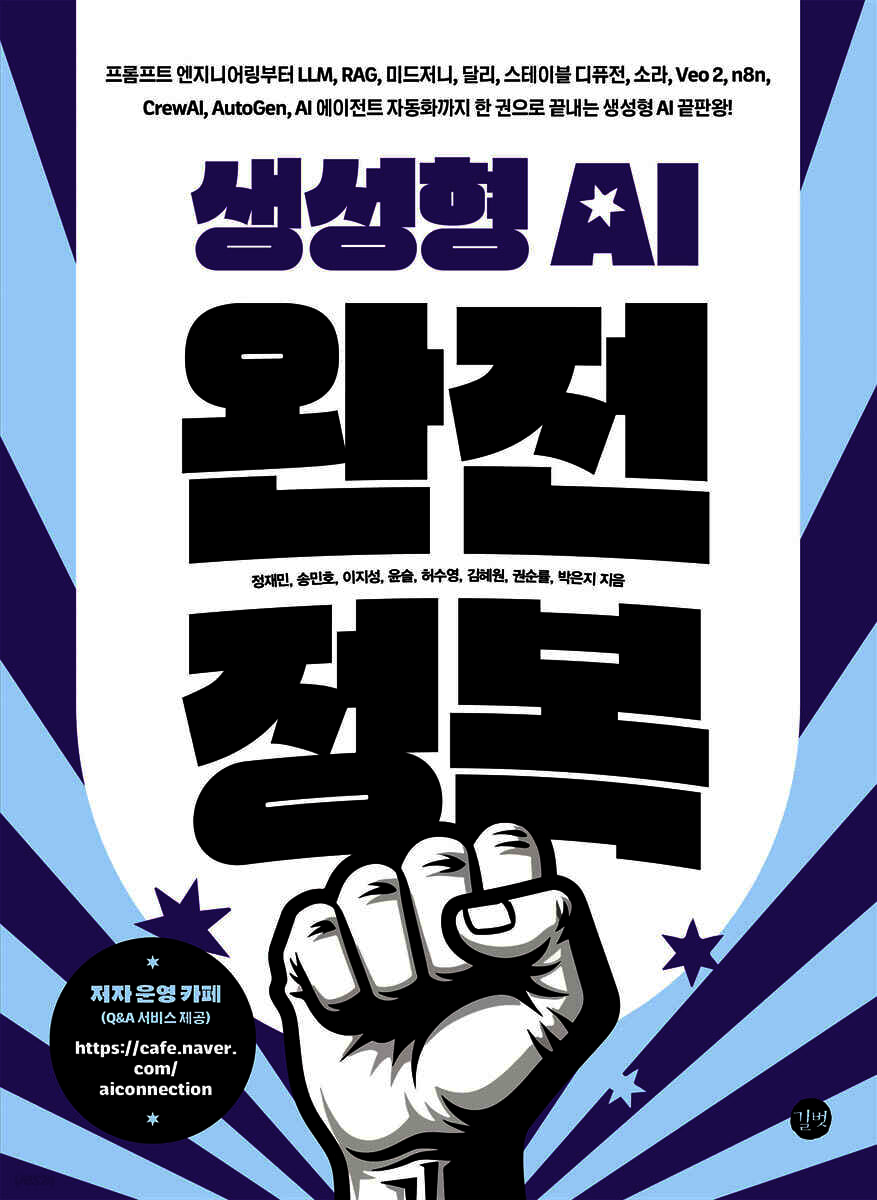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20
- 좋아요
- 66
- 댓글
- 116
- 작성일
- 2026.2.20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9
- 좋아요
- 33
- 댓글
- 196
- 작성일
- 2026.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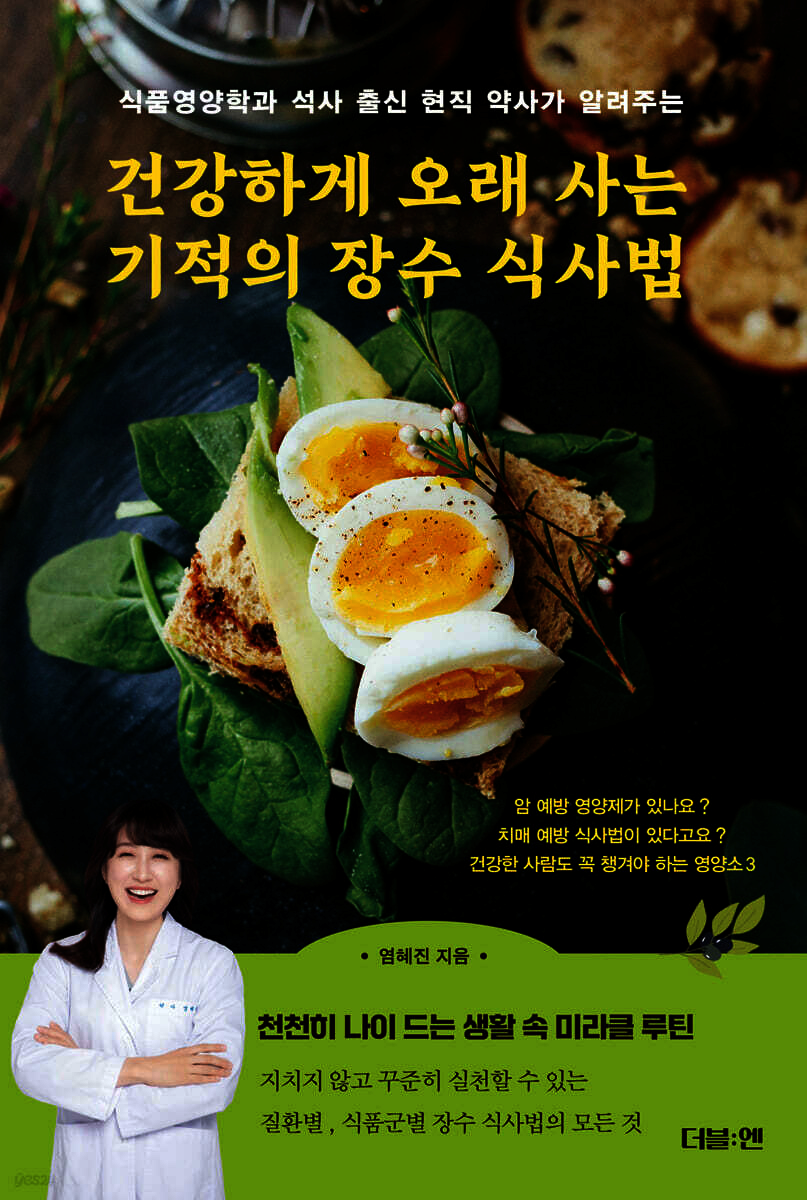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