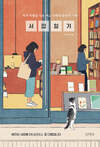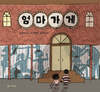- 기본 카테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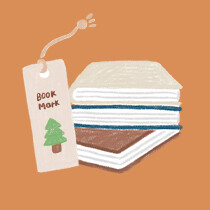
구선
- 작성일
- 2024.11.29

소년이 온다
- 글쓴이
- 한강 저
창비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전체적인 파괴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몇 배는 되었고, 어차피 대부분 파괴될 운명을 가진 배들을 건조하고 무장하기 위해 나무를 벌목하여 가공하고, 광석을 채굴하여 제련하고, 쇠를 단조하고, 돛을 짜고 바느질하는 등 얼마나 엄청난 노동이 필요했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토성의 고리』, 95p.
이 책을 읽기 직전에 우연히 『토성의 고리』(J.G.제발트)라는 책을 읽었다. 책의 4장에는 그리니치 해양박물관에 전시된 '쏠 베이 전투'를 아주 사실적인 기법으로 묘사한 그림이 등장한다. 화자는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말한다. 후대의 창작물이 역사적 장면을 극적으로 재현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역사적 사건의 상황맥락이나 그 속에서 개개인이 겪었던 고통까지 완벽하게 재현하지는 못한다고. 설령 어떤 천재가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진실한 기록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중들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재현인 것이다. 요약하면, 근본적으로 후대의 기록은 모든 사실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없다. 그것이 화자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재현'의 기록물을 읽어야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을 읽어야 할까?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게 되었다.
『소년이 온다』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등장 인물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계절은 주로 여름인데도 후끈하고 끈적끈적한 열기보다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든다. 소설을 읽다보면 국가가 그런 개인에게 자행하는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 매순간 곱씹게 된다. 고깃 덩어리가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 폭력과 고문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의 육체적인 고통이, 살아남은 이들의 무거운 죄책감이, 그 모든 것들을 간결하고 묘사하는 건조한 문장들이 마음을 후벼파는 듯하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양심이 있다.(114p) 그 자리에서 차마 '떠나면 안 될 것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들이 모이고 모이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진다. 지금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긴다.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해 총을 쥐었지만, 결국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던 마음이기도 하다. 소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이라고 표현된다.
에필로그에서 화자가 말하듯, 국가가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왔다. 오래 전,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 국가를 착취했던 과거부터 지금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밟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잠시 스쳐지나가는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영상의 이미지같은 정보값에 머무르기 쉽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완벽하지 않은' 재현물로나마 되짚어보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가 남긴 기록물의 희미한 이미지로 역사를 되짚어보고 유추해야 한다. 하지만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이름을 외우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살아서 누려야했던 존엄한 삶의 일대기, 숭고한 마음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단순한 글자나 사진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망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 좋아요
- 6
- 댓글
- 0
- 작성일
- 2023.04.26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