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소행복
소소행복소소행복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6.2.4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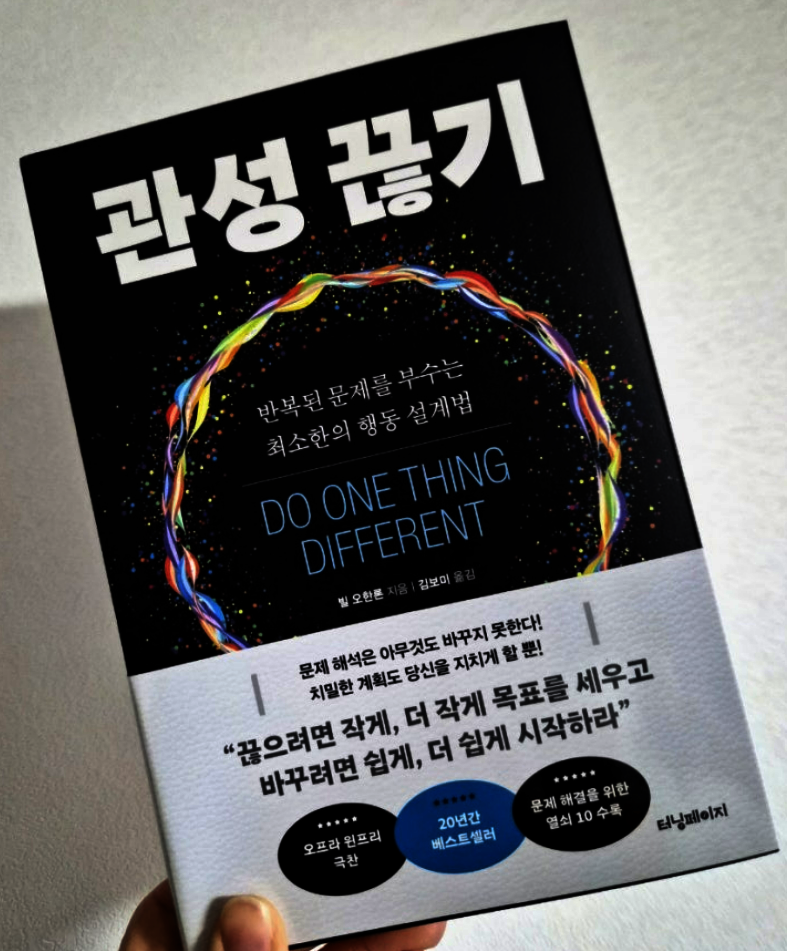
- 작성일
- 2026.1.29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2026.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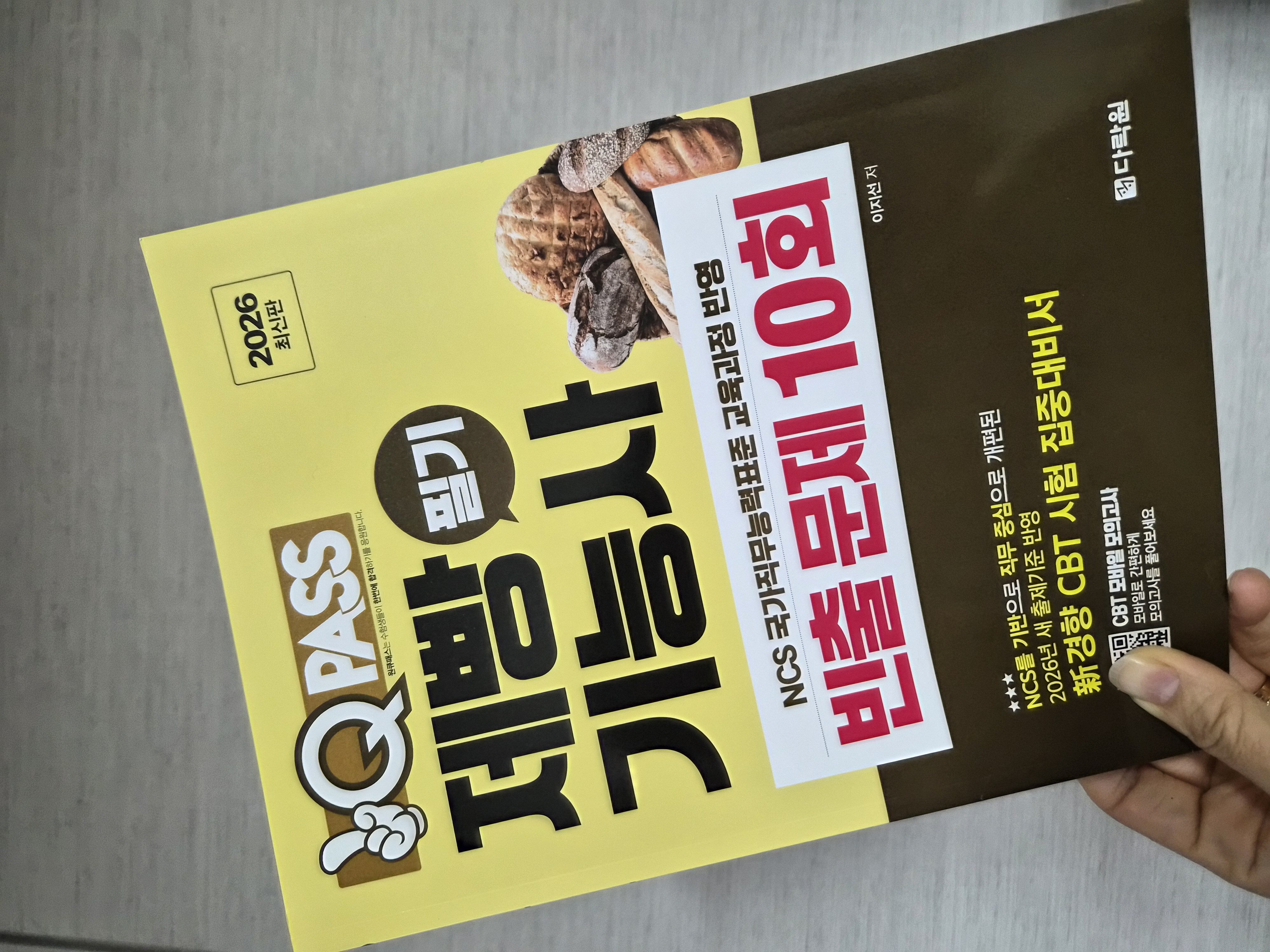
- 작성일
- 2026.1.27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6.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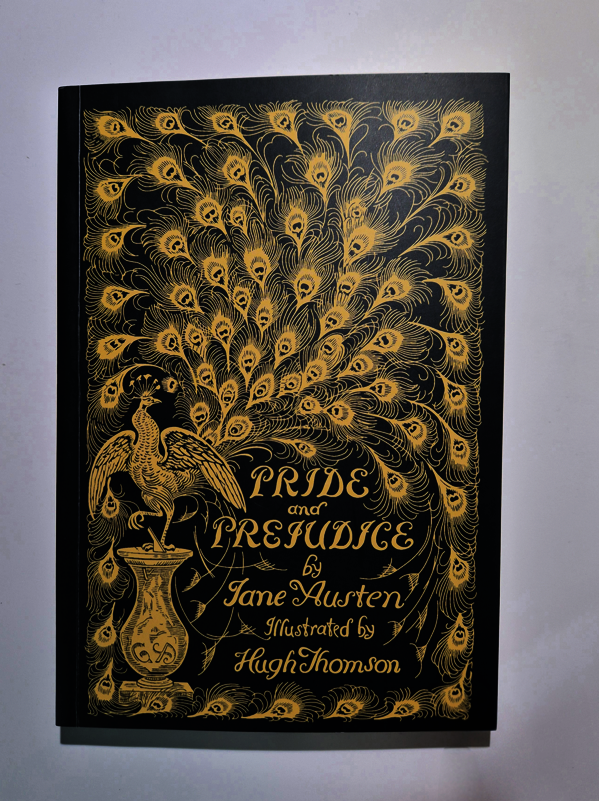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5
- 좋아요
- 18
- 댓글
- 134
- 작성일
- 202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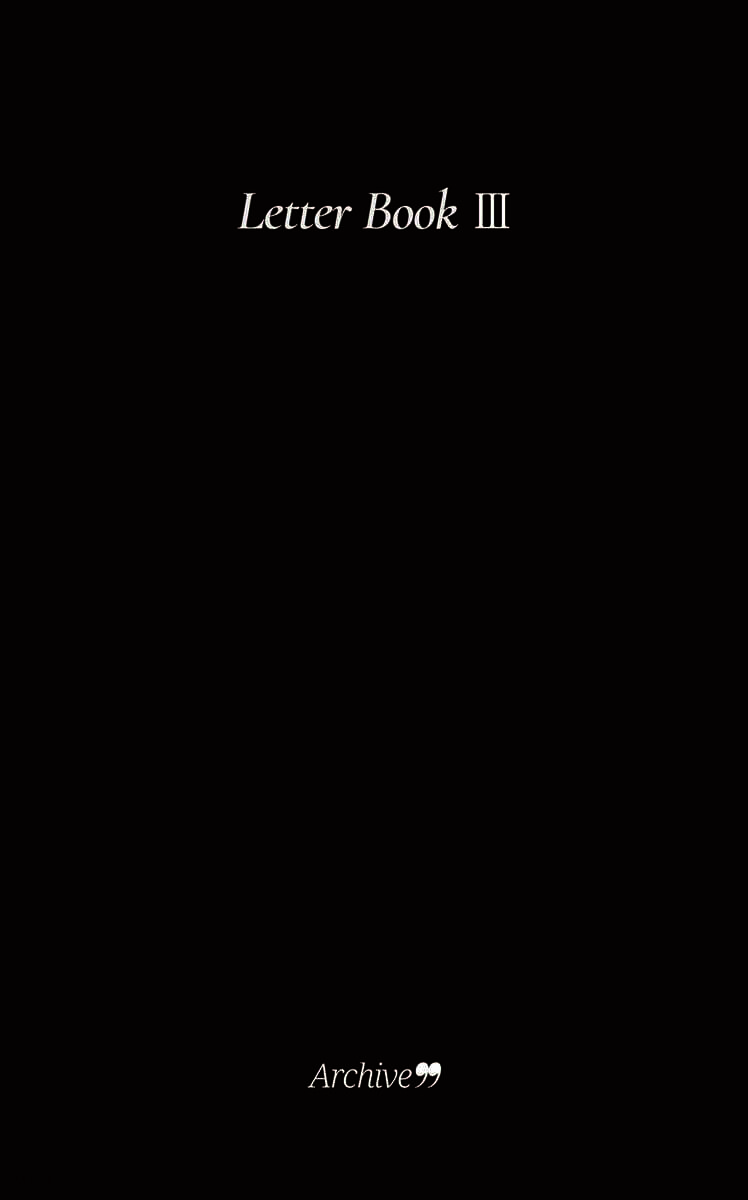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5
- 좋아요
- 28
- 댓글
- 187
- 작성일
- 2026.2.5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9
- 좋아요
- 20
- 댓글
- 118
- 작성일
- 202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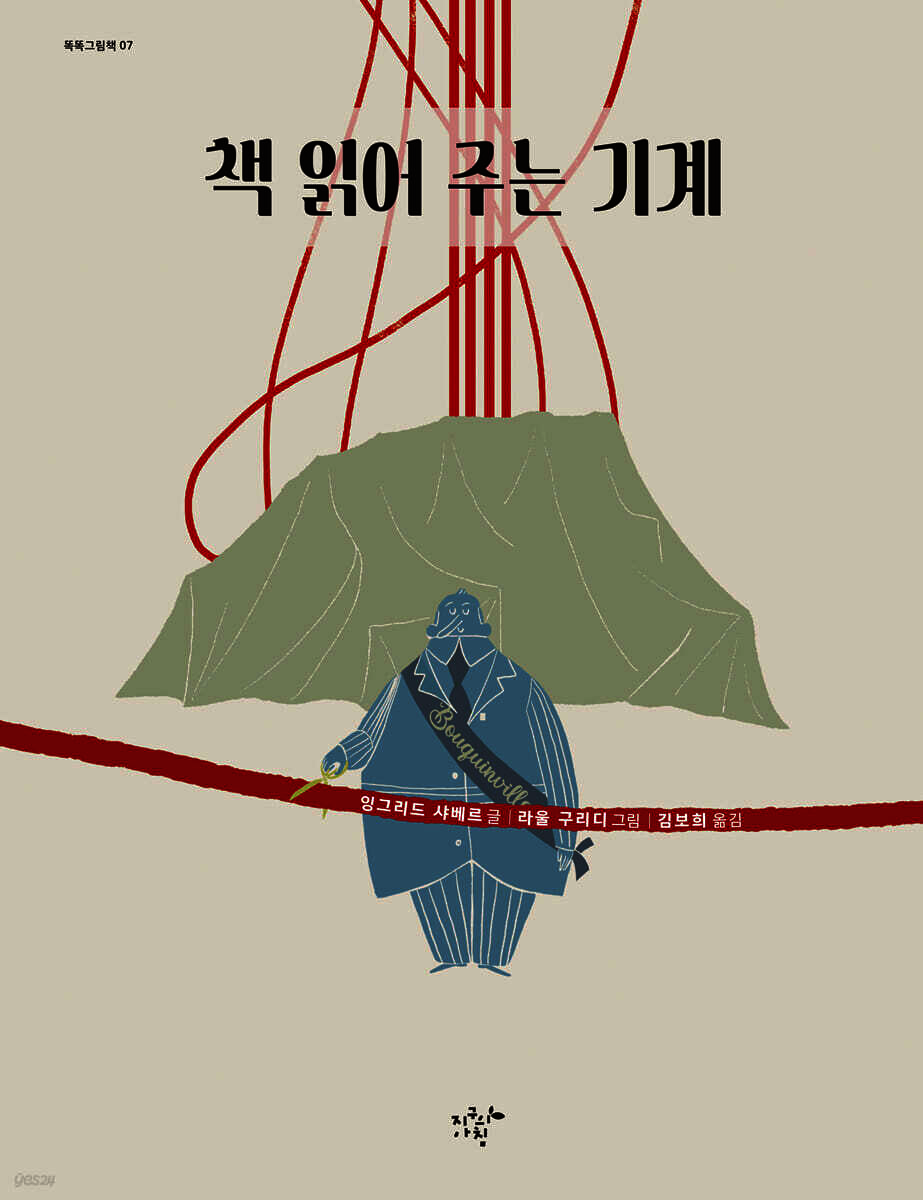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