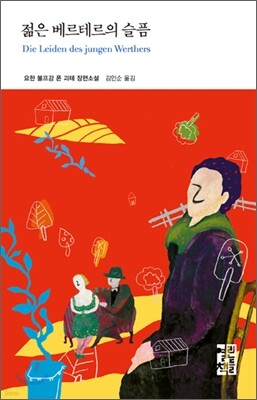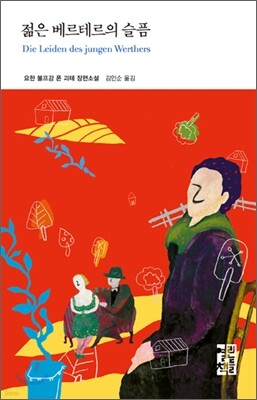오우아
오우아댓글 4

피오니즈
- 작성일
- 2010. 8. 26.

오우아
- 작성일
- 2010. 8. 29.

아자아자
- 작성일
- 2010. 8. 31.

오우아
- 작성일
- 2010. 8. 31.
오우아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5.8.29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8.29
- 작성일
- 2025.8.29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2025.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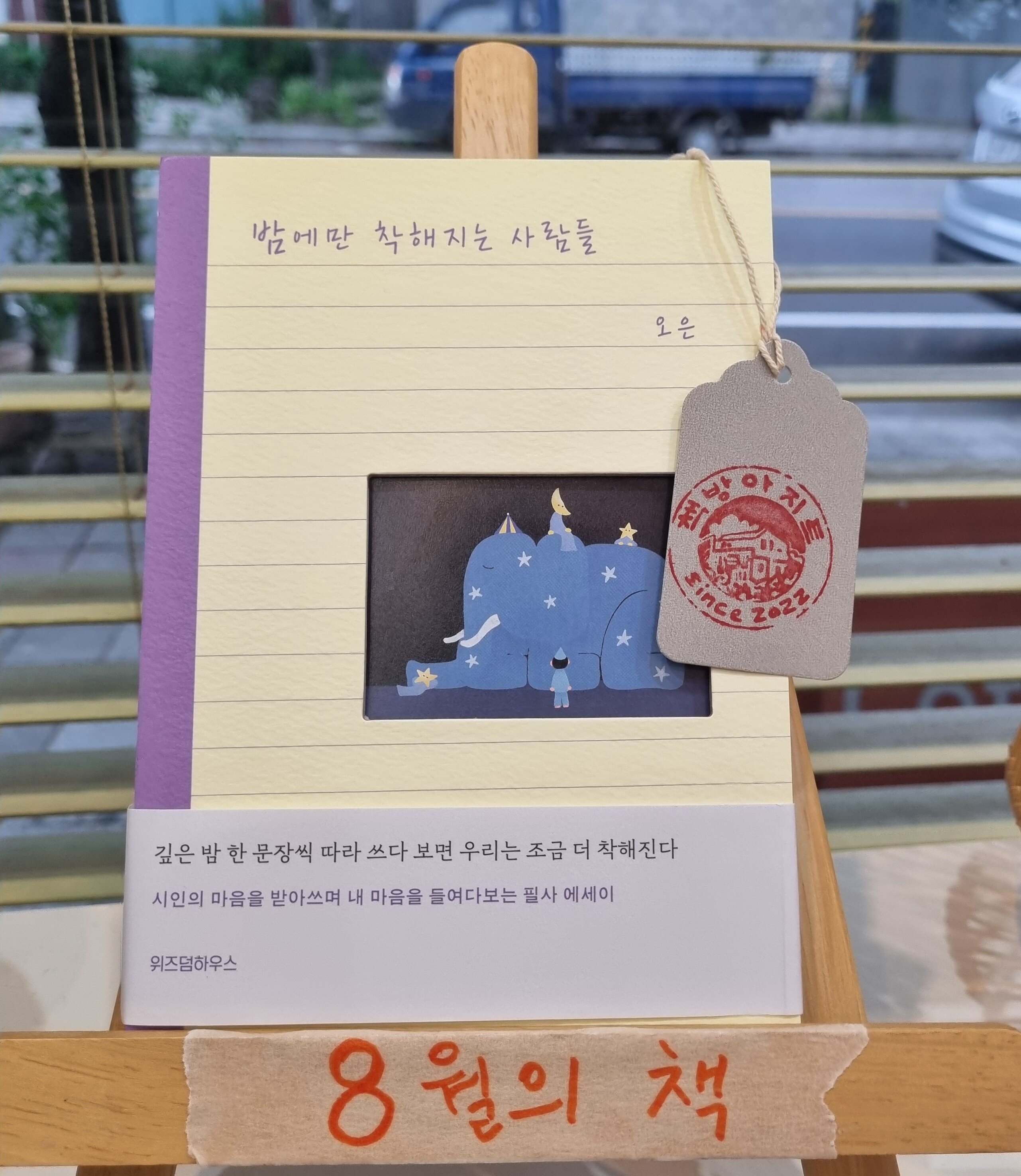
- 작성일
- 2025.8.7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8.7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9.1
- 좋아요
- 27
- 댓글
- 170
- 작성일
- 202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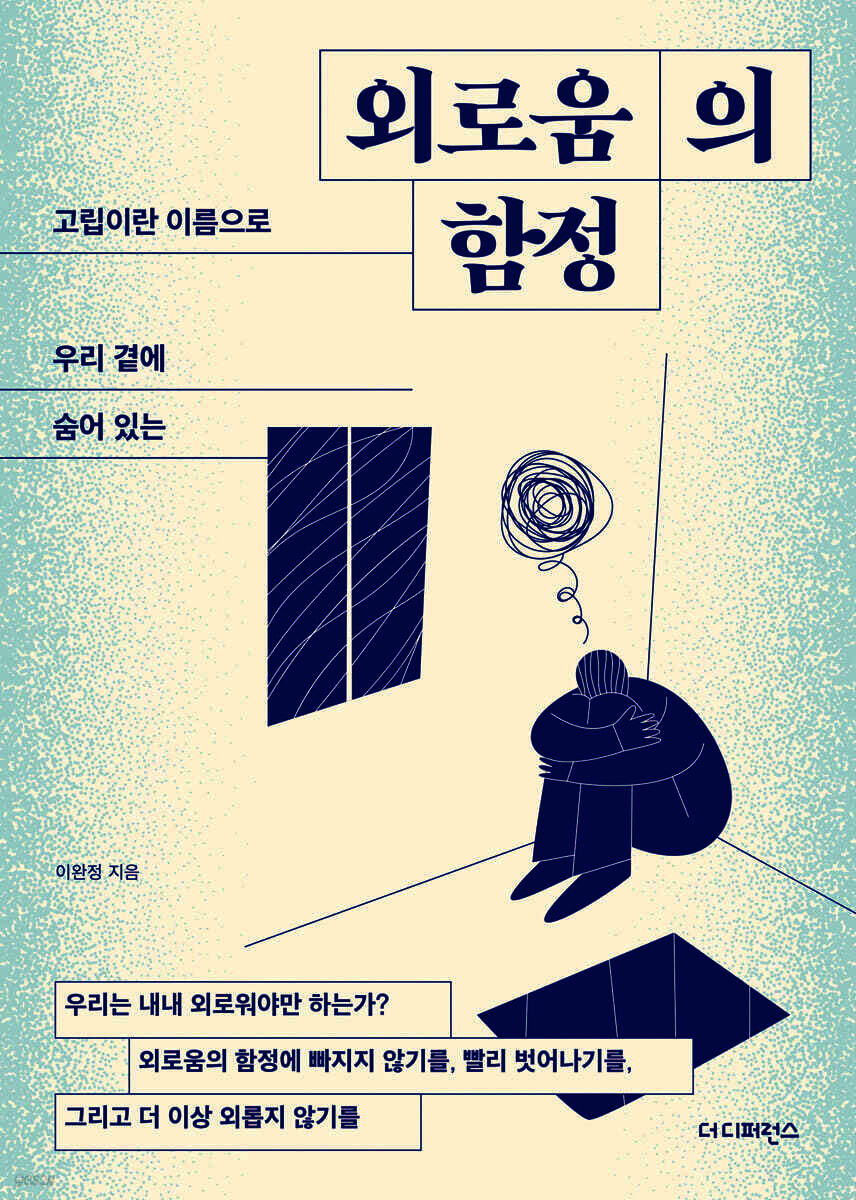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9.1
- 좋아요
- 25
- 댓글
- 132
- 작성일
- 202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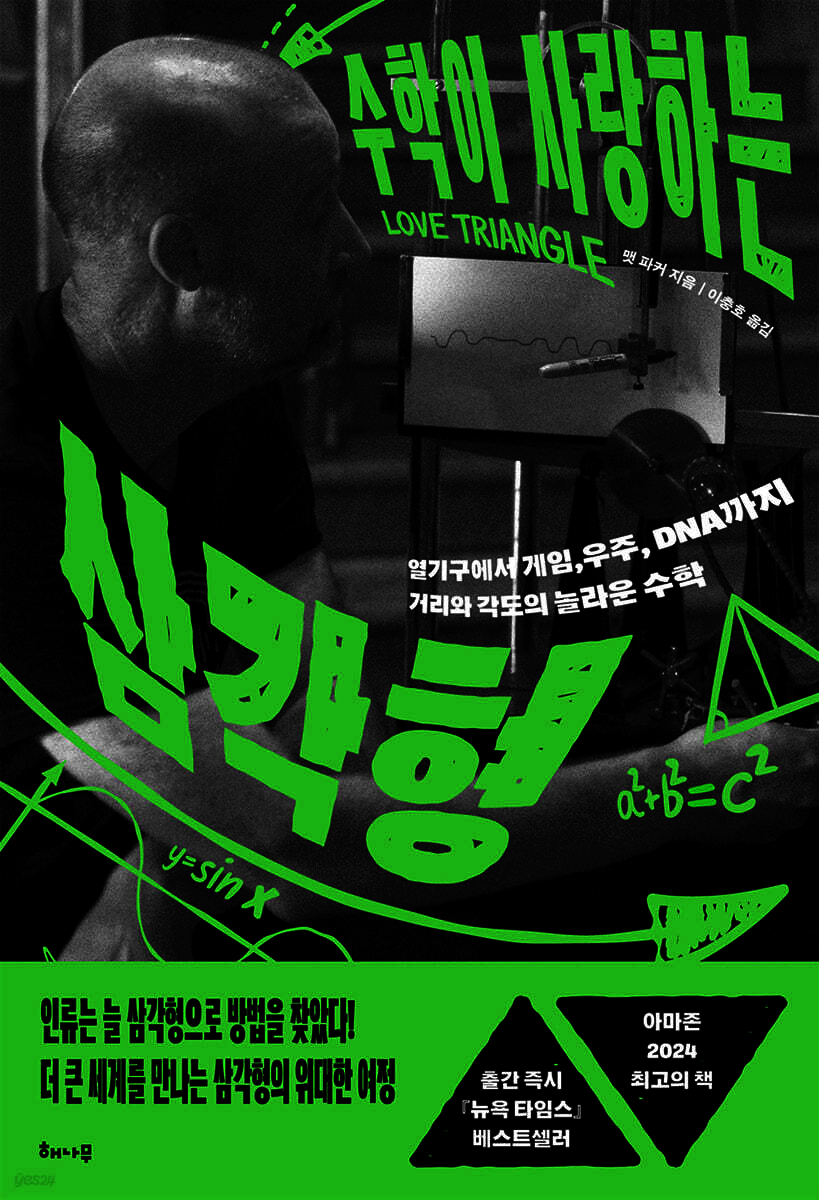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5.9.3
- 좋아요
- 8
- 댓글
- 0
- 작성일
- 2025.9.3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