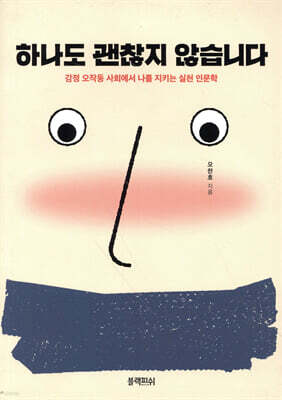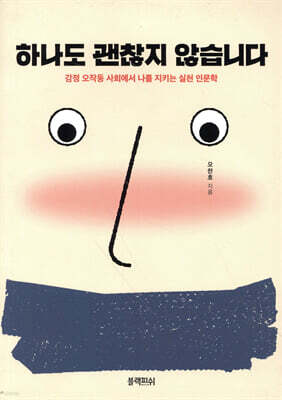아그네스
아그네스댓글 6

아그네스
- 작성일
- 2020. 2. 4.

初步
- 작성일
- 2020. 1. 31.

아그네스
- 작성일
- 2020. 2. 4.

해맑음이
- 작성일
- 2020. 2. 1.

아그네스
- 작성일
- 2020. 2. 4.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5
- 좋아요
- 33
- 댓글
- 198
- 작성일
- 2025.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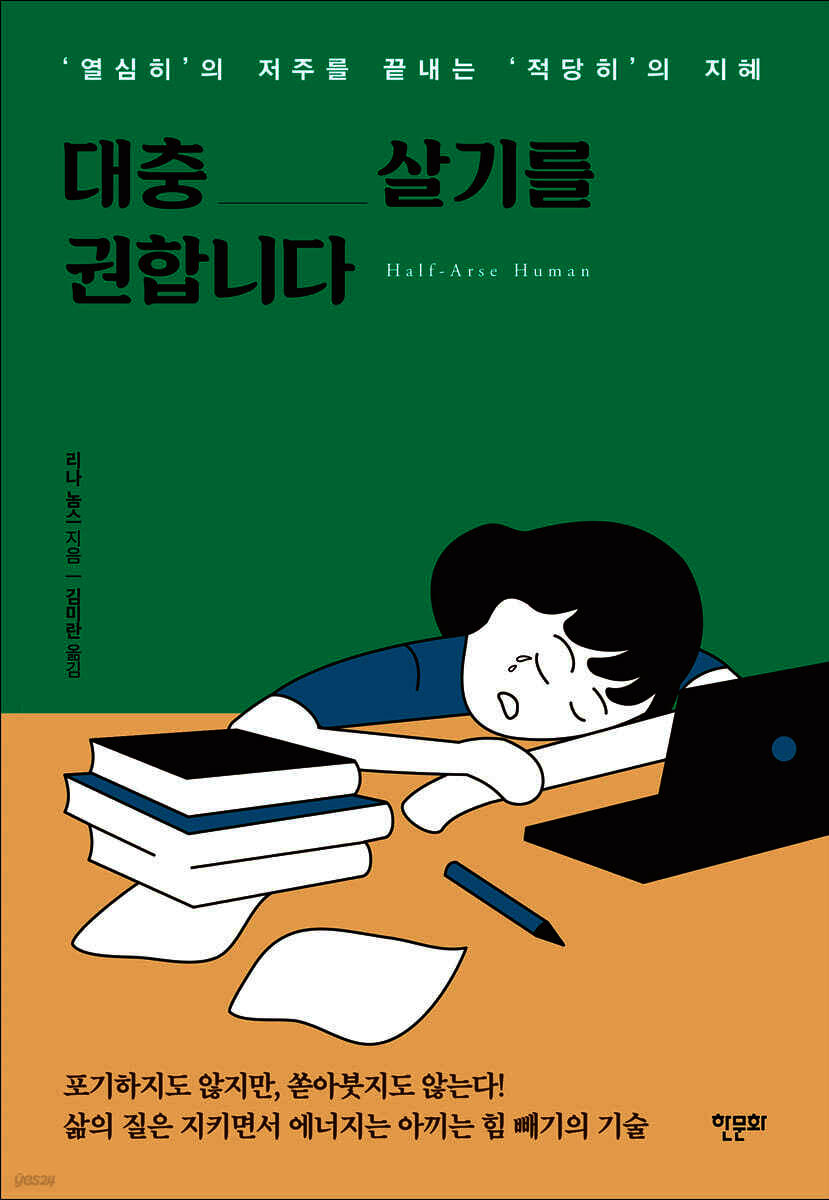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2
- 좋아요
- 33
- 댓글
- 180
- 작성일
- 2025.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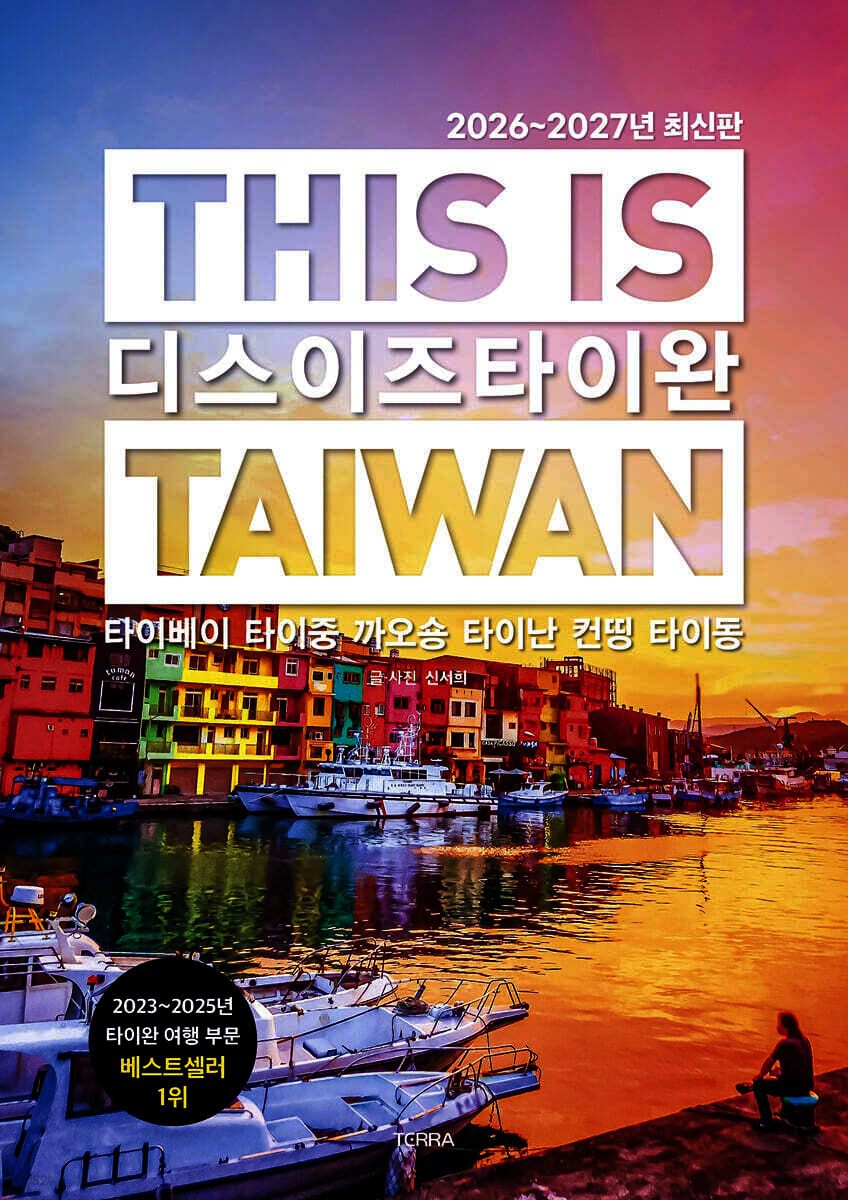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12
- 좋아요
- 15
- 댓글
- 93
- 작성일
- 2025.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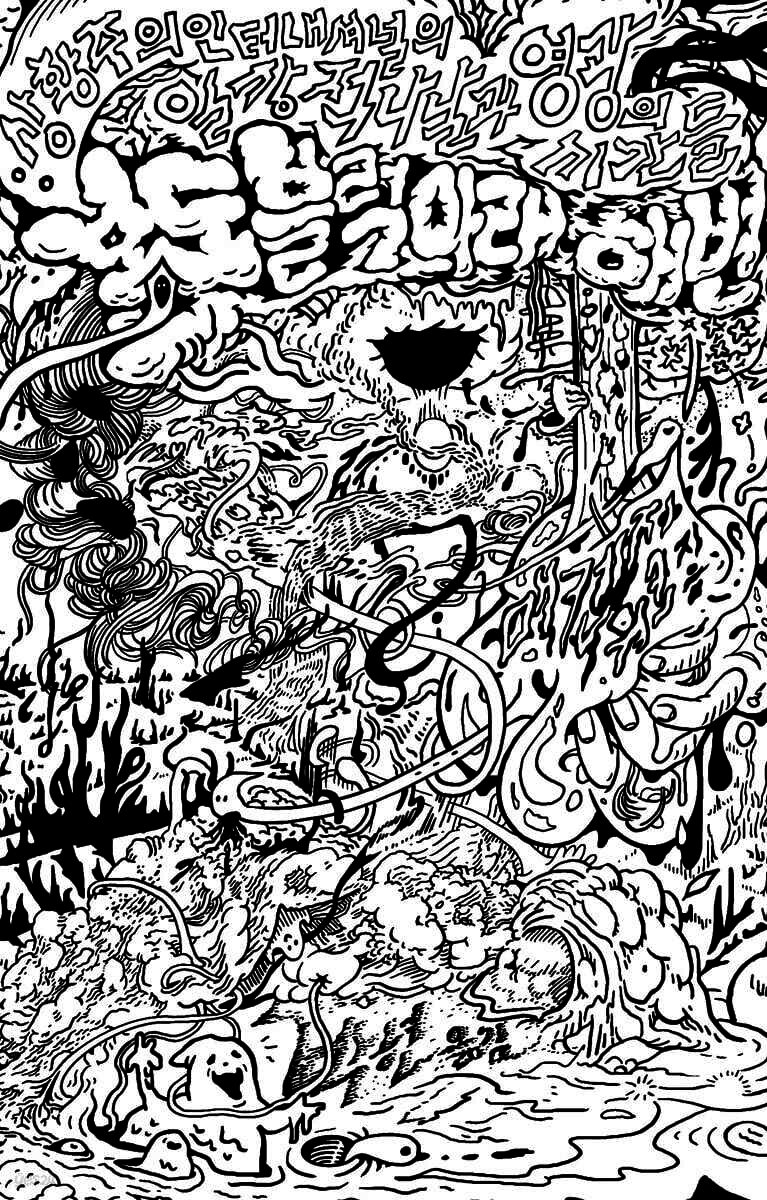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