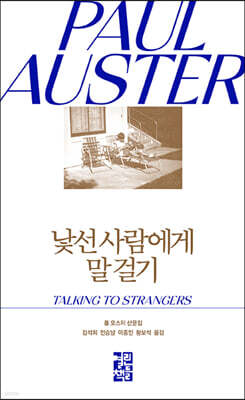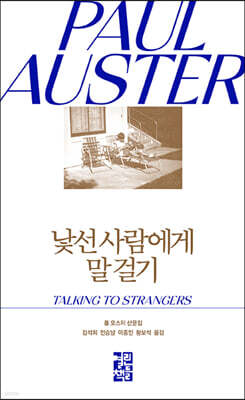책읽는낭만푸우
책읽는낭만푸우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책읽는낭만푸우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5.11.13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2025.11.13

- 작성일
- 2025.11.13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11.13
- 작성일
- 2025.11.13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5.11.13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3.5
- 좋아요
- 42
- 댓글
- 253
- 작성일
- 202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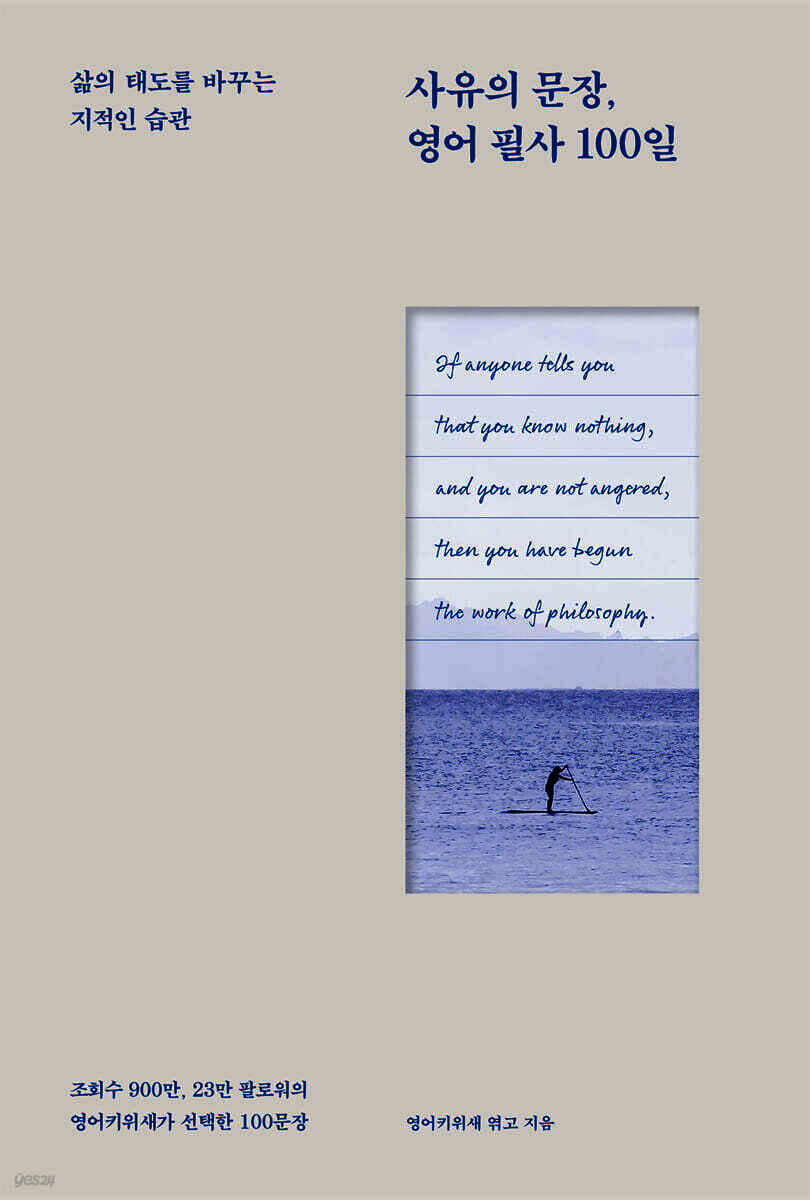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3.6
- 좋아요
- 33
- 댓글
- 256
- 작성일
- 2026.3.6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6.3.4
- 좋아요
- 57
- 댓글
- 113
- 작성일
- 2026.3.4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