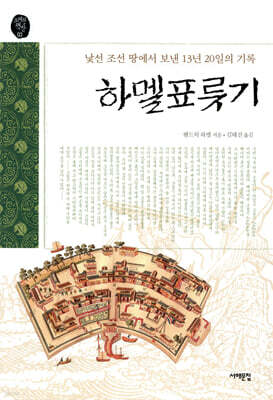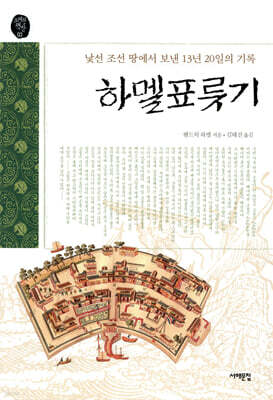유정맘
유정맘댓글 8

유정맘
- 작성일
- 2014. 2. 23.

아자아자
- 작성일
- 2014. 3. 2.

유정맘
- 작성일
- 2014. 3. 9.

orufpk
- 작성일
- 2014. 11. 3.

유정맘
- 작성일
- 2014. 11. 4.
유정맘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19.8.23
- 좋아요
- 6
- 댓글
- 5
- 작성일
- 2019.8.23
- 작성일
- 2019.8.5
- 좋아요
- 5
- 댓글
- 0
- 작성일
- 20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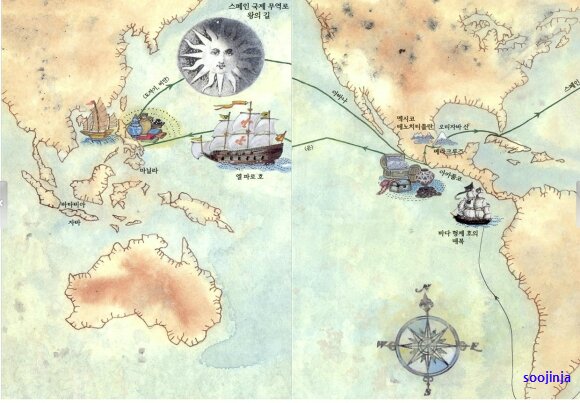
- 작성일
- 2019.8.1
- 좋아요
- 5
- 댓글
- 3
- 작성일
- 2019.8.1

사락 인기글
- 별명
- erica
- 작성일
- 2025.12.27
- 좋아요
- 1
- 댓글
- 0
- 작성일
- 2025.1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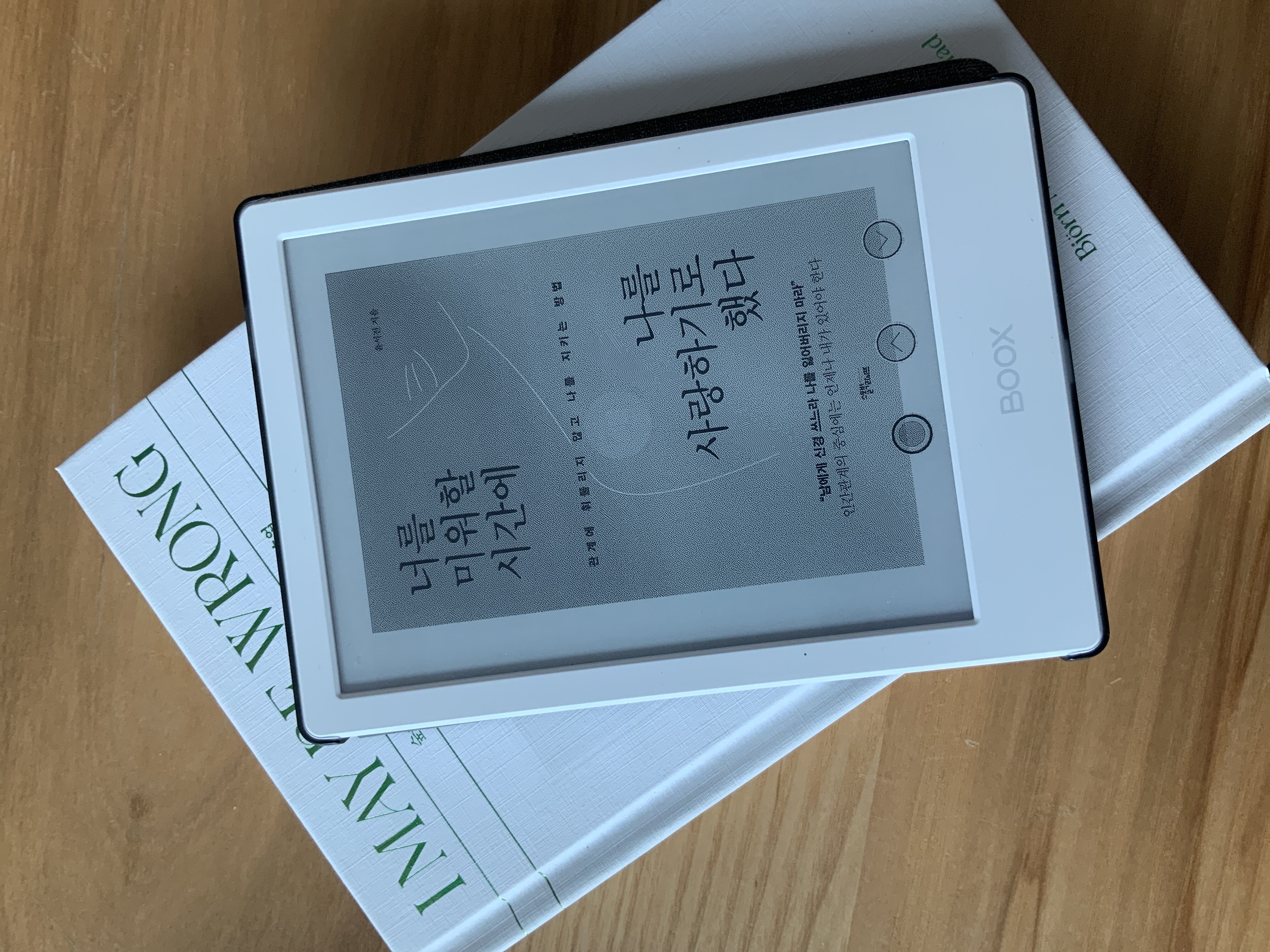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29
- 좋아요
- 28
- 댓글
- 194
- 작성일
- 2025.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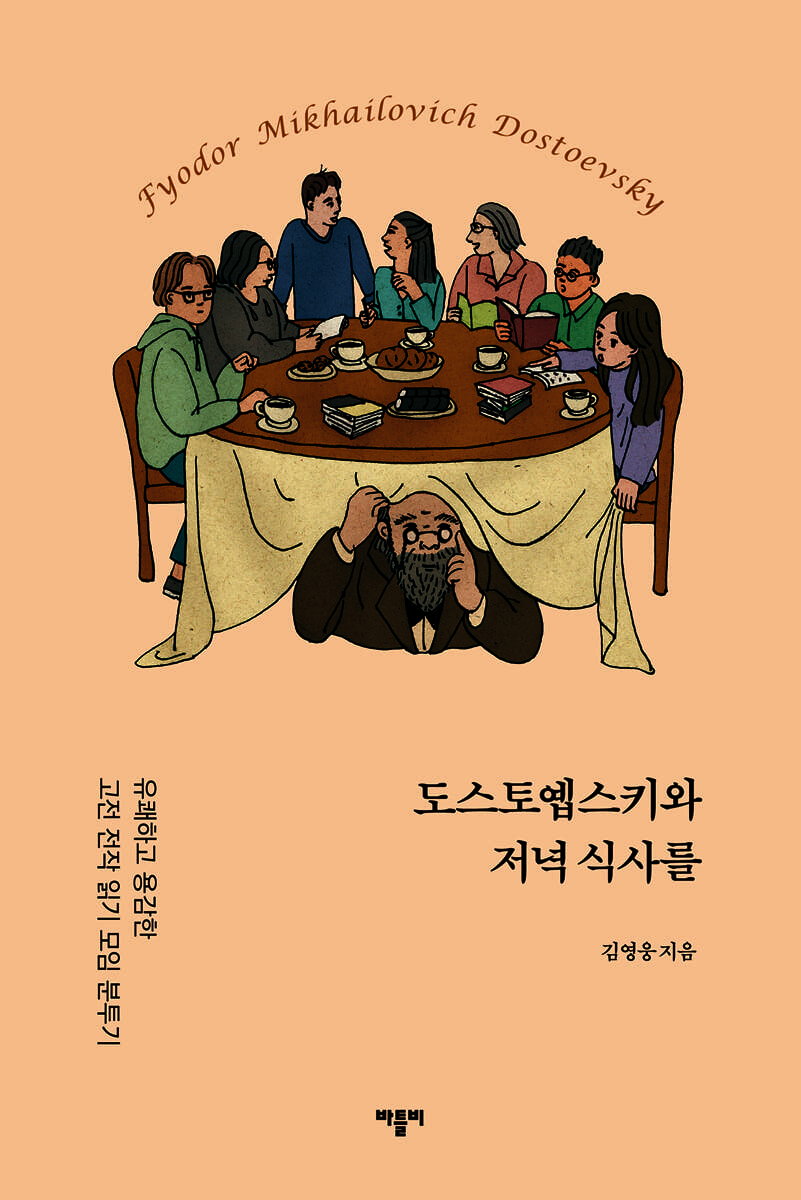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5.12.29
- 좋아요
- 42
- 댓글
- 264
- 작성일
- 2025.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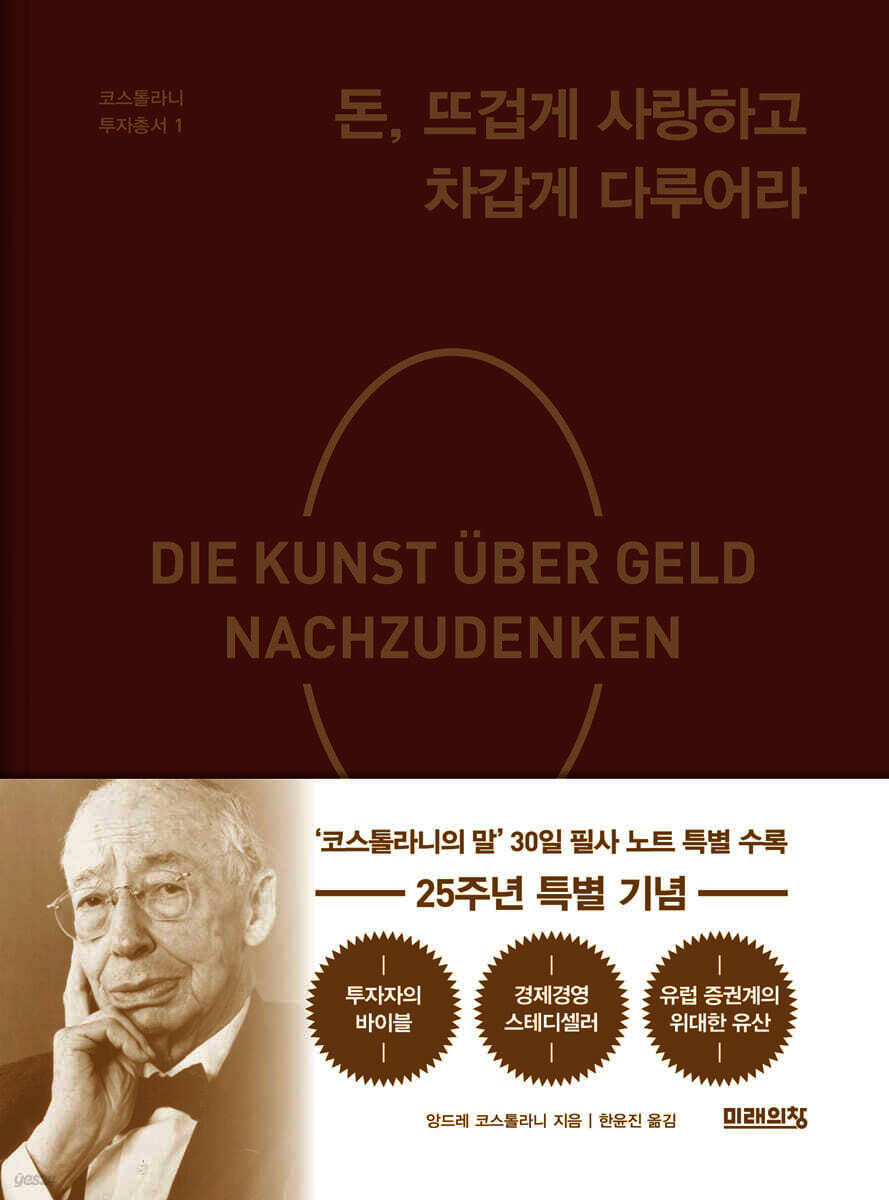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