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 /시

初步
- 작성일
- 2018.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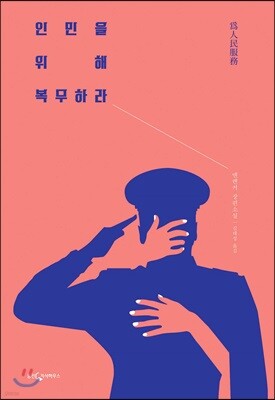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 글쓴이
- 옌롄커 저
웅진지식하우스
때로는 섣부른 금서 조치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우리에게도 낯선 풍경은 아니다. 언젠가는
국방부가 일군의 책들을 금서로 지정하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찾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금서’라는 단어가 주는 비밀스러움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이
책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역시 중국당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는 바람에 온라인에서 중화권 독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증폭시켰다고 한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소설을 소설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만큼 숨겨야 할 것이 많다는 이유 일 게다.
소설의 서사는 조금 비틀어 놓고 보면
우리에게도 익숙하다는 생각이 든다. 폐쇄된 군부내에서의 성폭력과 고위급 장교 부인의 갑질이 섞인다면
바로 소설 속 모습이 아닐까 싶다. 물론 작가의 집필 의도나 문학성은 별개로 하고 말이다. 어쩌면 이런 통속성이 혁명이라는 이름아래 갇혔던 사랑과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작가의 바램과 만나 뜨겁게 달아
올랐는지 도 모르겠다.
소설은 문화대혁명 당시 어느 부대 사단장의
저택에 파견된 취사 담당 공무분대장인 우다왕과 사단장의 젊은 부인 류롄이 벌이는 사랑이야기이다. 딱히
사랑이야기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그 시작이 류롄의 일방적인 요구였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성과 애정의
봉사를 요구하는 류롄에게 우다왕은 맞서 보지만 사단장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그 요구에 응하게 된다. 사단장이
베이징으로 출장간 두 달 동안 우다왕과 류롄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저택에서 혁명기에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애정행각을 벌인다. 그러면서 우다왕은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욕망에 눈뜨게 되고 둘 사이의 새로운 권력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들의
욕망은 딱 거기까지였다. 류롄은 사단장의 부인이라는 위치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사단장은 그들의 애정행각을 알게 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사단 해체라는 극약처방으로 그들의 사랑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 보냄으로써 그들의 이야기를 지워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당국은 왜 이 소설을 금서로
지정했을까? 사단장 부인과 취사병의 애정행각 이라는 소재가 불편했기 때문일까? 그것보다는 이 소설의 제목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와 관련이 있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마오쩌둥이 내세운 혁명의 모토였다. 작가는 이런 혁명의 언어를
인간적인 욕망의 언어로 전락시켰다. 사단장 저택의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팻말, 류롄은
우다왕에게 이 팻말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언제든 2층으로 올라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팻말은 집안 곳곳 아무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지점이 중국당국은 불편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혁명 언어의 경전 이자 혁명 정신의 상징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가 욕망의 발산 기제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이다. 혁명이라는 이름아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지고의 명제 아래 갇혀있던
사랑을, 인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바로 그 언어를 통해 해체했기에 이 소설은 중국 문단 최고의 문제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다왕이 전역을 하는 날. 우다왕은 기차역으로 가면서 사단장 저택 앞을 지날 때 타고 가던 차를 잠깐 멈추게 한 후 저택으로 들어가 류롄을
만난다. 류롄은 마지막으로 우다왕에게 선물을 준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팻말이 보자기 안에 들어 있다. 15년
후, 사단장은 성군구 사령관이 되었고, 류롄은 사령관 부인이
되었다. 우다왕이 류롄을 찾아간다. 류롄은 우다왕을 만나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편지로 하라는 쪽지를 경비병에게 들려 보낸다. 우다왕은 말없이 보자기를 건네며
전해주라고 한다. 보자기 안에는 15년전 류롄에게서 받았던
그 팻말이 들어있었다.
책을 덮으면서 나는 이 작품이 시사하는
문제점이나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다왕이 정말로 류롄을 사랑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류롄으로
인해 욕망의 눈을 뜨게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우다왕은 아내에게 냉정했다. 류롄은 우다왕이 전역하는
날 욕망의 발산 기제가 되었던 팻말을 줌으로써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갔다면, 우다왕은 오히려 그 팻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15년후 그 팻말을 돌려주면서 비로소 자신을 되찾은 것이 아닐까 싶다. ‘중국’, ‘금서’, ‘문제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 한 편을 읽었다는 느낌이다.
- 좋아요
- 6
- 댓글
- 4
- 작성일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