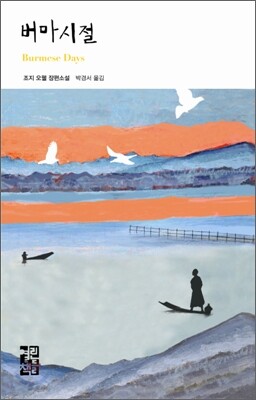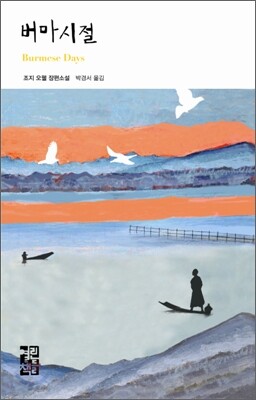初步
初步댓글 8

初步
- 작성일
- 2020. 8. 8.

추억책방
- 작성일
- 2020. 8. 7.

初步
- 작성일
- 2020. 8. 8.

아자아자
- 작성일
- 2020. 8. 9.

初步
- 작성일
- 2020. 8. 10.
初步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4.5.27
- 좋아요
- 27
- 댓글
- 10
- 작성일
- 2024.5.27

- 작성일
- 2024.5.27
- 좋아요
- 12
- 댓글
- 0
- 작성일
- 2024.5.27

- 작성일
- 2024.5.5
- 좋아요
- 14
- 댓글
- 0
- 작성일
- 202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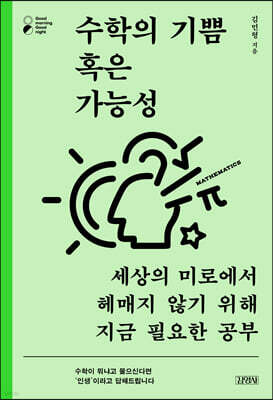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8
- 좋아요
- 35
- 댓글
- 200
- 작성일
- 202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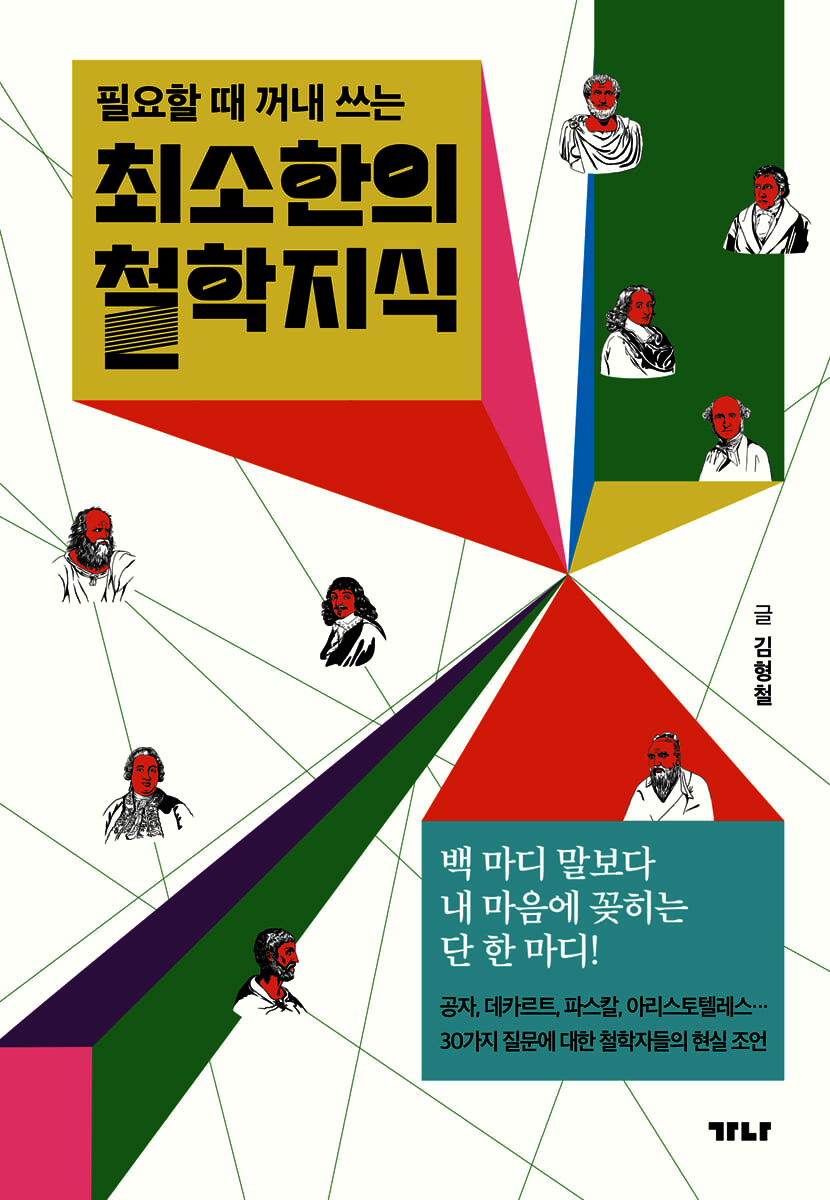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사락공식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7
- 좋아요
- 57
- 댓글
- 99
- 작성일
- 2026.1.7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1.9
- 좋아요
- 28
- 댓글
- 190
- 작성일
- 202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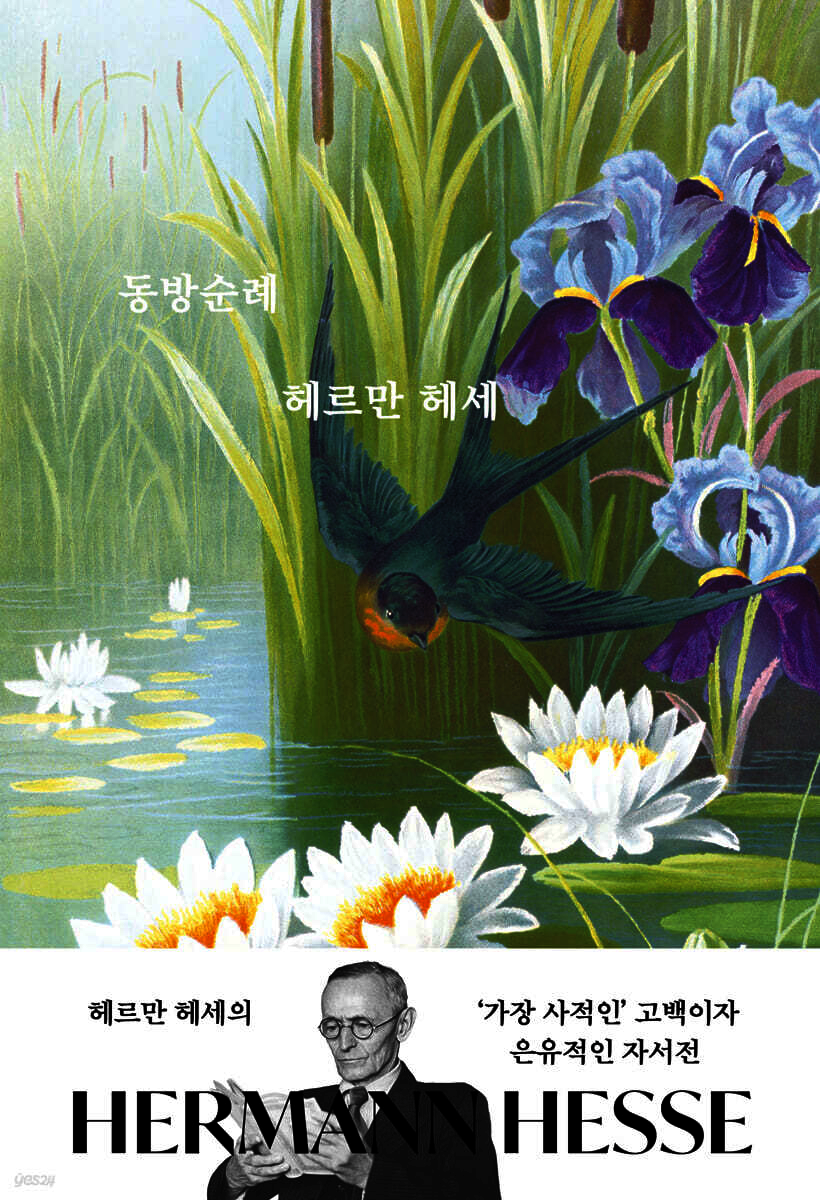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