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짱가
짱가댓글 4

初步
- 작성일
- 2020. 4. 1.

짱가
- 작성일
- 2020. 4. 2.

책찾사
- 작성일
- 2020. 4. 21.

짱가
- 작성일
- 2020. 4. 24.
짱가님의 최신글
- 작성일
- 2024.3.17
- 좋아요
- 3
- 댓글
- 0
- 작성일
- 2024.3.17

- 작성일
- 2023.12.31
- 좋아요
- 2
- 댓글
- 0
- 작성일
- 2023.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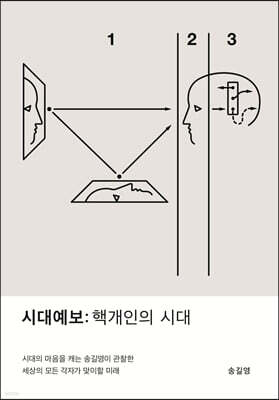
- 작성일
- 2023.12.31
- 좋아요
- 0
- 댓글
- 0
- 작성일
- 2023.12.31
사락 인기글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9
- 좋아요
- 27
- 댓글
- 153
- 작성일
- 2026.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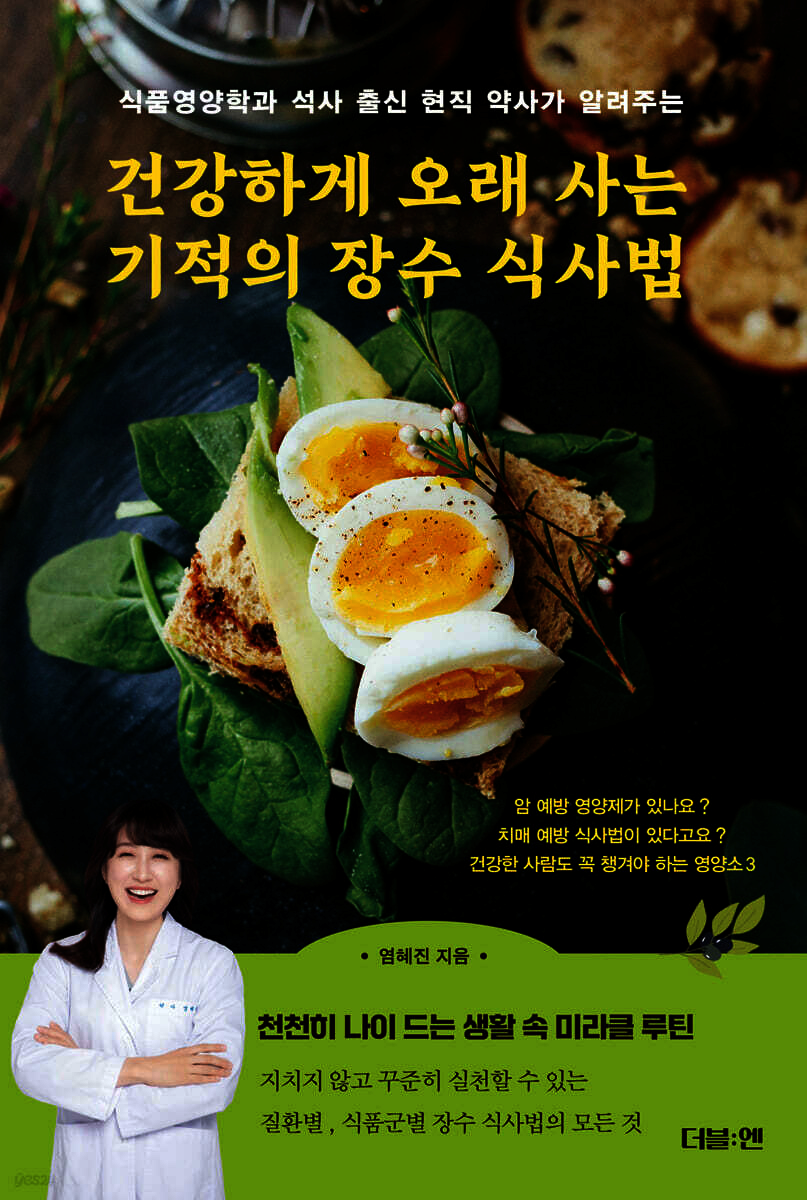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9
- 좋아요
- 17
- 댓글
- 105
- 작성일
- 2026.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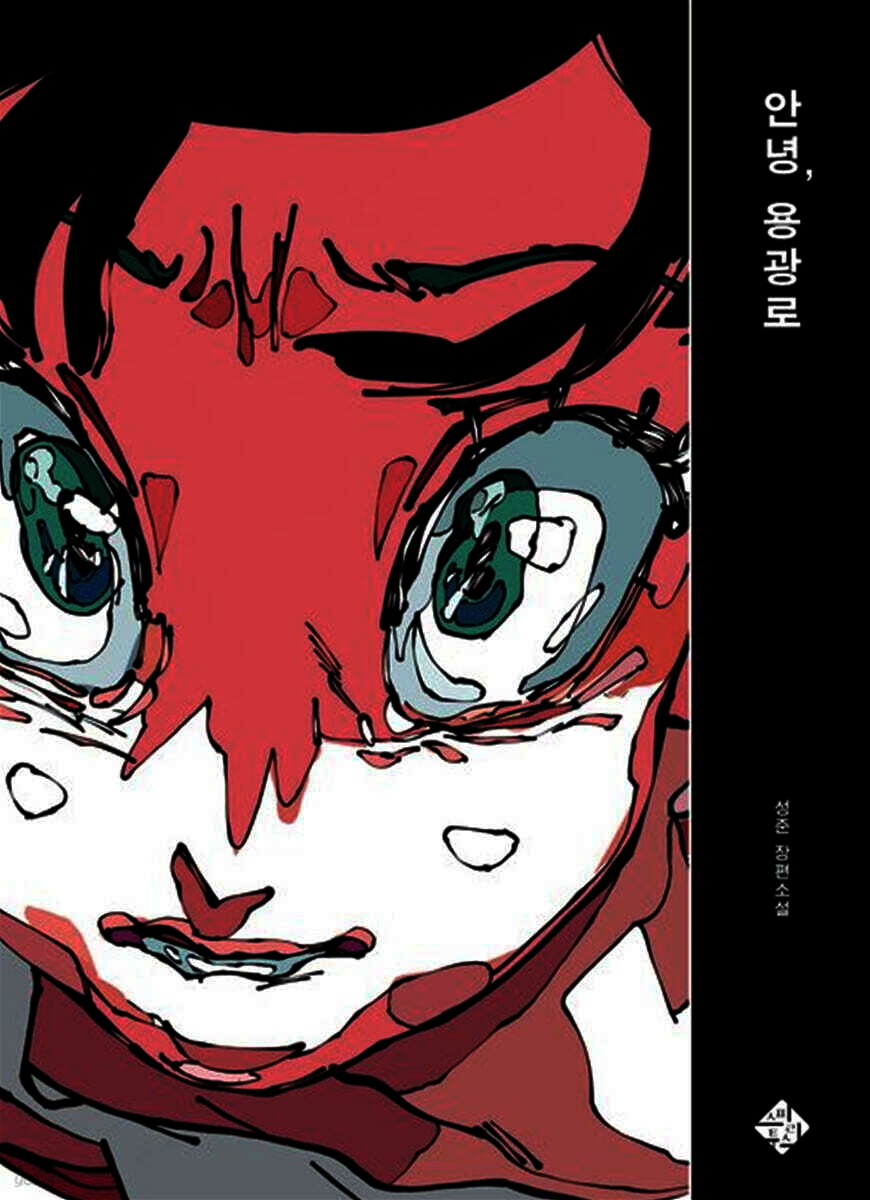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 별명
- 리뷰어클럽공식계정
- 작성일
- 2026.2.19
- 좋아요
- 15
- 댓글
- 117
- 작성일
- 2026.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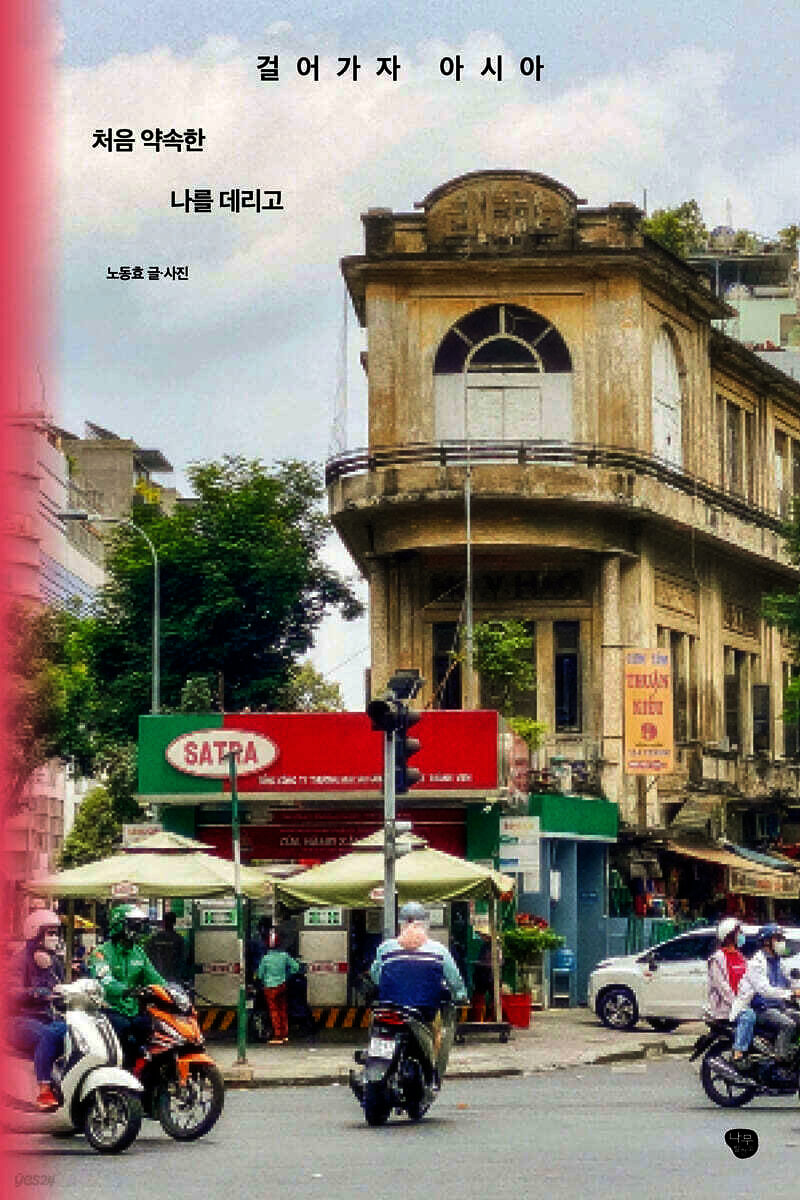
- 첨부된 사진
- 20




